노트위의 패스포트
적도의 나라, 에콰도르에 머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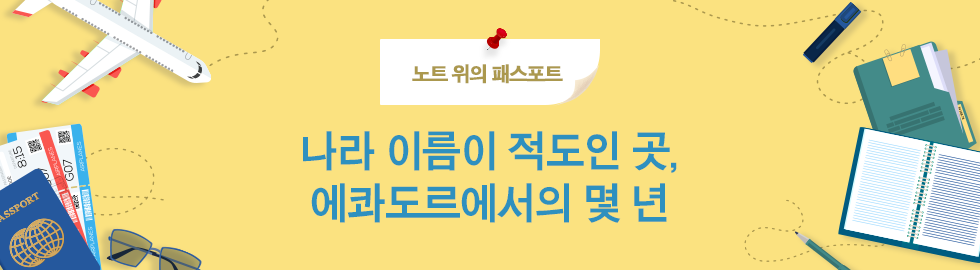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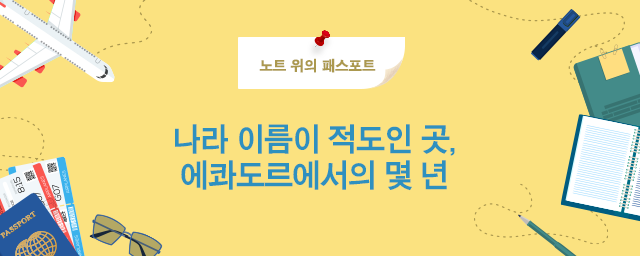
에콰도르로 간 건 거의 우연이었다. 2014년, 나는 문화예술위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쿠바에 3개월간 가 있었다. 그곳에서 쿠바의 아바나에서 두 달을 보내고, 떠나기 직전, 피그만으로 알려진 히론 해변에서 열흘 남짓 머물렀다. 오래전, 코이카 단원으로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알게 된 선배의 임지가 에콰도르였다. 에콰도르 공항에 내리는 순간, 내 생각이 났다면서 나더러 에콰도르로 오라고 했다. 그냥 구경 가야지, 했다. 남미는 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니까.

그렇게 에콰도르에 발을 디뎠다. 선배는 수도인 키토에서 살고 있었다. 선배가 자기 집에서 지내라고 했지만, 키토는 번잡했다. 선배가 알고 있는 현지인이 살고 있다는 코타카치에 갔다. 그녀의 소개로 집을 얻었다. 방 두 개에 주방이 있고 화장실도 있는 집이었다. 아래층은 집주인이 가죽 가게를 열고 있었다. 방을 얻었다. 코타카치는 산속에 있는 마을이었다. 그곳에 방을 얻고 9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러다 항공권이 1년 만기여서 하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내 집이었던 곳에는 언니와 조카들이 와 있어서 서울문화재단의 연희문학창작촌에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연희문학창작촌에서 나와 다시 에콰도르로 향했다. 짐을 맡겨두고 온 터라, 부담 없이 갈 수 있었다. 그곳에서 영주권도 받았다. 에콰도르는 영주권 얻기가 어렵지 않았다. 수도에 계시는 한국인 변호사분께서 영주권 획득을 도와주셨다. 그런 뒤에 이바라로 왔다. 이바라에서 살 땐 코이카 단원들이 사는 집으로 가서 살았다. 코이카 단원들에게는 보증금 잘 돌려준다던 집주인은 내게 갑질을 시전하는 바람에 오타발로로 이사했다. 오타발로엔 에콰도르 남자와 결혼해서 예쁜 아기를 낳고 사는 한국인 처자가 있었다. 이바라의 슈퍼마켓에 갔다가 한국말이 들려서 돌아보니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었다. 한국말이 반가웠다. 그 부부의 도움으로 오타발로에 집을 얻었다.


한국에서 글 쓰는 후배가 온다고 했다. 어찌나 반갑던지. 그 후배와 아마존에 가까운 더운 지방에도 가게 되었다. 오타발로 길을 걷다가 문득 보게 된 여행사에 들러서 예약했다. 여행사에서 본 로지는 근사했는데, 막상 가 보니 바퀴벌레가 득실득실했다. 후배가 바퀴벌레를 나보다 더 무서워해서, 나는 무섭다는 말을 못 하고 용기를 냈다. 오래전, 다른 후배와 캄보디아에 갔을 때, 화장실에서 샤워 중인데 마침 바퀴벌레가 출현했다. 나는 얼음땡이 되어 후배의 이름을 불렀다, 아니, 외쳤다. 후배는 무슨 일인가, 와서 보더니 휴지를 둘둘 말아 바퀴벌레를 때려잡고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렸다. 내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바퀴벌레를 때려잡는 후배가 위대해 보였다. 그 뒤로 후배는 나에게 이따금 말했다. 캄보디아 여행, 하면 내가 바퀴벌레를 무서워하던 게 생각난다고.
그렇게 무서운 바퀴벌레가 득실거린다니. 아무래도 견딜 수가 없어서 이박 삼일 예정으로 값을 치렀는데, 다음날 거기를 떠나기로 했다. 거기서 보트를 타고 내려가다가 어릴 적 궁금했던 피라냐도 보았다. 피라냐는 과연 이가 험악해 보였다. 그러고 돌아와 후배와 갈라파고스에도 가게 되었다. 다윈이 오래전에 와서 진화설을 알게 된 곳이었다. 수도인 키토에서 비행기를 탔다. 내가 살던 곳의 고도가 높아선지, 평지인 갈라파고스 공항에 다가갈수록 머리가 많이 아팠다. 이러다 실핏줄이 터지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팠다. 후배 말로는 내 한쪽 눈이 빨개졌다고. 막상 내린 갈라파고스는 한적했다. 프로그램 가운데 스노클링이 있었는데, 내게는 물이 너무 차가웠다. 그래서 스노클링 복을 벗고 배로 돌아왔다. 한참 뒤에 돌아온 후배는 스노클링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었다. 오래전, 인도네시아에서 스노클링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땐 물이 차갑지 않았다. 산타 크루즈 섬의 숙소를 예약해 두었는데, 후배의 뱃멀미가 심해서 숙소에 연락해서 취소했다.


그렇게 다시 에콰도르로 돌아왔다. 그런 뒤에 후배가 페루로 여행하고 싶다고 해서, 후배 혼자 보내는 게 걱정이 되어서 갑자기 페루행 비행기 표를 끊었다. 페루엔, 코이카 시절에 알게 된 후배가 살고 있었다. 내가 코타카치에 있을 때 거기까지 와준 후배였다. 키토의 공항에선 후배가 먼저 출발했는데, 내가 페루에 도착하고 난 뒤에도 후배의 비행기는 도착하지 않았다. 항공사에 물어보니 언제 올지 모른다는 답변. 이게 무슨 일인가 했다. 나보다 30분쯤 먼저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고가 난 걸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알고 보니 후배는 내게 메시지를 계속 보냈는데, 페루 공항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어서 내가 못 받은 거였다. 후배는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나왔다. 계속되는 연착에 지친 듯했다. 이미 남미에 적응한 내게도 이해가 안 가는 지연이었다. 페루 후배가 예약해서 보내준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했다. 페루는 고원지대인 에콰도르와 달리 평지에 가까웠다. 해변도 있었다.

에콰도르, 한국과 문화가 다른 점이 있었다. 내가 살던 집주인은 네덜란드로 가서 장사해서 돈을 벌어왔는데, 그 집 아들이 이따금 분노에 찬 소리를 내었다. 그 아빠가 아들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네덜란드에서 돌아와 고등학생 아들과 딸이 둘 있었는데, 그제야 결혼식을 올렸다. 알고 보니 이 나라에선 결혼해서 살다가 아기 낳고 결혼식 올리는 일도 흔하다고.
후배가 떠나고 난 뒤, 다시 쿠바에서 알게 된, 무역하는 한국 처자가 사장이자 사촌이며 약간 갑질하는 오라비와 함께 우리 집에 놀러 왔다. 언니의 아들인 조카와 함께. 그들과 함께 호수에 가서 배를 타고, 코타카치 아주머니 댁에도 들렀다. 과야사민 박물관에도 갔다. 에콰도르의 민중화가라는. 그러나 그의 집은 화려했다. 그가 그린 그림과 그의 집이 겉도는 느낌이었다. 후배가 왔을 때 같이 갔었다. 오타발로 시장에는 과야사민의 그림을 모사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거기서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한번은 버스에 탔는데 웬 남자가, 하고많은 빈자리를 놔두고 내 옆에 앉았다. “너 어디에서 왔니?” 그 남자가 물었다. “한국” 내가 차비를 내자 그 남자, 내 차비를 제가 받더니 1불짜리 동전으로 “두 사람”이라며 냈다. ‘아, 선수구나!’ 싶었다. 외국여자를 겨냥한 선수. 그는 은행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나에게 전화번호를 묻는데 나는 없다, 고 했다. 그랬더니 그 남자, 자기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면서 이름이 ‘마르셀로’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남자가 ‘선수’라는 생각에 그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 후배가 와서 오타발로 거리를 걷다가 그 남자를 우연히 만났다. 나는 휴대폰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혼자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거나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거나 했다.


한국 처자의 남편 이름도 마르셀로였다. 내가 작업실이 필요하다니까 마르셀로가 자기 부모 집을 소개했다. 한 달에 25불이라는 싼값이었다. 거기로 이사해서 한동안 버스 타고 출퇴근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전갈이 나왔다. 여수에 있던 시절, 학교에서 점심 먹으러 와보니 부엌의 설거지통 속에서 차르락 소리가 났다. 지네 한 마리가 거기에 들어 있었다. 집주인의 딸이 와서 잡아주었다. 그런데 전갈이라니. 하는 수 없이 본채로 가서 마르셀로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그 부모님은 뜨거운 물을 갖고 와서 부으셨다. 그러더니 전갈이 죽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 집 아들딸들은 내가 사는 동네에 각자 집을 지었다. 오며 가며 아는 얼굴을 만나는 게 즐거웠다. 그 집에서 성탄절 파티도 열어서 구경하러 갔다.
그랬는데 한국 처자의 어머니가 오시면서 뭔가 일그러졌다. 그 어머니는 나에게 적의를 보이셨다. 내가 자기 사위와 이상한 관계라면서. 나중에 그 딸이 말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젊은 시절,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보는 모양이라고. 살다 살다 이런 오해는 처음이었다.
오타발로 시장을 걷다 보면 한국에서 여행 온 사람들을 더러 만난다. 그들은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여자가 이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게 신기했던 것 같다. 그래서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 왠지 아주 돌아와야 할 것 같아서 마일리지로 표를 끊고 돌아왔다. 돌아와서, 에콰도르에 있는 친구에게 KF94 마스크를 사서 보냈다. 여기서 7만 원쯤 냈는데 그 친구가 74불인가 치렀다고. 그 친구에게, 코타카치에 계신 아주머니께도 몇 장 드리라 했다. 그랬더니 나중에 잘 전해드렸다고, 카톡으로 답을 보냈다. 영주권은 5년에 한 번씩만 들어오면 유지된다고, 영주권 얻어주신 변호사가 말해주셨다. 에콰도르에서 받은 신분증에는 부모님 성함이 영문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 신분증,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에콰도르, 떠나오길 잘했다. 그래도 언젠가 한번은 가려니, 멀긴 하지만.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 작성일
- 2021-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