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작 대 영화
당신이 투명인간이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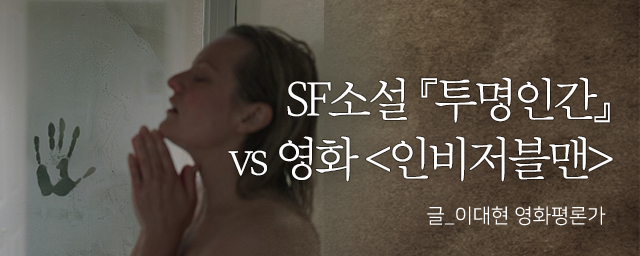
보이지 않는 공포가 있고, 보이는 공포가 있다. 미경험적 공포도 있고, 경험적 공포도 있다. 2020년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코로나19’는 보이지 않는, 미경험적 공포이다. 어느 것이 인간을 더 두려움에 떨게 할까.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공포는 보인다고, 경험했다고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근원적 공포가 있다.
그래서 1만분의 1㎜(0.1㎛) 크기인
바이러스의 실체까지도 눈앞에 드러내려 한다.
시각적 확인을 통해 공포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그것을 경험과 인식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
그것이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작일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상상이다. 그 상상 속에는 욕망이 숨어있다. 대상으로서 ‘보이지 않는
인간’은 공포이지만, 이를 뒤집은 주체로서 ‘불가시성의 인간’은
초능력을 가진 권력이다. 시각적으로 자신의 실체를 지워버림으로써
타인의 눈에 띄지 않고 어떤 행위도 가능하다는 상상은
금기의 욕망, 악을 자극한다. 타자로서 투명인간은 공포의 대상이지만,
자아로서 투명인간은 욕망의 주체이다. 만약 당신이 투명인간이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자문해 보라.

때문에 소설과 영화에서 대부분의 투명인간은 ‘선’보다 ‘악’으로 대상화된다. 왜 투명인간은 일종의 비슷한 인간변종들인 배트맨이나 스파이더맨, 다크맨처럼 ‘슈퍼히어로’가 되지 못할까. 태생부터 의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허버트 조지 웰스가 1987년 소설에서 처음 탄생시킨, 온몸을 꽁꽁 싸매고 검은 안경에 코끝만 빼고 얼굴을 완전히 가린 모자를 눌러쓴 투명인간이 욕망한 것은 ‘비밀, 힘, 자유’이다.
투명인간에게 그것은 “마음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불가시성이 인간에게 의미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곧 불가시성의 인간으로만 사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어리석은지 깨닫는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확실히 그것들을 손에 넣을 수는 있겠지만, 손에 넣은 것을 즐길 수는 없어. 높은 자리에 올라도, 거기에 나타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래서 자신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까지 찾고자 몸부림친다. 웰스는 이 소설을 선천성 색소결핍증인 알비노 환자이자 영국의 가난하고 불우한 한 청년 그리핀의 ‘기묘하고 사악한 실험 이야기’라고 말한다. 단순히 투명인간을 미지의 공포대상으로만 삼지 않고 서사의 주체로 삼아 삶과 의식까지 깊이 서술한다. 때론 그의 존재와 욕망, 분노와 비극적 결말에 동정적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불가시성과 가시성을 자유로이 오가는 존재로서 ‘비밀, 힘, 자유’를 마음껏 누리려는 그리핀의 욕망은 좌절됐지만 그는 수많은 상상의 투명인간들을 태어나게 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 대부분이 그리핀의 유전자를 거의 물려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투명인간’은 웰스 소설의 캐릭터가 아니라 보통명사, 누구나 멋대로 상상하고 욕망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제임스 웨일 감독의 1933년 영화 <투명인간>은 그래도 닮았다고 하지만 ‘발가락이 닮았네’라고 할 정도이다. 그나마 유일한 공통점을 찾는다면 투명인간 자신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웰스는 원작자 대접을 받아야 하지만 영화는 ‘나의 이야기’라면서 무시한다.

이제는 그것마저도 깨졌다. 리 워넬 감독의 2020년 ‘다크 유니버스’ 영화 <인비저블맨>에서 투명인간은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다. <배트맨>에서의 ‘조커’처럼 공포와 악의 대상일 뿐이다. 주인공은 그에 맞서는 또 다른 히어로이다. 그는 여성이다. 시점이, 이야기의 주체가 바뀌었으니 가는 길도 소설과 다르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스릴과 긴장을 만들어낸다는 심리극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영화 <인비저블맨>에서 투명인간은 고통스럽게 자신의 신체를 투명하게 만든 불가시적 존재가 아니다. 투명인간이 되기 위한 고통과 시행착오의 과정이 없다. 21세기 첨단광학기술과 장비로 만든 슈트로 사람들의 시야에 보이지 않는 트릭을 쓴다. 웰스의 시각으로 보면 ‘투명인간’이 아니다. 그러니 옷을 입으면 존재가 드러나 한겨울에도 나체로 추위에 떨거나, 먹은 음식만 보이게 되어 혼자 몰래 밥을 먹지 않아도 된다. 슈트를 입고 벗는 간단한 행위로도 불가시성과 가시성 사이를 언제든 오갈 수 있다.


광학전문가인 애드리안 그리핀(올리버 잭슨 코헨 분)은 아내의 모든 것 - 먹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심지어 생각까지 - 을 통제하려는 소시오패스이다. 그는 뒤틀린 욕망과 잔인성을 사회나 집단이 아닌 부부관계에 집중한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필사적으로 탈출한 아내 세실리아(엘리자베스 모스 분)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그는 자살로 위장하고는 투명인간이 된다. 보이지 않는 그는 세실리아의 주변을 맴돈다. 영화는 그것을 공간 설정을 통해 암시한다. 카메라가 그녀의 뒷모습을 잡으면 뒤쪽을 넓게 비워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준다. 이어 옷걸이에 걸어둔 옷의 움직임, 돌아온 약병, 입김, 휴대폰 등의 물체로 그의 존재가 사실임을 가시화시킨다.


강아지가 냄새로 그리핀의 존재를 알듯이 그 공포는 오롯이 세실리아의 것이다. 영화 속의 다른 인물들은 보이지 않기에 실체를 모르고, 공포도 느끼지 못한다. 때문에 “그는 안 죽었어요. 보이지만 않을 뿐”이라는 세실리아의 절규를 무시한다. 세실리아 혼자 보이지 않는 공포와 남자의 악마성에 맞설 수밖에 없다. 보이고, 안 보이고의 문제가 아니다. 존재에 대한 공포이다. 영혼과 육체를 송두리째 갉아먹으려는 인간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이겨야 한다. 어딜 가든 찾아낼 것이고, 그것을 흔적으로 남기는 ‘투명인간’으로 위장한 남자로부터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다. 공포를 이겨내는 길은 그 공포를 지워버리는 길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깨달음은 곧 용기이자 저항이다.
웰스의 『투명인간』에서 공포와 스릴러, 인간심리와 사회풍자 냄새가 났다면 리 워넬 감독의 <인비저블맨>에서는 사회비판과 페미니즘 요소가 강하게 배어나온다. 투명인간으로까지 변신해 비뚤어진 욕망에 집착하고, 그것을 위해 폭력과 살인까지 저지른 남자에 대한 한 여자의 공포와 절망, 분노와 복수로 이어지는 결말이 그렇다. 어쩌면 앞으로 영화에서 투명인간은 남자(맨)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인비저블맨>의 마지막 장면에서 투명인간이 되어 끝까지 진실을 거부하는 남편 애드리안을 세실리아가 멋지게 처치한 뒤 그 슈트를 몰래 가방에 넣고 가는 것을 보면. 과거에도 없지는 않았지만, ‘배트 걸’처럼 ‘인비저블 우먼’도 곧 나타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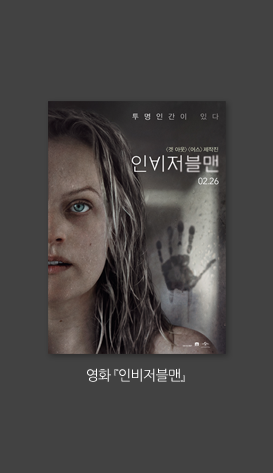
과연 그녀는 어떤 욕망, 어떤 비밀과 힘과 자유를 상상할까.
선과 악을 놓고 어떤 선택을 할까.
웰스 자신이 처음 소설로 그를 만든 순간 투명인간은 보통명사가 되었고,
사람들은 각자 마음속에 자신만의 투명인간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꼭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존재여야 투명인간은 아니다.
성석제의 소설에서처럼 세상에는 멀쩡히 눈에 보이지만
마치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영화가 그중에서 어떤 선택을 해도 투명인간의 변신은 무죄일까.
시각화 할 수 없는 것을 시각화 하려는 것 또한 욕망이다.
- 글
- 이대현_영화평론가. 1959년생저서 『15세 소년, 영화를 만나다』, 『영화로 소통하기, 영화처럼 글쓰기』, 『소설 속 영화, 영화 속 소설』, 『내가 문화다』 등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 이미지 출처 : <인비저블맨> 공식 홈페이지
- 작성일
- 2020-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