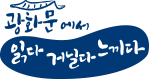문학을 읽다
역사를 거닐다
철학을 느끼다
문학을 읽다
역사를 거닐다
철학을 느끼다
오늘의 화제작
하얼빈
이어보는 콘텐츠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 작성일
- 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