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그 후 이야기
봉선화 꽃물 들인 소녀 - 조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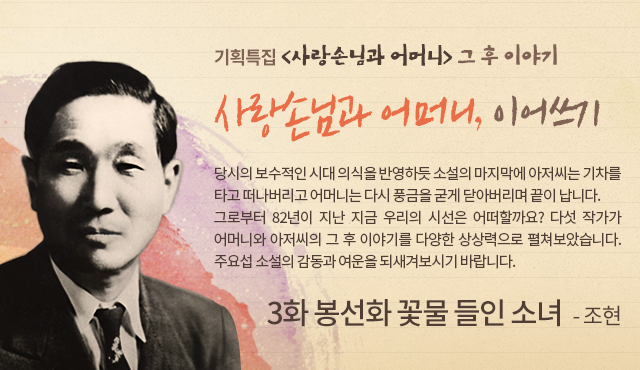
아저씨가 떠나고 나니 집이 텅 빈 듯 쓸쓸하였어요. 사날이 지났는데도 슬근히 아저씨가 어딘가에서 나타나
“옥희는 사탕 좋아하나?” 하고 커단 댕구알 사탕을 건네주며 말을 걸 것만 같았지요. 그래서 난 방에서 풍금을 타다가도 사랑 쪽에서 무언 소리라도 나면 쪼르르 달려가 봤지요. 하지만 날 꼭 안아주던 아저씨는 간데없고 검댕 묻은 강아지만 사랑 뜰에서 펄렁펄렁 날아다니는 나비를 쫓고 있었지요.
나는 그 꼴이 우스워서 한참 깔깔거리다가도 잠깐 지나면 왠지 티끌이 들어간 듯 눈이 시려와 눈새를 비비곤 했지요. 그리고 애꿎은 강아지를 톡톡 차며 “가이야, 혼자서만 그리 좋아 수선스레 굴지 마라. 난 이제 달걀도, 아저씨도 없는데” 하고 사랑 밖으로 내보내지요.
한겻 혼자 풍금을 타다가도 아저씨가 보여주던 그림책이 생각나는 날이면 슬쩍 작은외삼촌 방에 들어가 책을 꺼내보지요. 짐을 꾸릴 때 아저씨가 외삼촌에게 준 그림책에는 아주 멋진 그림들이 들어 있었어요. 난 그 중에서도 나만한 계집애가 남자 어른을 옆에 세우고 가만히 앉아 있는 그림을 좋아하지요. 난 책갈피를 해 놓았기에 그림책을 펼쳐 고 계집애를 단번에 찾을 수 있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사랑마루에 앉아 그림에 홀딱 빠져 들여다보고 있을 때면 아저씨는 갱지에 뭔가를 그렸지요. 한번은 그게 몹시 궁금해서 “아저씨, 무에 그리우?” 하고 물으면 “옥희 얼굴이 똑똑해서 그리고 있지” 하고 내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여주지요. 난 아저씨가 기다린 숯으로 그려가는 얼굴이 세수 후에 면경으로 보던 내 모습과 꼭 닮아 흡족했지요. 유치원 들어갈 때 새로 얻은 머리핀도 똑바로 그려져 있고요. 하지만 다시 찬찬히 들여다보니 반듯하고 예쁜 얼굴이 왠지 나보다 꽤 어른스럽게 느껴져 좀 이상하게도 생각됐지요.
작은외삼촌이 그러는데 아저씨는 먼 데에서 그림공부를 했고 지금은 우리 동리 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사랑 한가득 그림책이 많았나 봅니다.
난 그 얘기를 듣고, ‘그림이야 나도 잘 그리는 걸. 어디 그림책에 나온 것보다 더 잘 그리나 보자’ 하고 외할머니 댁 사진첩에서 옛 사진 한 장을 빼어다 아저씨한테 가져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꼭 나만한 또래의 처녀애가 분장을 하고 새초롬히 앉아 있는 그림이었지요. 그 사진을 본 아저씨가“이게 누구나?” 하고 묻자 난 혀를 까불며 한껏 으스댔지요.
“보면 모르우. 우리 엄만데 꼭 나만했을 때 학교에서 학예회 연극을 할 때 찍은 거야요. 요것도 그릴 수 있수?”
세상에서 가장 예쁜 우리 어머니이니 먼 데서 그림을 공부한 아저씨라면 얼마나 더 멋지게 그릴지 난 큰 기대를 하였어요. 그러나 아저씨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며 급히 사진을 치웠어요. 그런 아저씨가 나한텐 영 젬병처럼 여겨졌어요. 그리기 귀찮으면 그만이지 얼굴이 빨개지도록 성을 내며 사진을 품속에 감출 일은 무어예요.
“싫으면 내 얼굴이라두 잘 그려주시우” 하고 볼멘소리로 말하니 “만약에 아저씨가 옥희 얼굴을 다 그리문 고 그림을 어머니한테도 보여줄 테야?” 하고 되묻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렇게 좋은 일을 어떻게 나 혼자만 알 수 있겠어요? 어머니는 물론이고 유치원 동무들한테도 뽐내며 자랑할 수 있는데요. 동무들 모두가 가진 아빠가 없어 그동안 기가 죽어 있었는데 그림이 생긴다면 실컷 자랑할 거야요. 그래서 기뻐 고개를 끄덕이며 아저씨와 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지요. 그랬는데, 그랬는데……… 아저씨 없는 사랑 우로 쓸쓸한 낮달만 걸려 있네요.
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안채에서 어머니가 찾는 소리에 만지작거리던 책갈피 꽃잎을 그림책 사이에 숨겨 두고 일어섭니다. 어머니가 버리라고 하신 빼빼 마른 꽃송이예요. 왠지 이걸 버리면 아저씨와의 약속이 영영 잊히고 말 것 같아서 차마 버리지 못했던 거야요.
그날도 사랑에서 몰래 마른 꽃송이를 만지작거리며 그림책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꼴을 지켜보던 작은외삼촌이
“옥희야, 아저씨 보고 싶나?” 하고 넌지시 말을 건넵니다.
“외삼춘두 그걸 말이라고 해? 난 아저씨한테 얻을 것두 있단 말이야.”
“삶은 달걀 말인가?”
난 외삼촌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게걸거리는 강아지도 아니고, 나같이 다 큰 처녀애가 어찌 달걀만 찾는다고 여기는지. 작은외삼촌을 모르겠지만 나 같은 처녀애는 달걀이나 사탕 못지않게 동무들한테 선선히 자랑할 것도 필요한 일이야요. 하여 난 밑두리콧두리 외삼촌한테 아저씨와의 약속을 일러 바쳤더래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지” 하고 한참을 생각하던 외삼촌은 “한데 옥희야 그 꽃은 뜻이 좋지 않다” 하고 내가 만지작거리는 마른 꽃송이를 보며 말합니다. 그리고 ‘아네모네’란 서양 꽃의 이름과 ‘사랑의 괴로움’이란 꽃말을 알려주었어요. 난 외삼촌이 일부러 날 놀리는 말 같았어요. 사랑이 괴롭다니? 외삼촌은 아저씨와 사랑을 나눠 쓰면서 불편한 게 꽤 있었나 보아요. 난 사랑에 오면 좋기만 하던데 뭐. 하긴 외삼촌은 끼니때마다 아저씨 상을 들고 다녀서 골이 났나 봅니다. 하기야 아저씨가 외삼촌한텐 달걀 한 알 주는 꼴을 못 보기도 했죠.
“외삼춘, 그럼 꽃말이 좋은 것두 있수?” 하자 “손톱에 들인 물이 가을 서리 내릴 때까지 남아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꽃도 있지” 하며 뜰에 핀 봉선화를 가리켰어요. 그래요, 이 얘긴 유치원 동무한테도 들은 적 있는 것 같았지요.
난 외삼촌의 말에 그날 바로 장독대 옆에 핀 봉선화 꽃잎을 땄지요. 그리고 꽃물을 들여 달라고 어머니를 졸랐답니다. 아저씨를 다시 만나면 좋아하는 달걀도 한껏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하루에 두 알, 아니 세 알.
내 속마음도 모르고 어머니는 봉선화 붉은 꽃잎을 곱게 찧어서 명반을 섞었어요. 그리고 무명지 손톱에 덜어 올린 다음 잎사귀를 대고 명주실로 손톱을 매었습니다.
“잠을 험하게 자면 잡아맨 봉선화가 벗겨질 텐데 온전할라나” 하는 말에 난 아무래도 어머니와 부대끼며 자면 필연 그렇게 될 것만 같아 이제는 따로 자겠다고 했지요. 생각해보니 이제 난 어엿한 처녀인 거야요.
밤에 자다가 깨어보니 늘 만져지던 어머니의 보드라운 살이 느껴지지 않아 좀 무섭기도 했지만 예쁘게 물든 손톱을 동무들에게 보여줄 생각을 하며 명주실이 감긴 가락꼬치를 꼭 손에 움켜쥐고 잤답니다.
그렇지만 다음날 일어나 부스스한 얼굴로 봉선화 잎사귀를 벗겨보자 아주 옅은 물만 들어 있었어요. 울상인 나에게 어머니는 “꽃물은 단 한 번에는 제 색이 나오지 않아. 두어 번은 더 공을 들여야 비로소 고운 색이 나오는 걸” 하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두어 밤을 더 애쓰자 제 무명지는 마치 사랑마루에 내려앉는 저녁놀처럼 고운 빛깔로 물들었어요. 난 간만에 집에 들른 큰외삼촌한테도 “큰외삼춘, 어머니 꽃물도 예쁘지만 옥희 것이 더 곱지요?” 하며 퍽이나 자랑을 했답니다. 봉선화 물들인 손들을 보며 작은외삼촌과 큰외삼촌은 자기들끼리 뭔가를 속닥입니다. 그리고 날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양에 난 인형 귀에 대고 아무도 못 듣게 속삭였어요.
”아무렴 내 손톱이 더 곱단 말이겠지. 아마도 엄마한테 미안하니 저리 귓말을 하는 거겠지.”
뜨문뜨문 풍금을 타며 유치원에서 배운 창가를 연습하는 사이에 여러 날이 지나고, 속깍지에 백열등을 품은 듯 윤기 나는 홍옥들도 끝물인 계절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바느질 삯으로 가끔 사탕도 사주고 철마다 옷도 지어주지만 여전히 달걀은 사지 않으셨어요. 달걀장수 노친네도 한동안은 대문을 두드렸는데 매번 일 없다는 말에 이젠 발걸음을 그쳤지요.
바람이 매운 어느 날, 외할머니가 준 홍옥을 두툼한 저고리 앞자락으로 싹싹 광을 내 한입 베어 물고 있는데 큰외삼촌이 웬 짐 꾸러미를 들고 오셨어요. 작은외삼촌은 귀띔을 들었는지 안채에서 바느질 하던 어머니를 사랑으로 부르고 우린 모두 모였지요.
작은외삼촌은 꾸러미를 열어 바스락거리는 편지를 꺼냈어요. 아저씨가 나한테 그림을 보낸다며 ‘옥희’라는 그림 이름이 똑똑히 적혀 있었어요.
“외삼춘! 그림 이름이 내 이름이래” 하고 얼른 그림을 보자고 성화를 댔지요. 작은외삼촌은 방그레 웃으며 “옥희는 좋겠네. 이제 커단 처녀가 돼서 넉넉히 그림 모델도 되고” 하고 그림을 덮은 하얀 광목을 스스륵 벗겨냈지요.
아저씨가 지어준 이름처럼 그림 속에는 날 꼭 빼 닮은 계집아이가 뜰에 앉아 있었어요. 지난봄에 외할머니가 주신 예쁜 머리핀에 어머니가 새로 지어주신 노란 옷을 입고 눈새가 훤한 모습이 저번에 아저씨가 갱지에 숯막대로 그려내던 그대로였어요. 특히나 쏙 마음에 들었던 것은 곱게 꽃물 들인 손가락이었지요. 꽃물 들이느라 애써 여러 밤을 혼자 보낸 보람이 있었어요. 눈매가 너무 진한 얼굴이 좀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난 참말로 기분이 좋아 큰외삼촌 무릎에 앉아 한껏 어깨를 으쓱대며 그림을 보았답니다. 난 유치원 동무들한테 뽐낼 생각에 기분은 날아갈 듯했어요. 동무들을 집에 데려와 버룩버룩하면서 실컷 자랑을 할 거야요. 작은외삼촌이 “옥희야 그림 어데 걸까?” 하는 말에 “외삼춘, 매시 곁에 두고 싶으니까 우리 방에 걸 거야요” 하고 답했지요. 어머니는 머뭇하다가 안채에 어데 자리가 있냐고 말리셨지만, 작은외삼촌은 이제는 쓰지 않는 오래된 장롱을 슬쩍 옆으로 밀고 그 자리에 조심스레 못질을 한 다음 그림을 걸어주셨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엄마는 사탕 껍질을 벗겨 내 입에 넣어주었어요. 난 어머니 품에 안기며 “엄마도 한 알 먹지” 하니 “옥희가 배부르면 엄마도 배부르고 옥희가 좋다고 하면 엄마도 뭐든 좋아” 하며 숨이 가쁠 정도로 날 꼭 껴안지 뭐예요. “애구 난 사탕도 좋지만 좋아하는 다른 것도 있을 걸” 하고 푸념을 하자 “알지, 알고 말고. 낼은 옥희가 좋아하는 달걀이나 한 꾸러미 사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난 참말로 기뻐서 어머니 품에서 벗어나 아저씨가 보내준 그림 앞에서 폴짝폴짝 뛰었지요. 어머니는 그런 날 한참 보다가 낮에 슬쩍 구석으로 밀려난 장롱을 만져 보더라고요. 그러가나 말거나 난 슬며시 아저씨의 편지를 다시 꺼내보았지요.
“옥희야, 잘 지냈니? 똑똑한 네 얼굴이 보고 싶고나” 하고 시작된 아저씨의 편지는 “그날 기차에서 달걀 잘 먹으며 갔지. 달걀이 여스 알이나 돼서 내내 먹었단다. 답례로 그림을 보내마. 옥희야, 답장 기다리마” 하고 끝을 맺지요. 난 어머니가 들을 새라, 인형 귀에 대고 조그맣게 속삭였어요. “아저씨는 참 이상도 하지, 그림은 내 얼굴 그려주기로 약속한 건데 어찌 달걀 여스 알에 대한 답례라고 한 걸까. 애구 혹시 아저씨도 달걀을 더 얻어먹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닐까. 세상에서 제일 고운 우리 엄마는 참말로 달걀도 맛나게 삶으니까 말이야.”
뜰을 내다보니 은빛 보름달이 껍질 벗긴 달걀마냥 토실하게 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로 먼 데서부터 날아온 별띠 하나가 사뿟이 떨어집디다. 난 꼭 나만큼이나 꽃물이 남아 있는 어머니의 손을 슬며시 잡아봅니다. 몸이 꽤나 으스스한 게 꼭 첫서리가 내릴 것 같은 밤이었지요.

〃 작가소개 〃
조현
소설가. 1969년생
소설 『누구에게나 아무것도 아닌 햄버거의 역사』 등

-
『사랑손님과 어머니』
1935년 《조광(朝光)》지에 발표된 주요섭(1902~1972년)의 단편소설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과부인 어머니와 사랑방에 하숙을 든 아저씨의 미묘한 연정을 여섯 살 난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서술한 서정성 짙은 작품입니다. 시대적 분위기로 인해 아저씨와 어머니는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채 아저씨가 사랑방을 떠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됩니다.
- 작성일
- 2017-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