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연재소설
[단단하게 부서지도록] 24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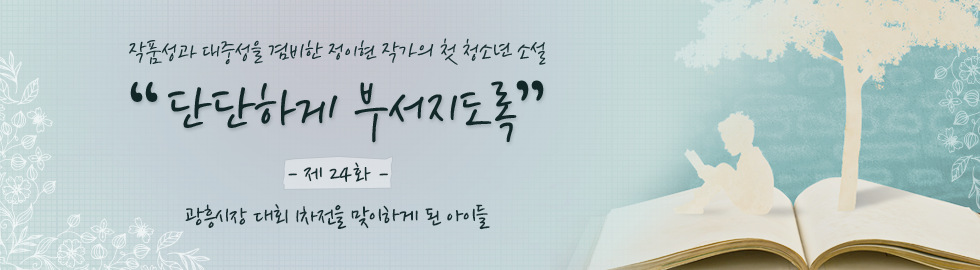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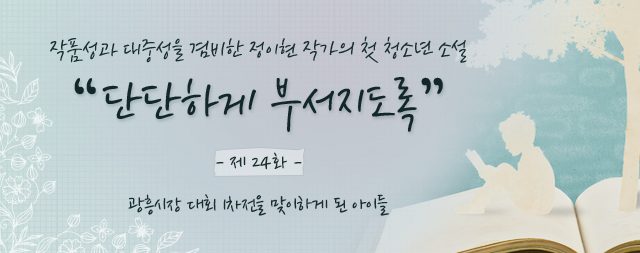

행운이 그렇게 쉽게 찾아올 리 없었다. 부전승은커녕, 1차전에서 우리가 맞붙을 팀은 무려 지난해의 준우승팀이라고 했다.
더구나 홈팀이었다. 선생님은 그 얘기를 숙소에 도착해서야 했다.
“쫄 거 하나도 없어. 어차피 우리보다 못하는 팀 없어.”
이럴 때 선생님은 쓸데없이 단호했다. 선생님 얘기에 한껏 긴장해서일까, 개막식에서 마주친 다른 팀 선수들도 뭐 어마어마한 실력의 소유자들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유니폼을 입지 않았다면 동네 학원이나 학교에서 얼마든지 마주칠 만한 모습이었다.
키도 내가 제일 크고 덩치도 내가 제일 좋은 것 같았다.
우리 팀은 줄을 맞춰 입장했다. 주장인 내가 학교 깃발을 들고 맨 앞에서 걸어야 했다.
소프트볼 전용 구장에는 처음 들어가 보았다.
내야는 모래와 흙이었고, 외야는 잔디였다. 짧게 깎은 잔디 풀이 가지런했다.
멀리 검정색 전광판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앞으로 내딛는 발걸음에 자꾸 힘이 풀렸다.
상대 팀 응원단들이 작은 응원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전교생이 아주 다 왔나 보네.”
우리 팀 누군가가 과장법을 사용하며 중얼거렸다. 그 말에 다들 쿡쿡 웃었다. 그렇게라도 이 불안감이 다독여진다면 다행이지 싶었다.
국제 규정에 따르면 소프트볼 여자 고등부 경기에서 홈과 투수판 사이의 거리는 12.1미터로 정해져 있었다.
그 12.1미터가, 나와 홈플레이트 사이의 거리였다. 나와 세계 사이의 거리였다. 연습 때부터 줄곧 끼어오던 글러브는 이질감 없이 왼손에 휘감겼다.
나는 오른손바닥으로 형광 연둣빛의 소프트볼 공을 꽉 그러쥐었다. 딱딱하고 부드럽고 둥그런 공.
공을 던지는 것은 지구를 던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내가 아는 지구, 내가 아는 세상 전부를.
첫 타자가 타석에 섰다. 나는 타자와 타자의 배트 대신, 포수의 미트만을 노려보았다.
저 사람을 향해 공을 던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 왜? 공을 잡았으니, 여기 섰으니, 던져야 한다.
던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공을 던지는 것이 나의 의무였다. 나는 천천히 와인드업을 했다. 그리고 첫 구를 던졌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정직한 공이 미트에 내리 꽂혔다. 타자의 배트는 꼼짝하지 않았다.
주심이 선언했다.
“스트라이크!”
나는 호흡을 골랐다. 이 느낌을 알고 있다. 아직 멀었다는 느낌. 그러나 하나씩 지워가고 있다는 것,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는 것.
나만 아는 느낌이었다. 두 번째 공은 더 빠르게 나갔다. 딱! 배트에 맞았다. 제대로가 아니라 빗맞았다는 감이 왔다.
그러나 공은 2루수와 유격수 사이를 가르고 어이없이 빠져나갔다. 수비수들이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는 사이, 타자는 1루를 돌아 2루까지 냅다 달렸다.
상대 팀 응원단은 마치 한국시리즈 우승을 거머쥐기라도 한 것처럼 요란한 함성을 질러댔다.
첫 타자가 2루에 나가 있다는 것에 신경이 쓰여 집중이 잘되지 않았다.
투수 입장에서 모든 주자가 다 껄끄럽지만, 그래도 내 경우는 2루 주자가 가장 싫었다. 2루에 주자가 있다는 건 안타 한 방이면 홈을 내줄 수 있다는 뜻이었다.
혹은 아직은 3루라는 자리가 남아 있다는 면에서 보면 최악은 아니었다. 그러니 2루는 희망적이기도 하고, 절망적이기도 하다.
희망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는 상태, 희망도 절망도 아닌 상태를 내가 가장 못 견뎌 한다는 걸 알았다.
어느새 카운트가 스리 볼, 원 스트라이크까지 몰려버렸다.
타자는 두 번이나 연속해서 파울을 쳤다. 왜 어정쩡한 상태는 금방 지나가지 않을까? 불안은 금세 해소되지 않을까?
스리 볼 투 스트라이크 풀카운트에서 타자가 배트를 힘차게 휘둘렀다.
그러나 내 변화구에 속았다. 스트라이크 아웃.
포수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숨을 훅 내쉬고 모자를 고쳐 썼다. 이제 겨우 원 아웃이었다. 아니 지금은 그냥 원 아웃이었다.
아웃 카운트가 둘, 더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내 앞에는 숨을 고르고 멀리 던져야 할 여러 이닝이 켜켜이 쌓인 채 기다리고 있었다.
세 번째 타자는 내야플라이 아웃으로, 네 번째 타자는 삼진으로 각각 처리했다. 한 회가 끝났다.
공수 교대를 위해 더그아웃으로 들어오자, 선생님이 내 등을 가볍게 감싸 안는 시늉을 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네요.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좋을 텐데 아직 멀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누군가가 내게 생수병을 건넸다. 목울대를 타고 찬물이 콸콸 넘어 들어갔다. 흐릿하던 세상이 비로소 똑똑히 보였다.
공격의 시간이 시작되었고, 우리 팀은 1회 말 삼자범퇴를 당했다.

정이현 작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02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소설집 『낭만적 사랑과 사회』 『오늘의 거짓말』 『상냥한 폭력의 시대』, 장편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 『너는 모른다』『사랑의 기초ㅡ연인들』 『안녕, 내 모든 것』, 짧은 소설 『말하자면 좋은 사람』, 산문집 『풍선』 『작별』 등을 펴냈다. 이효석 문학상, 현대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받았다.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 작성일
- 2017-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