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연재소설
[단단하게 부서지도록] 23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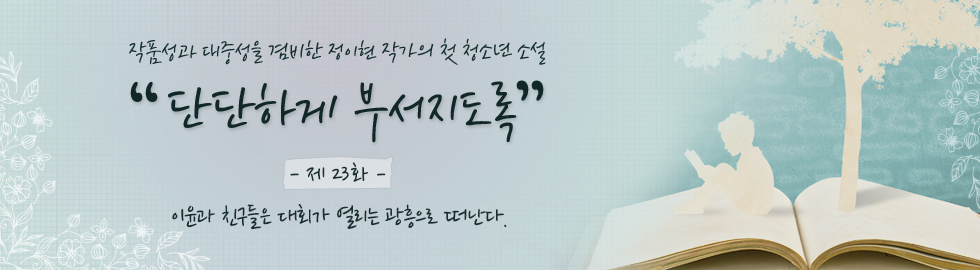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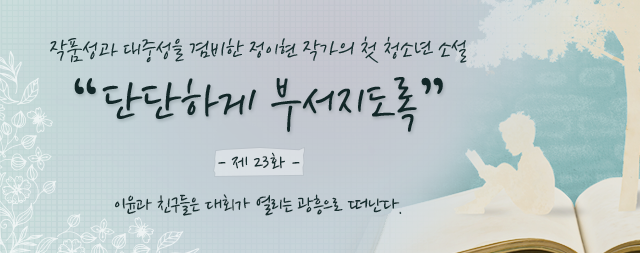

경기 일정은 총 4일이었다. 첫날은 개회식, 마지막 날은 결승전과 폐회식, 그 사이에는 경기가 있었다. 전국에서 모두 아홉 개 팀이 참여한다고 했다.
“네?”
“왜? 너무 많아서?”
선생님은 농담도 잘하신다.
“전국 대회라면서요?”
“그래. 그렇다고 전국의 모든 팀이 다 출전하지는 않겠지.”
지윤이 손을 번쩍 들었다.
“짝이 안 맞습니다. 홀수인데, 1차전을 어떻게 치르죠?”
“한 팀은 그냥 올라가는 거지.”
“누가요?”
아이들이 거의 입을 모으다시피 하여 외쳤다. 다들 무슨 마음인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글쎄, 뽑기?”
선생님이 씩 웃으며 반문했다.
“공짜로 2차전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
‘네’와 ‘아니요’가 반반씩 섞여 나왔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둘 중 어느 쪽도 내 마음을 완벽하게 대변하는 답은 아니었다.
부전승으로 올라가게 되면 물론 고마울 것이다. 무엇보다 경기 횟수가 하나 줄어들게 되니까.
전력이 비등비등하다는 전제하에, 힘겹게 1차전을 치르고 올라온 팀과 경기를 하면 힘을 비축한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승부를 겨뤄보고 싶은 마음도 컸다. 누군가를 이겨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다른 편’이 없다면, 어떤 운동경기도 존재할 수 없다. 우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면 다른 팀과의 실전이 꼭 필요했다.
횟수는 많을수록 좋았다.
막 시작한 우리, 아니 나의 소프트볼이 첫 걸음마를 뗀 수준은 되는지 한시라도 빨리 뚜껑을 열고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솟구쳐 올랐다.
물론 승부를 선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기고 싶었다.
선생님은 설명 없이 씩 웃으셨다.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에서 아침 여덟 시 집합. 내가 놀랐던 건, 경기장까지 전세 버스를 타고 갈 거라고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감생심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보다.
“표값 걷어야죠?”
역시 착한 지윤이가 주섬주섬 지갑을 꺼냈다. 선생님이 웃음을 터뜨렸다.
“야야 넣어둬. 학교에서 이 정도는 지원해준다.”
“오오.”
아이들이 공개방송 방청객 효과음 같은 소리를 냈다.
“설마 너희한테 돈 내라고 하겠니?
숙소는 대회에서 제공하고, 식대와 교통비는 다 학교 지원이야. 그러니까 어때야겠다?”
“잘해야겠습니다!”
“그래. 우리의 목표는 한 끼라도 더 먹고, 하룻밤이라도 더 자고 오는 거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버스터미널 대합실에 둥그렇게 둘러서서 소리를 질러대는 우리를, 지나가는 행인들이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어느 모로 보나 대회에 나가는 운동선수 팀으로 보일 리는 없을 터였다.
한 벌씩뿐인 유니폼은 가방에 곱게 접어 넣었고, 그렇다고 교복 치마를 입을 수도 없으니 다들 자유복 차림이었다.
평일 아침부터 광흥시로 떠나는 승객은 거의 없었다.
마치 우리가 광흥행 고속버스를 전세 낸 것 같았다.
나는 솔미와 나란히 앉았다. 솔미는 차가 출발하기 전부터 종알거리기 시작했다.
“평일 오전에 이렇게 떠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동남아의 리조트로 휴가라도 떠나는 듯 마냥 들뜬 목소리였다.
“지유야. 나는 이런 건 상상도 해본 적 없어. 늘 골골대고 비실거리기만 하던 내가 학교 대표가 되어 전국 대회에 다 나가게 되다니, 헐.”
허얼. 솔미의 감탄사를 입속으로 따라 해보았다. 나 역시 다르지 않다.
끝난 줄 알았던 무대의 막이 다시 오르고, 엉뚱한 공연이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 이런 것일까.
놀랍고 당혹스러우면서 한편으론 허탈했다 내 인생에서 다시는 무대 위에 오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리라 입술을 깨물고 결심했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허무하게 느껴졌다.
그 무대가 크든 작든, 화려하든 아니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작은 무대는 있을지언정 초라한 무대는 없다.
대기실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출연자는 곧 무대 위에 오른다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다.
“할 수 있을까, 우리. 할 수 있겠지?”
솔미가 살며시 내 팔을 잡으면서 중얼거렸다. 솔미는 ‘잘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할’ 수 있느냐고 했다.
질문도 아니고 혼잣말도 아닌 말. 그건 두 가지 모두이기도 했다.
팔짱을 끼었을 뿐인데 그 애의 떨림과 흥분이 내게도 전해져왔다. 쿵쿵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박자를 맞추어 내 심장도 쾅쾅 뛰는 것 같았다.
“응. 하면 되지, 뭐.”
나도 솔미처럼 ‘잘’을 빼고 대답했다.
“할 수 있을 거야.”
‘우리’라는 단어도 빼고 말했다. 소프트볼은 함께하는 것이고 또 혼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 말은 솔미더러, 또 나더러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다.

정이현 작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02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소설집 『낭만적 사랑과 사회』 『오늘의 거짓말』 『상냥한 폭력의 시대』, 장편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 『너는 모른다』『사랑의 기초ㅡ연인들』 『안녕, 내 모든 것』, 짧은 소설 『말하자면 좋은 사람』, 산문집 『풍선』 『작별』 등을 펴냈다. 이효석 문학상, 현대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받았다.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 작성일
- 2017-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