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연재소설
[단단하게 부서지도록] 22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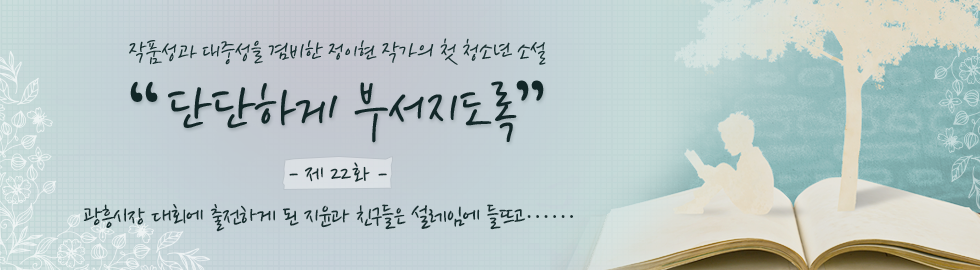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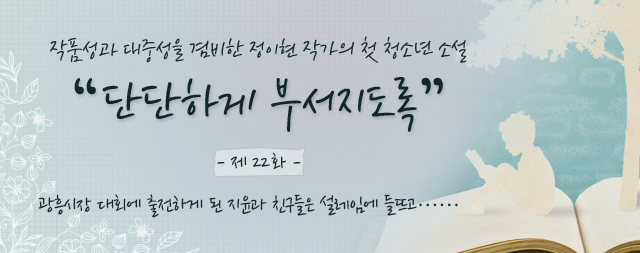

‘광흥시장’은 옆 동네의 재래시장이 아니라, 광흥이라는 도시의 ‘짱’을 뜻했다.
광흥시의 시장님 말이다. 광흥시라는 곳에서 전국 여고부 소프트볼 팀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가 열리는데 우리가 거기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거다.
벌써 대회에? 우리가? 내 속내를 읽으셨는지 선생님이 말을 이었다.
“새로 생겼지만 나름 전국 대회야. 아직은 실력이 안 되지만, 경험 삼아 한번 나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럼 학교 수업은요?”
역시 범생이 지윤다운 질문이다.
“출결 처리엔 문제없을 거야. 대한체육회가 인정하는 대회 기간에는.”
아이들 사이에서 ‘오오’라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광흥시라는 이름은 나도 처음 들어보았다. 선생님 말로는 전남 어딘가라고 했다. 광주에서 차를 차고 한 시간쯤 가면 된다고 하던가.
“나도 안 가봤어.”
선생님이 말했다.
“그럼 어떻게 가나요? 광주까지는 KTX가 있으니까 거기서 버스로 갈아타나요? 아니면 고속터미널에서 한번에 가는 버스를 타나요?”
지윤은 당장이라도 광흥시까지 가는 교통편을 종류별로 쫙 뽑아 정리해올 태세였다.
선생님이 오른손 검지를 펴서 좌우로 흔들었다.
“가는 방법을 걱정할 때가 아니야. 우리가 오늘부터 걱정해야 하는 건 오직 ‘올 때’라고.”
대회 방식은 리그전이 아니라 토너먼트라고 했다. 나에겐 익숙한 용어지만 다른 아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듯했다.
“그럼 한 번 지는 순간 끝이라는 건가요?”
지윤이 묻자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지유가 그 차이를 이야기해봐라.”
왜 또 나인가. 나는 천천히 말했다.
“토너먼트는, 그러니까, 음, 경기를 여러 번 하는 겁니다. 예선에서 같은 조에 속한 모든 팀들끼리 경기를 다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결선에 올라가고요. 리그전은 1차전에서 이긴 팀끼리 2차전을 하고 거기서 이긴 팀끼리 8강전을 하고…… 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장 높이 올라가 본 것은 준결승이었다.
준결승에서 아깝게 지면서 어금니를 깨물었었다. 다음에는 꼭 결승전에 나가보리라고 다짐했었다.
그 ‘다음’은 오지 않았지만.
“잘 들었지? 너희 하기 나름이다. 1차전에서 지면, 그냥 첫날 막차 타고 바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너희가 안 지고 쭉쭉 올라가면, 마지막 날 파티하고 비행기 타고 올라올 수도 있는 거지.”
“거기 공항이 있어요?”
누군가가 물었다.
“아니 공항은 없지만. 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비행기가 없으면 내가 리무진이라도 대절해준다.”
“설마.”
입속으로 중얼거린 줄 알았는데 소리가 밖으로 새 나갔나 보다. 앞에 선 아이들이 나를 흘끗 돌아봤다.
“왜? 강지유. 내가 못 해줄 것 같아? 리무진 태워준다니까?”
선생님은 짐짓 흥분한 척하시지만, 모르지 않을 것이다.
나의 ‘설마’가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설마 우승을? 아니, 아니, 설마 1승을? 승리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뿐이 아니다. 이긴다는 느낌과 진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를 아예 잊어버린 것만 같다.
승부의 세계와 상관없는 곳에서 너무 오래 지내왔더니 감이 떨어진 걸까.
“본격적인 맹훈련에 들어갈 거야. 이제 토요일뿐 아니라 화요일과 목요일에도 연습한다. 점심시간과 방과 후에.”
“네.”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학원에 가야 하는데. 복잡한 시간표를 떠올리다 멈추었다. 모르겠다.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잠시 말을 끊었다. “안 아픈 거다. 한 명이라도 아프면 정말 큰일이야.”
아홉 명. 소프트볼 팀을 만들기 위한 최소인원.
그 숫자를 간신히 맞춰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한 명이라도 부족하면 아예 출전조차 못 하게 되는 것이다.
덜컥 겁이 났다. 못 나가는 것을 상상하니 얼마나 나가고 싶은지 알게 되었다.
갑자기 간절한 마음이 치솟았다.
아픈 한 명, 아홉 명을 여덟으로 만드는 그 한 명이 내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었다.
당분간 나에게 안전하고 따뜻하고 좋은 것만 해주자고 다짐했다. 그때까지.
선생님의 목표는 소박한 것 같았다.
첫 게임에서 7회까지 버티는 것. 즉, 콜드게임 패를 당하지 않는 것.
그걸 입증하듯이 대부분의 연습 시간은 수비 훈련에 쏟았다.
그리고 개중 제구력이 나은 아이들 세 명이 투구법을 집중적으로 연습했다.
선생님의 깊은 의중을 알 수 없었다.
누가 봐도 우리 팀 선발은 나였다. 그건, 뭐랄까, 우리 팀에 정해진 암묵적인 법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지당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선생님은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걸까.
이런 팀에서 내가 선발로 나가 완투를 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현실이었다.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정이현 작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02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소설집 『낭만적 사랑과 사회』 『오늘의 거짓말』 『상냥한 폭력의 시대』, 장편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 『너는 모른다』『사랑의 기초ㅡ연인들』 『안녕, 내 모든 것』, 짧은 소설 『말하자면 좋은 사람』, 산문집 『풍선』 『작별』 등을 펴냈다. 이효석 문학상, 현대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받았다.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 작성일
- 2017-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