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연재소설
[단단하게 부서지도록] 21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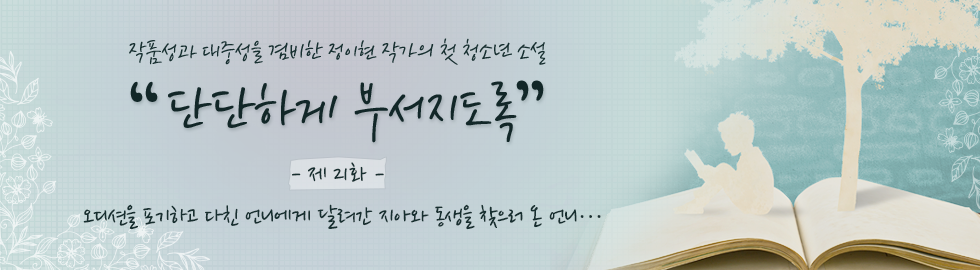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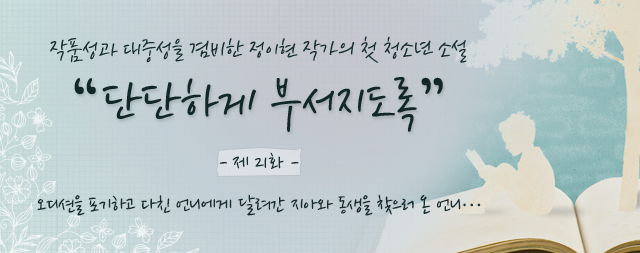

내가 먼저 한 일은 인터넷에서 ‘붕붕 엔터테인먼트’를 검색하는 것이었다.
당연하지 않은가?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어디서도 배우지 못했다.
붕붕 엔터테인먼트로 검색되는 내용은 거의 없었다. 뜨는 거라곤 온통 ‘공고’뿐이었다.
연습생 모집, 직원 모집, 매니저 모집……
지아의 전화기는 계속 꺼진 상태였다. 웹페이지를 뒤지고 뒤져 전화번호를 하나 찾아냈다. 5로 시작하는 국번이었다.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샅샅이 뒤져 사무실 주소를 찾았다.
구글 맵으로 검색해 가장 가까운 전철역을 알아냈다.
욱신거리는 상처 부위를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렀다 떼고 심호흡을 크게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실은 조용했다. 엄마는 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엄마는 내가 잠든 줄 알겠지? 이렇게 탈출을 감행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나는 까치발을 들고 살금살금 움직였다.
현관문 닫는 소리가 너무 크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문을 닫았고, 문을 닫자마자 빠르게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근처에 도착해 버스를 타야 했다.
1층에 만두 가게와 작은 편의점이 있는 낡은 건물이었다.
아이돌, 하면 연상되는 화려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허름했다.
엘리베이터는 없었다. 계단을 걸어 4층까지 올라야 했다. 쥐 한 마리가 내 걸음을 앞서 쪼르르 달려간다 해도 이상할 게 없어 보였다.
2층에서 3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참에 여자아이 둘이 쪼그려 앉아 있었다.
지아는 아니었다. 아이들은 나와 흘끗 눈을 마주치자마자 시선을 피해버렸다.
“혹시 저기 위에 학생이 또 있나요?”
입술을 너무 빨갛게 칠해서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 아이가 대답했다.
“아무도 없어요. 다 갔어요.”
“닫혀 있어요.”
바보 같은 질문인 줄 알면서도 나는 혹시, 지아라는 아이를 본 적 있는지 물었다.
“그런 애 알아?”
“아니.”
모르는 아이들의 짧은 대화를 듣고 있으니 갑자기 소름이 끼쳤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이 넓은 세상에서는 지아도 나도 그저 어린 여자아이 한 명에 지나지 않았다.
여러 아이들 속에 섞여 있으면 굳이 구별해낼 필요가 없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는 다 얼마나 비슷비슷한가. 그러나 비슷하다고 같은 것은 아니다.
남의 눈엔 비슷해 보이지만, 생김생김이 같은 이는 아무도 없다.
얼굴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꿈도 다르다.
모르는 아이들이 알려준 것처럼 붕붕 엔터테인먼트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다. 무섭고 슬펐다. 이 막막한 곳에서 우리 지아를 어떻게 찾나.
만약 그때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다면 나는 기어이 문을 부쉈을지도 모른다. 지아였다.
“어디야?”
우리는 동시에 외쳤다.
“너 찾으러 왔지.”
“언니 찾으러 왔지.”
그 말도 거의 동시였다.
“그게 무슨 말이야?”
“병원에 왔는데 어떻게 된 거야? 언니 왜 없어?”
“너야말로 어떻게 된 거야? 난 오디션장에 왔는데.”
말을 하는데 자꾸 목이 메었다.
“언니가 거길 왜?”
“그러는 넌? 병원에 왜?”
지아의 이야기는 이랬다.
한참을 기다려 막 제 차례가 왔을 때, 친구에게서 카톡이 왔단다.
급성 장염에 걸린 동생을 따라 동네 병원 응급실에 왔는데 아무래도 너희 언니가 있는 것 같다고.
우리는 집 앞 놀이터에서 만났다.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앞 머리칼이 이마에 젖은 미역처럼 달라붙어 있었다. 지아는 내 상처 부위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
“맞네, 맞네. 이 미친 여자야. 이러고 어디를 돌아다닌 거야?”
“너 무슨 일 난 줄 알고.”
“네가 지금 남 걱정할 때야?”
“……너 오디션은?”
“친구 말론, 긴가민가했는데 야구 유니폼 입고 있는 걸 보니 너희 언니가 맞는 거 같다고 하더라. 피가 철철 나서 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누구냐. 과장법 되게 심하네. 그럼 오디션은 안 본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전화는 왜 안 받아?”
“배터리가 나가서 편의점에서 급충천한 거야.”
지아가 비닐봉지에서 뭔가를 꺼내어 내밀었다.
“바나나 우유네.”
내가 중얼거리자 지아가 급히 정정했다.
“아냐. 바나나 맛 우유지.”
바나나 우유와 바나나 맛 우유는 비슷하다.
그러나 다르다. 그것만 잊지 않으면 된다. 나는 빨대로 우유를 쭉 들이켰다.
달큼하고 찬 맛이 입안을 가득 휘감았다. 지아가 내 손을 잡았다.
말랑말랑하고 작은 손. 아주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엄마가 있는 집으로 걸어 들어갔다.
엄마가 낮잠이라도 들었다면 좋을 텐데. 아직도 해가 밝았다. 아주 긴 오후가 지나가고 있었다.
다음 훈련 때까지 내 상처는 많이 가라앉았다.
거즈를 바꾸고 약을 바르는 일은 아침마다 엄마가 해주었다. 엄마는 그럴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친 지 일주일째 되는 토요일 아침에는 마침내 한마디를 던졌다.
“이제 겨우 나아가는데 오늘은 반대쪽을 맞아 오면 아주 볼 만하겠네.”
재밌는 농담을 들었다는 듯 히죽 웃고 싶었지만 차마 웃음이 안 나왔다.
알고 보면 나도 그렇게까지 양심 불량인 인간은 아니었다.
서랍장을 여니 유니폼이 반듯하게 개켜진 채 들어 있었다.
엄마가 어느새 세탁을 해둔 것이다. 어깨 쪽에 든 핏물이 감쪽같이 빠져 있었다.
가방 속에 집어넣으려는데 지아가 말했다.
“그냥 입고 가. 다 들켰는데 귀찮게 뭘 싸 가냐.”
비로소 나는 조금 웃었다.
그래 봐야 히죽,보다는 헛,에 가까웠을 것이다.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쓴 내 모습을 보자 엄마는 자기도 모르게 ‘아이구’라고 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치지만 마.”
엄마와 지아가 입 모아 소리쳤다. 뒤통수가 저릿했다.
“한 달 후에 광흥시장 배 대회가 있어.”
훈련 전에, 선생님이 말했다.
“광흥시장? 첨 들어보는데 어느 동네에 있는 시장이지?”
천재 타자 솔미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정이현 작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02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소설집 『낭만적 사랑과 사회』 『오늘의 거짓말』 『상냥한 폭력의 시대』, 장편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 『너는 모른다』『사랑의 기초ㅡ연인들』 『안녕, 내 모든 것』, 짧은 소설 『말하자면 좋은 사람』, 산문집 『풍선』 『작별』 등을 펴냈다. 이효석 문학상, 현대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받았다.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 작성일
- 2017-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