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연재소설
[단단하게 부서지도록] 20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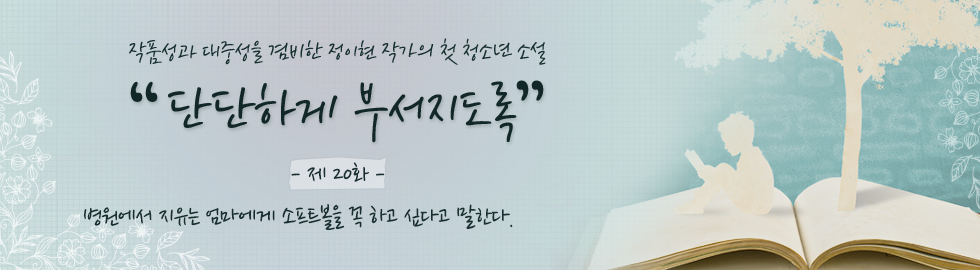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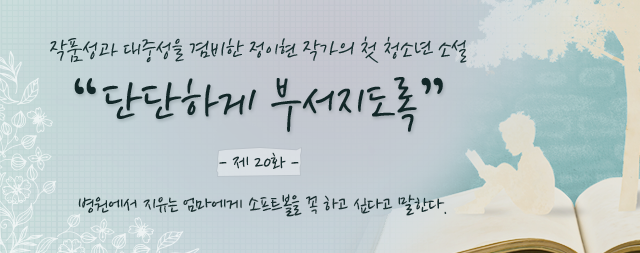

엄마는 말이 없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어떤 말이라도 괜찮으니 한마디 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소리소리 지르면 좋겠는데. 차라리 주먹으로 등짝이라도 한 대 퍽 친다면 내 맘이 좀 편해질지도 모른다.
아프다고 꺅 비명을 질러버리면 되니까.
그렇지만 이런 식의 무거운 침묵만은 견디기 어렵다.
엄마의 침묵은 엄마가 진정한 고수임을 증명하는 것일까?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걸 나는 잘 안다.
내가 느끼는 슬프고 괴로운 감정은 그 때문이었다.
엄마는 언어를 잃고 시력을 잃은 사람처럼 그저 휘적휘적 길을 걸어갔다.
가로수마다 나뭇잎들이 무성했다.
나뭇잎들이 언제 저렇게 초록빛으로 변해버린 걸까.
눈이 부셨다. 나는 몇 걸음 뒤에서 엄마를 따라갔다.
엄마의 뒷모습은 오랜만에 바라보는 것이었다.
단발은 웨이브 파마가 다 풀리고 제때 다듬지 못해 밉게 층이 졌다.
쥐색 카디건의 어깨 부분엔 보풀이 일어나고 성분을 알 수 없는 흰색 얼룩들이 점점이 묻어 있었다.
작고 초라했다.
마취라도 풀리는 건지 거즈로 감싼 상처 부위에 묵직한 통증이 점점 더 강해져 왔다.
한 손바닥을 거즈 위에 지그시 올리고 계속 엄마를 따라 걸었다.
신호등 앞에서 엄마도 나도 멈추었다. 좀처럼 신호가 바뀌지 않았다.
막 보행 신호로 바뀌었을 때 상처 부위에서 갑자기 달아오른 불꽃처럼 화끈한 통증이 올라왔다.
나는 악, 소리를 내며 횡단보도 위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파? 많이 아파?”
엄마가 깜짝 놀랄 만큼 큰 소리로 외치며 내 어깨를 끌어안았다.
“응. 아파. 무지무지.”
어느새 통증이 사라졌는데도 내 입에선 그런 대답이 나왔다.
아프냐는 물음에 무지무지 아프다고 과장해 답할 수 있는 사람, 어쨌든 엄마뿐이었다.
“집에 가도 된다더니. 그 의사 돌팔이 아니야? 다시 돌아갈까?”
엄마의 눈동자에 걱정이 가득 어려 있었다. 나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냥 집에 갈래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엄마는 자기 어깨를 툭툭 쳤다.
“업자.”
“누가? 내가?”
“그럼 내가 업히니?”
나보다 한참 키도 작고 덩치도 작은 엄마를 나는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우리는 결국 팔짱을 낀 자세로 집 앞 약국에 들러 귀가했는데, 물론 우호나 애정을 확인하는 팔짱은 아니었지만 남남인 양 걷는 것보다는 몇십 배 나았다.
침대에 내 몸을 누이고, 보리차를 따뜻하게 데워 오고, 내가 한 움큼의 약을 입속에 다 털어 넣고 삼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엄마는 본격적인 취조를 시작했다. 엄마는 앉은 채, 나는 누운 채.
“언제부터야?”
“얼마 안 됐어.”
“왜 말 안 했어?”
“못하게 할까 봐.”
“그걸 알면서 왜 해?”
“하고 싶어서.”
엄마는 대답이 없다.
나는 시선을 외면했다. 새하얀 베갯잇이 새삼 눈에 띄었다.
한 번도 베갯잇 없는 베개를 베고 잔 적은 없는데. 엄마는 대체 언제 이걸 빨아서 말리고 다시 끼워놓은 걸까.
나는 그 시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다 할 수는 없어.”
엄마의 목소리는 나직했다.
언젠가 내가 지아에게 비슷한 소리를 했던 것도 같다.
그러나 내 말과 엄마의 말은 무게가 다르다.
엄마는 그림을 그려 돈을 벌고, 우리가 벗어두고 간 옷과 더러워진 이불을 세탁하고, 쌀과 채소와 계란이 떨어지지 않도록 장을 보며 사는 사람이다. 엄마에게도 하고 싶은 일은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입이 바짝 말랐다.
“알아요.”
나는 중얼거렸다. 엄마에게 미안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깨달았다.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진심을 밝혀야만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그래도 하고 싶어요…… 꼭 할 거예요.”
엄마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예상치 못한 건 엄마의 반응이었다.
“처음 듣네, 그런 말. 꼭이라는 말.”
그리고 한동안 엄마는 가만히 있었다.
이불을 내 어깨 위까지 끌어 올려 덮어주고는 방을 나갔다. 이불을 꼭 덮고 누워 있기엔 너무 더운 날이었지만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까무룩 잠이 들었다 깨보니 사방이 어두워져 있었다.
상처 부위가 다시 욱신거렸다.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보았다.
부재중 전화 한 통, 그리고 카톡이 하나 와 있었다. 둘 다 지아가 보낸 것이었다.
-언니, 언니야, 전화해줘 빨ㄹ
지아의 메시지는 ‘ㄹ’에서 끊겨 있었다. 지아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두 통, 세 통, 연거푸 했는데도 마찬가지였다.
-무슨 일이야? 왜 안 받아?
카톡 메시지 옆의 ‘1’이라는 숫자가 영 지워지지 않았다.
스멀스멀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포니테일 머리칼을 흔들며 경쾌하게 현관을 나서던 지아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어디에, 어떤 오디션을 보러 가는지 미처 묻지 않은 나 자신에게 화가 치솟았다.
나는 휴대전화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는 지아의 친구들을 되는대로 찾아 똑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지아 어디 갔는지 알아?
제일 먼저 도착한 대답은 ‘몰라요’였다. 이어 ‘모름요’ ‘모르는데요’ ‘아니요’ 등의 답장이 속속 도착했다.
무정하고 무심한 답들 속에서 가슴이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그때 마침내 ‘아는데요’라는 메시지가 딱 하나 도착했다. 발신자는 지아와 초등학교 때부터 단짝인 아이였다.
-어딨는데?
-오디션 본다고 해서 말렸거든요. 근데도 그냥 갔어요. 청담동인가에 붕붕 엔터라고.
-붕붕?

정이현 작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02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소설집 『낭만적 사랑과 사회』 『오늘의 거짓말』 『상냥한 폭력의 시대』, 장편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 『너는 모른다』『사랑의 기초ㅡ연인들』 『안녕, 내 모든 것』, 짧은 소설 『말하자면 좋은 사람』, 산문집 『풍선』 『작별』 등을 펴냈다. 이효석 문학상, 현대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받았다.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 작성일
- 2017-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