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연재소설
[단단하게 부서지도록] 18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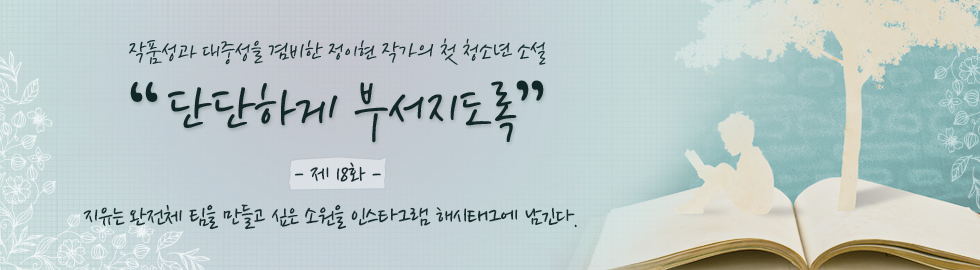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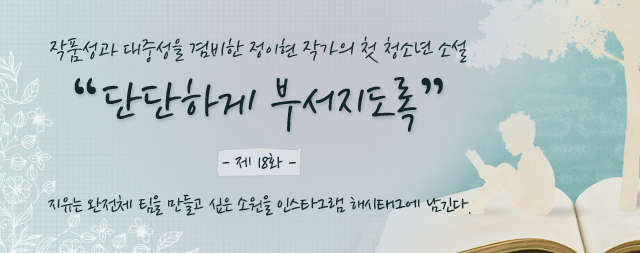

지유 오늘 하루는 어땠어?
규리 보통날이었어. 1년 뒤에 기억하면 어떤 날이 오늘이고 어떤 날이 내일이었는지 구별하기 어려운 하루. 너는?
지유 음. 나는 그래도 구별할 수는 있을 것 같은 하루.
규리 우왕. 대단한 날이네. 소프트볼이 재미있었어?
지유 재미? 그런 건 아직 잘 모르겠어. 그냥.
규리 그냥?
지유 응. 그냥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규리 운동하는 게 좋아졌다는 뜻이야?
지유 음, 막 그런 뜻은 아냐. 아 그렇다고 싫다는 뜻도 아니고. 그냥 제자리에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 시간이 앞으로 움직이는데, 나도 움직이고 있다는 걸 다시 알게 된, 오늘은 그런 하루야.
우리 팀에 인원이 늘어났다. 무려 셋이나. 한 명은 토요일에 우연히 학교에 놀러왔다가 우리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고, 또 둘은 SNS에서 학교 이름을 해시태그(#)와 함께 검색했다가 훈련 사진을 보게 되어 찾아왔단다.
“SNS? 누가 올린 거야?”
선생님이 묻자 발그레한 낯빛으로 손을 든 건 지윤이었다.
지윤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았다. 언제 찍었는지 우리가 훈련하는 모습들이 사진으로 남겨져 있었다.
내가 날아오는 공을 받으려고 엉거주춤하게 하늘을 바라보는 장면도 있었다. 입은 반쯤 벌리고 엉덩이는 미운 오리처럼 한껏 뒤로 뺐다. 그래도 폼이 좀 나는 줄 알았지, 이렇게 어설픈 자세인 줄은 몰랐다.
그런데 이상하다. 그 모습이 낯설기는 해도 싫지는 않았다.
내가 아니라 어릴 때 알고 지내던 옆집 여자아이의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된 것처럼 조금은 반갑고 부끄럽고 또 좋았다.
지윤이는 사진 밑에 이어 붙인 해시태그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놓았다. #완전체가되는그날까지
“음, 이건 뭐냐.”
우리들 어깨너머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던 선생님이 한마디 하셨다.
“난 이건 반대.”
지윤이의 ‘완전체’란 우리 팀 멤버가 아홉이 되는 것을 뜻할 터였다.
누구나 알다시피 어쨌거나 최소 아홉이 되어야 야구팀은 제대로 된 하나의 팀으로 그 꼴을 갖추게 된다.
소프트볼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 평소에 선생님은 그 부분을 강조한 적이 없었다. 아홉 명이 모이면 다른 팀과 연습 경기를 추진해보겠다는 얘기도, 무슨 대회 예선전에 출전해보자는 얘기도 전혀 없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직접 쓴 강지윤이 한번 말해봐.”
혼을 내려는 어투가 아니었음에도, 학생으로서는 졸아들지 않을 수 없었다.
옆에 서 있던 솔미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내 옆구리를 괜스레 쿡 찔렀다.
“음, 일단 제가 쓴 것 맞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제 마음속에서 우리 팀이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지윤은 여리지만 강단 있는 특유의 말투로 대답했다.
“팀원 숫자가 정원에 미달된 상태이고, 그것이 소프트볼 팀으로서 불완전하다는 것은 어쨌거나 팩트니까요. 어서 인원이 충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음, 잘 들었다. 강지윤의 뜻은 나도 이해해.”
선생님이 우리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난 우리가 완전체가 아니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 물론 아홉이 되면 좋겠지만, 영원히 되지 않는다 해도.”
솔미가 나를 다시 한 번 쿡 찔렀다. 지윤은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괜찮아. 그래도 우리는 분명 소프트볼 팀이다.”
괜찮다는 말이 미지근한 물처럼 심장에 스며들었다.
“경기를 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번엔 신입 부원이 물었다. 선생님이 콧등을 살짝 찡그리며 말했다.
“그래도 소프트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된 거지.”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인가.
그럼에도 묘하게 설득력이 있는 말이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소프트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럼 된 거지.
여하튼 이제는 여덟이었다. 한 명만 더 오면, ‘어쨌거나 완전체’가 될 수 있었다.
“언제까지나 내가 캐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원하는 사람? 선착순이다.”
그러나 선착순은커녕 포수 포지션의 지원자는 개미 한 마리도 없었다.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포수가 얼마나 멋진 자리인데. 뭐랄까 전체를 다 보면서 컨트롤하는 거야.”
선생님의 눈길이 닿자 솔미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휘휘 내저었다.
“선생님, 저는 보기보다 체력이 약해서요. 그렇게 오래 못 앉아 있어요.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허리도 좀 안 좋아서 일어났다 앉았다 할 때마다 끙 소리가 나고요.”
모두가 선생님의 시선을 피했다. 즉석에서 포수 오디션이 열렸다.
오디션은 간단했다. 포수석에 앉아 투수가 던지는 공을 받아내면 되었다.
가장 잘 받는 사람이 포수에 낙점이었다.
투수는 물론 나였다.
던지는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제일 곤란했다.
기본적으로 투수의 공은 타자를 속이기 위해서 던져지는 것이었다. 잘 속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무엇보다, 그들이 제대로 던지는 남의 공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음을 고려해야 했다.
나는 망설임 끝에 정직한 직구를 던지기로 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정중앙에 내리꽂히는 공. 그리고 모두에게 공평하도록, 똑같은 공. 마치 내가 시험대에 선 기분이었다.
첫 번째 후보는 새로 들어온 친구인 세라였다.
세라는 어릴 때 동네 오빠들을 따라다니면서 글러브를 끼어보긴 했는데, 잘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처음 봤지만 어쩐지 믿음이 가는 친구였다. 선생님은 나를 마운드에 세우고, 세라를 앉혀보더니 솔미를 불렀다.
“자 그래도 타자가 있는 시늉은 해야지.”
솔미가 생전 처음 배트를 들고 타석에 섰다.
솔미가 어정쩡하게 배트를 잡은 폼을 분명히 뒤에서 지윤이 찍고 있을 거였다.
나는 천천히 와인드업을 했다. 첫 번째 공은 예상보다 셌다.
그런데 퍽 소리와 함께 세라는 그 공을 잘 받아냈다.
“오오, 잘하네.”
선생님이 박수를 쳤다. 세라가 몸을 일으켜 공을 내게 되던졌다.
“하나 더. 더 빠르게 던져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아까보다 빠르게 던졌다.
딱! 공이 배트에 맞는 소리가 났다! 어, 어떻게 된 일이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정신을 잃었다.

정이현 작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02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소설집 『낭만적 사랑과 사회』 『오늘의 거짓말』 『상냥한 폭력의 시대』, 장편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 『너는 모른다』『사랑의 기초ㅡ연인들』 『안녕, 내 모든 것』, 짧은 소설 『말하자면 좋은 사람』, 산문집 『풍선』 『작별』 등을 펴냈다. 이효석 문학상, 현대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받았다.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 작성일
- 2017-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