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연재소설
[단단하게 부서지도록] 17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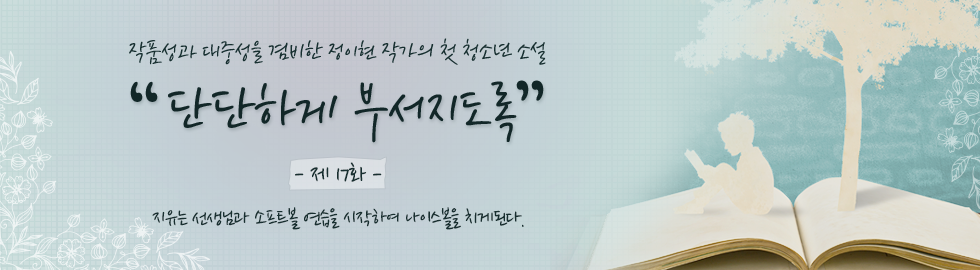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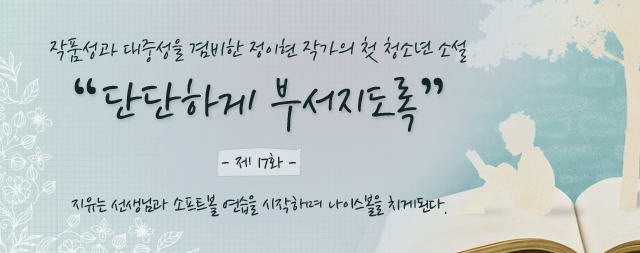

철 지난 크리스마스 장식만큼 우스꽝스러운 것도 없을 것이다. 유니폼을 갖춰 입었지만 달라진 것이 거의 없어서 나는 조금씩 조바심이 났다.
훈련이라고 모여도 운동장을 죽어라 뛰고 캐치볼을 하다가 마치고는 했다. 캐치볼이라는 것도 내 눈에는 그저 공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수준이었다.
선생님은 두 명씩 짝을 짓도록 했는데 나는 제외시켰다.
“인원이 홀수니까.”
겉으론 그런 이유를 댔지만 선생님은 속마음을 표정에서 숨기지 못하는 편이었다.
내 소프트볼 공은 이런 느낌이니 한번 경험 삼아 만져보라는 것이라면, 뭐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히말라야를 등반할 각오로 등산화 끈을 조이고 나섰는데 동네 뒷산 초입만 두리번거리고 있다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토요일 연습을 마치고 솔미와 지윤과 떡볶이를 먹으러 가려는데, 선생님이 다가왔다.
“잠깐 남을 수 있어?”
“네.”
지윤이 대답하자 선생님이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니, 지유만.”
“교문 앞에서 기다릴게.”
솔미가 속삭이는 소리에, 선생님이 나 대신 대답했다.
“언제 끝날지 몰라. 오늘은 먼저들 가.”
모두 가버린 오후의 운동장, 태양은 여전히 밝게 빛났다.
그녀는 내게 말없이 포수 마스크를 건넸다. 포수 마스크를 쓰는 건 생전 처음이었다.
야구부에서 친했던 강이의 마스크를 몇 번 만져보기만 했을 뿐이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다음에 건네받은 것은 포수 미트였다. 야구의 미트처럼 소프트볼 미트도 일반 글러브보다 두툼했다.
선생님이 뒤돌아 뚜벅뚜벅 걸어갔다.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 있었다.
예상했던 만큼의 거리에서 선생님은 천천히 뒤돌아섰다. 마운드가 아닌 마운드, 홈플레이트가 아닌 홈플레이트에서 우리는 마주 보게 되었다.
선생님의 동작은 가벼웠다. 팔을 아래로 내리면서 거의 동시에 휙 앞으로 뺐다.
후욱. 공이 내 미트 한가운데 꽂혔다. 놀랍도록 빠르고 정직했다.
얼결에 받아내긴 했지만 자칫하면 놓칠 뻔했다.
반 박자 천천히 공을 되던지면서 나는 숨을 골랐다. 그동안 내가 받아본 공 가운데 가장 센 공이었다. 차원이 다른 공이었다.
두 번째도 역시 언더핸드스로(underhand throw)였다.
일직선으로 날아오는 것만 같던 공이 갑자기 눈앞에서 삐뚜름하게 휘어지더니 미트 속으로 떨어졌다.
공의 회전은 거의 없었다. 그제야 내가 예상한 것이 아까보다 더 빠른 돌직구였음을 알았다.
내가 타석에 선 타자였다면 얼이 나갔을 것이다.
선생님이 세 번째 투구를 준비할 때 공을 쥔 그 손날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공을 쥐는 모양, 손가락의 각도와 힘에 따라 구질은 달라진다. 선생님은 손가락을 아까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 공을 잡았다.
그리고 아까보다 더 몸을 낮춰 거의 바닥에 닿을 듯한 언더 자세로 공을 던졌다.
마치 학이 날개를 펼치는 모습 같았다.
“잘했다.”
공을 던진 건 선생님인데,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나도 모르게 대답해버렸다.
“선생님이 잘하셨죠.”
“이 녀석 봐라. 나는 선생님이잖아.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갑자기 콧등을 찡그리며 웃었다.
“팔 빠진 것 같아. 인간적으로 너무 누웠어.”
우리는 함께 웃었다. 선생님이 피처 글러브를 벗었다.
“자, 이제 네 차례야.”
우리는 자리를 바꾸었다. 선생님 앞에서 제대로 던지는, 첫 공이었다. 선생님이 미트를 주먹으로 팡팡 쳤다.
안심하고 던지라는 뜻이었다. 다시 던지는 순간이 온다고 생각해보지 않았다.
선 채로 나는 머뭇거렸다. 팔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공은 오른손 안에 꽉 가둬져 있었다.
손안에서 공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만 같았다. 이러다 빵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가루가 되어 부서져 내릴 것 같았다.
마운드에서 마지막으로 던졌던 공과, 지금 이 공 사이에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했다.
여자는 더 이상 야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던 그 놀이터, 고막을 뚫을 것만 같던 매미 울음소리, 아이스바의 분홍색 비닐 포장지, 무심히도 흔들리던 그네.
머뭇대고 있는 나를 향해 선생님이 크게 외쳤다.
“알지? 무조건 언더!”
들숨 한 번, 날숨 한 번. 그리고 나는 공을 던졌다. 지나버린 시간과 이 시간을 접착제로 붙여 이을 수 없다.
그냥 또다시 던질 뿐이다.
다시 살아갈 뿐이다. 공이 포수의 미트에 너무도 정직하게 내리꽂히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나이스 볼!”
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정이현 작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02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소설집 『낭만적 사랑과 사회』 『오늘의 거짓말』 『상냥한 폭력의 시대』, 장편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 『너는 모른다』『사랑의 기초ㅡ연인들』 『안녕, 내 모든 것』, 짧은 소설 『말하자면 좋은 사람』, 산문집 『풍선』 『작별』 등을 펴냈다. 이효석 문학상, 현대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받았다.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 작성일
- 2017-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