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연재소설
[단단하게 부서지도록] 14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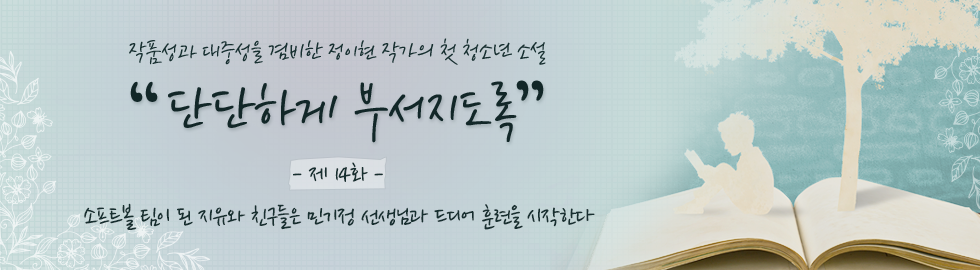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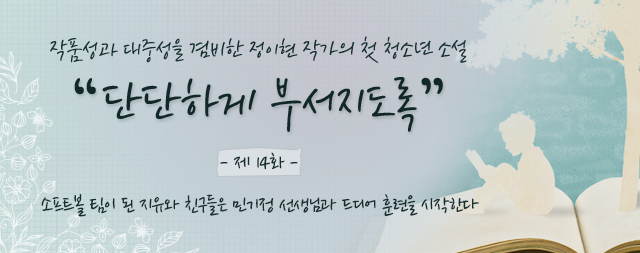

토요일 오전 10시 반. 우리의 약속 시간이었다.
나는 정확히 6시 20분에 눈을 떴다. 등교하는 평일보다 이른 시간이었다.
실은 지난밤 깊은 잠을 자지 못했다. 가까스로 잠들었다가 깨어나기를 세 번쯤 반복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건 아니었다.설레기는커녕 마음이 자꾸만 착 가라앉았다.
이런 감정을 뭐라고 부를까. 좀 우울한 것 같기도 하고, 멍한 것 같기도 했다.
후회 비슷한 감정도 시시각각 밀려들었다. 괜히 한다고 했다. 이제라도, 아니라고 말할까? 진짜 죄송하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약속한 시간에 운동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되겠지만 그건 너무 비겁하지 않을까? 오만 가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머릿속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몸은 저절로 움직여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어느새 교문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토요일 오전, 학교 운동장은 고요했다.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다.
내가 제일 먼저 왔다. 당연하다. 약속 시간이 되려면 아직 한 시간이나 남았으니까.
내가 어딘가에 무려 한 시간이나 빨리 나타나다니. 기록적인 날이었다.
등나무 옆 벤치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나는 또다시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냥 지금 돌아갈까? 그러면 내가 왔다 갔다는 걸 아무도 모를 텐데. 아니라고 말하고, 진짜 죄송하다고 말하고 발을 빼려면 지금이 적기인지도 모른다. 아니, 유일하게 남은 기회.
그때 누가 등을 탁 쳤다. 손바닥 힘이 예사롭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기 전에 누군지 알 것 같았다. 묵직하고 힘 있는 손. 운동을 하는, 운동을 해온 사람의 손.
“날 좋다. 뛰기 좋은 날씨야.”
선생님의 첫마디였다. 그녀는 어쩐지 달라 보였다. 화장기라곤 전혀 없는 얼굴에, 남색 야구 점퍼를 입고, 같은 색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다.
“네. 딱 좋네요. 춥지도 덥지도 않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하고 있었다.
우리는 마치 명절 때만 만나는 사촌 자매들처럼 조금의 거리를 두고 나란히 앉아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자기소개가 너무 늦었네. 난 민기정이라고 해.”
선생님이 오른손을 내밀었다. 악수를 하자는 뜻인가 보았다.
내가 어정쩡하게 내민 손을 그녀가 꾹 잡고 흔들었다.
과연 악력이 장난 아니었다. 민기정이라는 이름이 묘하게 귀에 익었다.
어디서 들어봤지? 아닌가? 검색을 하고 싶어 마음이 들썩였지만 당사자를 코앞에 두고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사실, 너만 믿고 시작하는 거야.”
그녀가 말했다.
“네가 안 된다고 했으면 접었을 거란 뜻이지. 미련 없이 접는 거라면, 내가 좀 잘하거든.”
어이가 없었다. 내가 목 놓아 외치고 싶은 말을 이 선생님 목소리로 듣게 되다니.
“하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해보자.”
“네!”
또, 또, 나도 모르게, 심지어 박력 있게, 대답하고 말았다.
곧이어 지윤이 왔고, 뒤이어 솔미가 왔다. 솔미는 정말로 언니의 필라테스복을 빌려 입었는지 몸에 붙는 까만 레깅스에 스니커즈를 신었고, 지윤은 땀복처럼 보이는 까만색 옷으로 몸 전체를 무장하고 나타났다.
“뭣들 해. 일렬횡대로 집합.”
우리 셋의 이마에 물음표 하나씩이 그려졌다. 못 참고 솔미가 물었다.
“세 명밖에 안 왔는데요?”
“다 왔는데. 왜?”
우리가 멀뚱한 표정을 짓자 선생님은 다시 말을 이었다.
“아 내가 얘기 안 했나? 아차차, 얘기할 시간이 없었구나. 아직은 너희가 전부야. 그러니까 너희는 특별히 창단 멤버라고 할 수 있지.”
침묵을 깬 것은 지윤이었다.
“아아, 멋지네요”
민기정 선생님의 안색이 확 밝아졌다.
“자 그럼 훈련을 시작해보자.”
다들 눈만 껌뻑였다. 선생님은 맨몸이었다. 공도 없고 배트도 없고 글러브도 없었다.
가볍게 몸 먼저 풀자. 운동장 두 바퀴만. 출발.”
친구들은 두바퀴‘만’이라는 표현에 당혹스러워하는 눈빛이었다.
나는 앞장서 뛰기 시작했다. 바람을 가르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일은 겨우 이렇게 시작된다. 시작, 시작이라는 것‘만’이 중요하다.
내가 뱉어내는 숨에서 비릿한 금속 맛이 났다.
소프트볼 팀의 최소 구성원은 아홉 명이다. 야구와 같다. 투수와 포수,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좌익수, 우익수, 중견수. 말 그대로 경기를 하기 위한 최소 인원이다.
인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경기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물론 경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됐을 때의 얘기다. 세 명으로 출발한 우리 팀이 아홉 명쯤 되었을 땐 그만한 실력이 될 수 있을……까?
매주 토요일이 훈련 시간으로 정해졌고, 동아리 부원 모집 공고를 정식으로 냈다.
네 번째 선수는 모집 공고를 보자마자 달려왔다는 옆 반 아이였다.
나는 이름도 잘 모르겠는 어느 프로야구 선수의 사생팬이라고 했다. 지난 5년 동안의 프로야구 팀 순위를 줄줄 읊어댔다. 음, 우리가 하려는 게 프로야구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기억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지금은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인 것이다.
다음 토요일엔 날이 한결 따뜻해졌다.
조금만 더 지나면, 기상 캐스터가 말하는 ‘완연한 봄 날씨’가 되리라는 기대를 품게 하는 날씨였다.
운동장으로 가니 선생님이 먼저 와 있었다. 멀리서 보니 선생님 옆에는 커다란 플라스틱 박스가 있었다.
불투명해서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다. 드디어 장비들이 도착했나 보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졌다. 그러다 문득 멈추었다. 선생님이 뒤돌아서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투수들이 팔과 어깨를 푸는 데 애용하는 준비운동이었다. 똑바로 서서 양팔을 옆으로 쭉 뻗고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한 채 돌리는 거다.
어깨는 그대로 둔 채 팔만 동그랗게, 동그랗게, 더 동그랗게, 크게, 크게, 더 크게 원을 그려간다. 모르는 이가 보면 공중 부양을 하겠다고 용쓰는 모습 같기도 했다.
그러나 하는 사람은 더없이 진지하다. 그 진지한 뒷모습을 나는 한동안 바라보았다.
첫 훈련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민기정이라는 이름을 검색해보았었다. 7~8년 전의 뉴스 기사가 나왔다.
민기정, 한국 여자 소프트볼 역사를 다시 쓰다.
민기정 선수, 일본 진출.
그게 마지막이었다.
‘민기정’과 ‘일본’을 함께 검색창에 넣었지만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최근 7년간은 아무것도 검색되지 않았다.
뉴스 기사에 오르내릴 만큼 잘나가던 사람이 그렇게 몇 년 동안 감쪽같이 사라지는 것이 가능할까. 그러다 갑자기 이 변두리 학교의 비정규직 교사로 스르르 나타나는 것이?

정이현 작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02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소설집 『낭만적 사랑과 사회』 『오늘의 거짓말』 『상냥한 폭력의 시대』, 장편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 『너는 모른다』『사랑의 기초ㅡ연인들』 『안녕, 내 모든 것』, 짧은 소설 『말하자면 좋은 사람』, 산문집 『풍선』 『작별』 등을 펴냈다. 이효석 문학상, 현대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받았다.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 작성일
- 2017-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