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는 동화
피어나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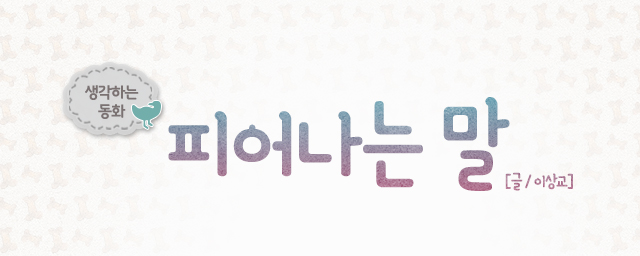
학년이 바뀌면서 반이 같아진 아이들 가운데는 별별 아이들이 다 많았습니다. 최진묵은 그런 아이 중 하나입니다. 진묵이는 말투가 유난히 거칠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진묵이는 반장인 지섭이와 싸움을 벌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싸운 거래?”
뒤늦게 화장실에 다녀온 정근이가 내게 물었습니다.
“농구 시합에 나갈 애들을 뽑는데, 반장이 자기 맘대로 뽑았어.”
다른 일에서도 반장은 자기 혼자 결정할 때가 많긴 했습니다.
“너, 못 뛰잖아. 상관도 없으면서 왜 나서는 거냐고?”
반장이 진묵이에게 쏘아부쳤습니다.
“이런 싸가지! 내가 언제 나 뽑아 달랬어? 어째서 너 혼자 다 정하냐는 말야!”
진묵이의 입에서 침이 튀었습니다.
“내가 모른 체 해주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벙어리인 꼴에 욕만 배워서……”
반장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진묵이는 반장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 반장은 단번에 뒤로 밀려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한동안 꼼짝 않던 진묵이가 제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자기 책상 앞에 앉은 진묵이의 뻗쳐 올라간 머리카락이 마치 목의 깃털을 바짝 추켜세운 수탉의 깃털처럼 보였습니다.
한동안 꼼짝 않던 진묵이가 제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자기 책상 앞에 앉은 진묵이의 뻗쳐 올라간 머리카락이 마치 목의 깃털을 바짝 추켜세운 수탉의 깃털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아바가 말을 못하는데, 진묵이는 어떻게 말을 하는 거지? 특히 욕 같은 거.ㅋㅋ~>
귓속말 대신 정근이는 제 공책 귀퉁이에 연필로 조그맣게 썼습니다.
<글쎄…… 이모나 고모한테 배웠는지도 모르지.>
어쩌면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배웠을지 모릅니다.
정근이와 나는 잠깐 동안이었지만,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것처럼 종이에 글씨를 써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정근이와 나는 잠깐 동안이었지만,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것처럼 종이에 글씨를 써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진묵이도 저희 엄마, 아빠랑 말을 해야 할 때면 일일이 종이에 써서 할까?’
그러다 언젠가 전철에서 보았던, 말 대신 손짓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던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렇다면 진묵이도 제 엄마 아빠와 이야기를 할 때는 손짓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진묵이는 화가 안 풀린 듯 반장 뒤퉁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수탉 하니까 다음 토요일, 아빠와 시골장으로 닭구경을 가기로 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아빠는 재래종 암탉, 수탉의 사진 찍는 일을 취미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멋진 수탉의 사진 찍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진묵이는 화가 안 풀린 듯 반장 뒤퉁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수탉 하니까 다음 토요일, 아빠와 시골장으로 닭구경을 가기로 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아빠는 재래종 암탉, 수탉의 사진 찍는 일을 취미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멋진 수탉의 사진 찍기를 좋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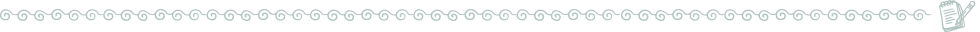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를 닦고 세수를 해야 할 일이 귀찮았지만 약속이기 때문에 아빠를 따라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까운 시골 5일장까지는 길이 막혀 멀지 않은 거리인데도 한 시간 남짓이 걸렸습니다. 장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걸어 나가기가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이를 닦고 세수를 해야 할 일이 귀찮았지만 약속이기 때문에 아빠를 따라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까운 시골 5일장까지는 길이 막혀 멀지 않은 거리인데도 한 시간 남짓이 걸렸습니다. 장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걸어 나가기가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서로 잃어버리겠다. 아빠 뒤에 꼭 붙어 와라.”
아빠는 큰 걸음으로 휘적휘적 장 복판을 가로질렀습니다. 사람들로 복작거리는 복판을 가로지른 아빠는 덜 복잡한 갓길로 들어섰습니다.
“닭, 토끼, 오리, 염소 같은 건 아마 저쪽에 있을 거다.”
아빠는 큰 걸음으로 휘적휘적 장 복판을 가로질렀습니다. 사람들로 복작거리는 복판을 가로지른 아빠는 덜 복잡한 갓길로 들어섰습니다.
“닭, 토끼, 오리, 염소 같은 건 아마 저쪽에 있을 거다.”
아빠 뒤를 따라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새까만 염소였습니다. 염소는 끈에 묶여 매애매애- 가느다랗고도 떨리는 소리로 울었습니다. 단단해 보이는 꾸부러진 뿔과 노란 눈자위는 어쩐지 슬퍼 보였습니다.
염소 다음은 오리였습니다. 오리는 녹슨 철망으로 지붕을 덮은 우리에서 꽥꽥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리 다음엔 토끼, 토끼 다음에는 닭장이었습니다.
“저 날선 톱날 같은 붉은 볏을 한 수탉을 좀 보렴!”
아빠는 닭들 가운데서 유난히 몸집이 큰 수탉 한 마리를 가리켰습니다. 그 수탉은 다른 수탉들에 비해 몸이 훨씬 컸습니다. 부리부리한 눈을 뚜릿뚜릿 떠, 둘레를 둘러보았습니다. 드러난 발목도 억세고 힘이 세 보였습니다. 발자국을 뗄 때마다 머리 꼭대기와 턱 밑의 볏이 털럭털럭 흔들렸습니다. 진묵이가 또 떠올랐습니다.
“볏에 불이 붙은 것 같이 선명하게도 붉구나.”
내가 아기고양이 우리의 고양이들을 보는 동안, 아빠는 수탉 사진을 오십 장이 더 넘게 찍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찍고 가요, 네?”
가만히 있으면 늦도록까지 수탉 사진만을 찍을 것 같아, 아빠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무엇 좀 먹지 않을래?”
아빠와 나는 가까이에 있는 길가 포장집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포장집에서는 장 풍경이 고스란히 내다 보였습니다.
“……오른쪽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장도리로 꽝꽝꽝 두세 번만 때려 주시면 못이 튀어나가지 않고 시멘트 벽에 제대로 박힙지요.”
한 아저씨가 시멘트 벽에 못 박을 때 쓰면 편리하다는 펜치 비슷한 연장 선전에 열을 올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이크를 입에서 떼지 않은 채 난데없는 말을 했습니다.
“아이구, 어르신, 또 술 한 잔 하셨습니다.”
나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 고개를 쑥 내밀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땅바닥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있는 할아버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흙바닥에서 한 차례 뒹굴었는지 어깨와 등이 흙투성이였습니다. 볕살에 그을려 검붉은 얼굴에 광대뼈가 튀어나온 할아버지의 모습은 퍽 초라해보였습니다.
땅바닥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있는 할아버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흙바닥에서 한 차례 뒹굴었는지 어깨와 등이 흙투성이였습니다. 볕살에 그을려 검붉은 얼굴에 광대뼈가 튀어나온 할아버지의 모습은 퍽 초라해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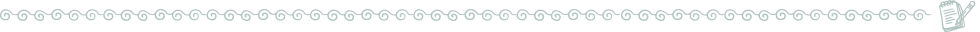
“할아버지이, 일어나!”
듣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최진묵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인가 본데.’
나도 모르게 아빠 등 뒤로 몸을 감췄습니다. 어쩐지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는 애냐?”
아빠가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숨긴 왜 숨는 거니? 찔리는 거 있는 거야?”
아빠는 장난스레 물었습니다. 나는 쉿! 소리로 아빠 말을 막았습니다.
“할아버지이, 일어나라니까!”
진묵이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희 할아버지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일으켜 세우려 애썼습니다. 할아버지는 엉거주춤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곤 했습니다. 보다 못한 아빠가 일어서 나가려 했습니다.
“잠깐 아빠, 우리 반 앤데 날 보면 창피해 할지 몰라요.”
다급하게 아빠를 말렸습니다. 섣불리 끼어들었다가 무슨 말을 들을지 모릅니다.
‘……할아버지한테 막 반말을 하네.’
그 동안에도 할아버지는 누구한테랄 것 없이 큰 소리로 고래고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진묵이는 욕쟁이 할아버지한테서 말을 배운 걸까?’

생각하는데 한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앞치마를 두른 것으로 보아 음식 만드는 일을 하다가 달려온 듯 했습니다.
“저 애네 아빠 엄마 같구나.”
아빠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진묵이는 두 사람을 보자, 양쪽 손의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 해 보였습니다.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려 보였다가, 꼭 쥐 주먹으로 제 가슴을 쳐 보였습니다. 그러자 진묵이 엄마도 손바닥을 펴 이맛전에 댔다가 손바닥을 활짝 펴 보이는 등 수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나쁜 주정뱅이 할아버지이!”
진묵이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제 할아버지에게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혼나고도 남을 진묵이의 말에 진묵이의 엄마 아빠는 벙싯 웃음을 보였습니다. 진묵이 엄마 아빠는 벙긋대는 진묵이 입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환한 얼굴을 했습니다.
“네 친구 엄마 아빠는 저 애가 하는 어떤 말이든 다 대견한 게다.”
아빠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욕 같은 거…… 다 나쁜 말이잖아요.”
대답을 하면서 나는 진묵이와 그 애네 엄마 아빠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뺀 세 식구는 둘러서서 양손을 크게 펴 보이는가 하면 이마에 한 손을 가져다 대는 등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말이 손에서 몽글몽글 피어나는 것 같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빠 말대로 진묵이 엄마 아빠는 진묵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라면 모두 꽃이 피어나듯 어여쁠 것 같았습니다.
“저 애의 말이 거친 건 아직 꽃봉오리여서란다. 좀 지나면 곱게 피어날 것 같구나.”
아빠가 내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주고받는 이야기는 꽃의 웃음 같기도 하고 순한 바람결 같기도 했습니다.
- 글
- 이상교(1949년생)_아동문학가, 동화집 『댕기 땡기』 『처음 받은 상장』, 동시집 『먼지야, 자니?』 『예쁘다고 말해 줘』, 그림책 『도깨비와 범벅장수』 『야, 비 온다』 『운명을 바꾼 가믄장 아기』 등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이어보는 콘텐츠
- 작성일
- 2017-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