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연재소설
[단단하게 부서지도록] 12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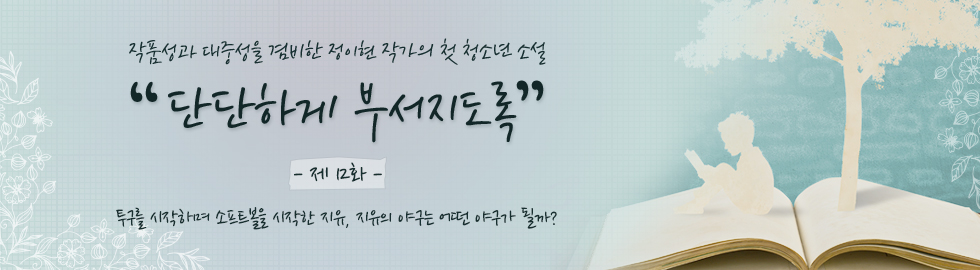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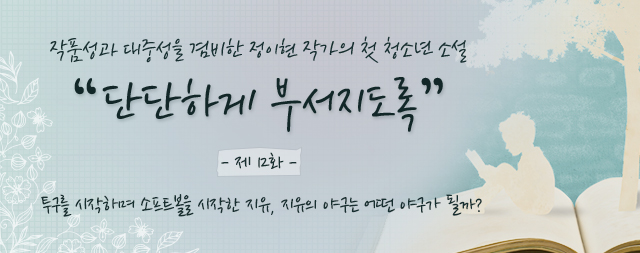

투구를 할 때 손은 중지부터 시작이다. 중지를 실밥 위에 잘 얹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은 엄지다. 엄지로 중지의 반대쪽을 잡는다. 나머지 세 개의 손가락들은 가볍게 받쳐주는 느낌으로 올리면 된다. 공과 글러브를 어깨높이로 들면서, 손목에 스냅을 넣어 뿌리듯이 던진다. 내가 던진 공은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바라봐야 한다. 포수의 글러브에 빨려들어 갈 때까지. 그리고 발은……
“그래. 인심 썼다.”
선생님이 말했다.
“하루 더 시간을 줄게. 생각해봐. 내일 그 시간에 아까 거기서 보자.”
그녀는 역시 자기 할 말만 다다다 하고서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지유야.”
지윤과 솔미가 교실에 들어서는 나를 둘러쌌다.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영화 같아. 완전.”
솔미가 호들갑을 떨었다.
“뭐가.”
나는 약간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좀 쑥스럽기도 하고, 또 이런 복잡한 마음을 누군가와 공유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지윤이 내 교복 재킷 소매를 슬그머니 잡아당겼다.
“그거, 선수였던 애들만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그냥 방과후 같은 거야.”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입단하려면 테스트 같은 걸 봐야 할까?”
“딱히 없을걸. 그냥 동아리 같은 건데.”
사실 나도 잘 몰랐다. 지윤이 손바닥으로 내 손등을 꼭 잡았다.
“그러면 나도 같이할까?”
“야구, 아니 소프트볼을?”
“응. 나 정말 소원이었어. 어렸을 때부터.”
“소프트볼이?”
“야구지만. 그게 그거잖아. 소프트볼이 여자 야구니까.”
“아니야. 야구랑 소프트볼은 전혀 달라.”
나는 다시 고개를 수그렸다. 더 듣고 싶지 않았다.
“네가 해야 돼.”
‘해볼래’도 아니고 ‘같이하자’도 아니고 ‘해라’도 아니었다.
“제가요? 왜……”
“그럼 이 학교에서 마운드에 서본 애가 너 말고 또 있을 것 같아?”
이 선생님은 대체 어디서 내 이야기를 들었단 말인가.
“야구하고는 다르다면서요.”
“그거는,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아 다르긴 다른데, 비슷한 건 또 비슷하지. 일단 투수, 포수, 타자는 있잖니.”
좀 전에 그 선생님이 했던 말을 내 입으로 고스란히 따라 하고 있었다.
“그래도 괜찮아. 나 꼭 데려가 줘. 부탁이야.”
옆에서 손톱 거스러미를 뜯고 있던 솔미가 끼어들었다.
“나도.”
점입가경인가 하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졌나 보다.
정류장에서 넋 놓고 있다가 버스를 놓쳤다. 그 바람에 시간이 없어 삼각김밥 하나 못 먹고 바로 학원 수업에 들어가야 했다. 위장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했지만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뒷머리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 선생님은 우격다짐으로 나를 몰아갈 작정인 듯했지만 내가 끝까지 거부하면 결국엔 포기할 터였다. 소코뚜레 끼우듯 질질 끌고 가서 내 몸에 강제로 유니게 걸으면 집까지 5분 정도가 걸린다. 그러나 그냥 들어가기는 싫었다. 아파트 단지 앞 편의점에 들렀다. 사발면 하 나를 뜯어 뜨거운 물을 부었다. 아직 10시 반이 안 됐지만 규리에게 카톡을 보냈다.
-오늘 하루 잘 지냈어?
늘, 규리가 먼저 물어주던 인사였다.
-응응. 너는?
-난 별로.
나는 규리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규리의 첫 번째 답은 이거였다.
-야구할 때 네가 좀 멋있기는 했어.
-정말?
-응응. 근데 생각해보니까 꼭 야구여서 그랬다기보다는.
규리의 톡은 거기서 끊겼다. 나는 나무젓가락을 쪼개며 규리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
사발면을 한 젓가락 막 떠 입에 가져가려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난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어서, 그런 네 모습이 무지 대단해 보였어.
빈 젓가락을 어금니로 씹었다.
-네가 부러워서 더 좋았던 것 같아.
입 속에서 비릿한 나무 맛이 났다.
-너 아직도 야구 좋아해?
기습의 물음표였다. 나는 천천히 입력했다.
-모르겠어, 나도.
-그럼 한번 물어봐. 너한테.
밤의 아파트 단지를 터덜터덜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지아가 마루 소파에 엎드려 티브이를 보고 있다가 탁 끄고 일어섰다.
“결정했어?”
“뭘?”
지아는 처음 듣는 얘기라는 표정으로 내 시선을 외면했다.
“그거, 한다고 했느냐고.”
“하지 말라며?”
지아는 입술을 뾰족하게 내밀었다.
“야. 넌 그거 정말 좋아해?”
내 물음에 지아는 대답 대신 픽 웃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정이현 작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02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소설집 『낭만적 사랑과 사회』 『오늘의 거짓말』 『상냥한 폭력의 시대』, 장편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 『너는 모른다』『사랑의 기초ㅡ연인들』 『안녕, 내 모든 것』, 짧은 소설 『말하자면 좋은 사람』, 산문집 『풍선』 『작별』 등을 펴냈다. 이효석 문학상, 현대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받았다.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 작성일
- 2017-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