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연재소설
[단단하게 부서지도록] 11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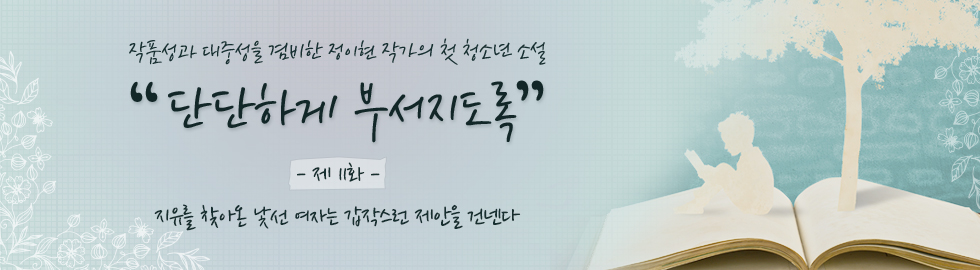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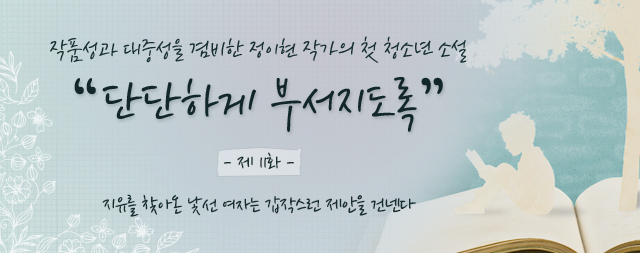

“맞구나. 강, 지, 유.”
쇼트커트의 헤어스타일에 스모키 메이크업을 한 여자가 내 이름표를 또박또박 읽었다.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지금 바쁘니?”
내가 선뜻 대답하지 못한 건 그녀의 질문이 너무도 낯설어서였다. 그건 TV 미니시리즈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친구와 싸우고 나서 찾아가 툭 던지는 말 같지 않은가. 학생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선생님은 처음 보았다. 내 멀뚱한 눈빛 때문일까, 그녀가 또 말했다.
“음, 놀랐지? 미안. 내가 원래 좀 그래. 네가 이해해라. 하하.”
여자가 어색하게 웃었다. 음, 학생 앞에서 뒤통수를 벅벅 긁다니 확실히 평범한 선생님은 아니었다. 우리는 운동장 스탠드에 나란히 걸터앉았다.
“야, 너 찾느라고 고생했다. 너희 반에 가서 애들한테 너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서 겨우 찾아갔는데 아무래도 너 같지가 않은 거야. 얘기하다 보니 정말 다른 애더라고. 어쩐지 딱 봤을 때 좀 이상하더라니.”
아마도 지윤이를 찾아갔나 보다. 이 선생님, 볼수록 허당이었다.
“근데 걔는 내 얘기 조금만 듣고서도 너무 좋다면서, 자기도 같이하게 해달라고 하더라. 하하.”
“……”
“아 미안미안. 본론 시작하기도 전에 사설이 너무 길지?”
“네.”
나도 모르게 대답해버렸다.
“그래. 미안. 내 본론은 뭐냐 하면, 너 소프트볼이라고 들어봤어?”
들어본 적 있다. 야구랑 비슷한 것. 그런데 왠지 입을 뗄 수가 없었다.
“응? 처음 들어봐?”
“……아니요.”
“그래. 네가 생각하기에 소프트볼은 어떤 종목 같아?”
“……야구랑 비슷한 거요.”
“오 노노노노.”
그녀가 우렁찬 목소리로 부정했다.
“아냐, 아냐. 잘못된 정보야. 야구하고 소프트볼은 달라.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지만 알고 보면 완전히 다르지.”
어디선가 한 줄기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이마를 쳐들고 물었다.
“그럼 왜 저를 찾아오신 건데요?”
“야 굉장히 좋은 질문이다. 너 허 좀 찌를 줄 아는데?”
그녀가 중얼거렸다.
“이 학교, 아니 우리 학교에 소프트볼 팀이 생기거든.”
나는 다시 고개를 수그렸다. 더 듣고 싶지 않았다.
“네가 해야 돼.”
‘해볼래’도 아니고 ‘같이하자’도 아니고 ‘해라’도 아니었다.
“제가요? 왜……”
“그럼 이 학교에서 마운드에 서본 애가 너 말고 또 있을 것 같아?”
이 선생님은 대체 어디서 내 이야기를 들었단 말인가.
“야구하고는 다르다면서요.”
“그거는,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아 다르긴 다른데, 비슷한 건 또 비슷하지. 일단 투수, 포수, 타자는 있잖니.”
이분 어쩐지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야 옛날에 내가 너 던지는 거 봤거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언제 어디서 뭘 봤다는 건가.
“인상이 되게 강렬하게 남아 있어. 제구도 좋고 속도도 좋더라. 초딩이 언더핸드로 그만큼 빠르기가 어려운 건데.”
낭패다. 갑자기 눈가가 뜨뜻해져 왔다.
“언더라 그래요. 오버는 그렇게 못 던져요.”
일부러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래. 그러니까 네가 아주 딱이라는 거야. 소프트볼 투수는 언더로만 던질 수 있거든.”
나는 엉덩이를 뗐다.
“저 이제 점심시간 다 끝나가서요. 교실 들어가야 돼요.”
그녀도 같이 일어섰다.
“응. 걸어가면서 얘기하자.”
“뛸 건데요. 늦어서.”
“같이 뛰지 뭐.”
차마 뛸 수는 없고, 나는 빠르게 걷기 시작했다. 그녀가 내 옆에서 보폭을 맞춰 함께 걸었다. 키는 나와 거의 똑같았고, 어깨가 딱 벌어지고 단단한 체격이었다.
“할 거지?”
“아니요.”
“왜?”
“공부해야 돼요.”
“공부에는 지장 없도록 할 거야. 정규 수업 다 끝나고 하는 거야.”
“공 잡은 지도 너무 오래되었고.”
“괜찮아. 하나도 안 오래됐어. 첨부터 다시 차근차근 해나가면 돼.”
“전 안 할래요.”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왜 해야 되는데요?”
이런 반복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 운동장에서 교실까지가 영원히 도달하지 않을 아득한 거리로 느껴졌다.
“너 내 얘기 끝까지 다 안 들었잖아. 잘 한번 들어봐 봐. 학교에서도 다 밀어주기로 했단 말이야.”
‘위쪽’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위’에서 고등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관내의 고등학교에 다들 하나씩 새로운 스포츠클럽 팀을 만들기로 했다는 것. 누구의 뜻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학교에는 소프트볼 팀이 만들어지기로 했다는 것. 그래서 자신이 특별히 초빙되어 왔다는 것. 그것들을 그녀는 속보로 운동장을 가로지르면서 다다다다 이야기했다. 숨차지도 않은가 보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교실 안까지 따라 들어올 기세였다. 나는 복도 끝 화장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럼 아직 팀 자체가 없다는 거네요?”
“만들고 있잖아, 지금.”
“……”
“너한테도 도움 될 거야. 잘하면 이걸로 대학 가는 방법도 있다니까.”
정색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선생님, 저는요.”
이상하게 목이 메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다.
“야구 다시 안 할 건데요.”
“야, 지금까지 말했잖아. 야구가 아니라니까.”
자기 맘대로 야구가 아니랬다가 비슷하댔다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다. 야구든 야구가 아니든 나는 ‘공’을 사용하는 어떤 운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마운드에 서지 않을 것이다.
“자, 이거.”
그녀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공이었다. 형광연두색의 둥그런 그 공은 야구공보다 컸다. 아주 많이 큰 것은 아닌데 아주 많이 큰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내게 그것을 건네주었다. 엉겁결에 한 손으로 받아들었다. 아주 말랑말랑한 것은 아닌데 아주 말랑말랑한 것처럼 느껴졌다. 공은, 차갑지 않았다. 우리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정이현 작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02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소설집 『낭만적 사랑과 사회』 『오늘의 거짓말』 『상냥한 폭력의 시대』, 장편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 『너는 모른다』『사랑의 기초ㅡ연인들』 『안녕, 내 모든 것』, 짧은 소설 『말하자면 좋은 사람』, 산문집 『풍선』 『작별』 등을 펴냈다. 이효석 문학상, 현대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받았다.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 작성일
- 2017-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