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연재소설
[단단하게 부서지도록] 10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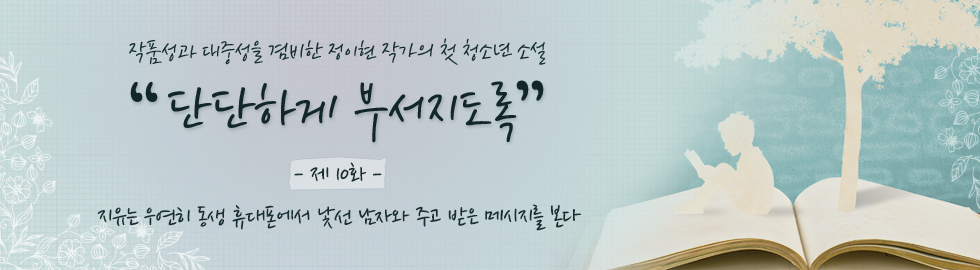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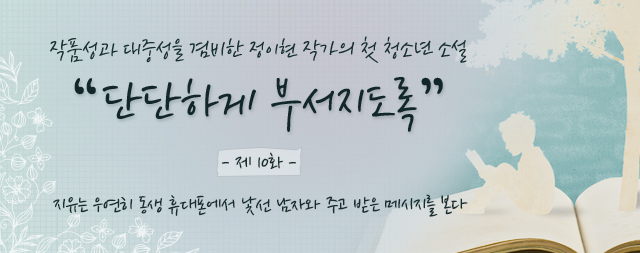

그날은 꿈부터 조짐이 이상했다. 꿈에 야구 그라운드를 보았다. 사방이 깜깜했고, 마운드와 홈플레이트만 환했다. 투수는 뒷모습만 보여서 얼굴은 알 수 없었다. 타석에 선 사람은 강세연인 것 같았다. 더 자세히 보려고 꿈속에서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뒷모습의 투수가 와인드업을 위해 양팔을 천천히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왼쪽 다리를 힘차게 차올렸다 뒤로 뺐다. 공이 강세연을 향해 날아갔다. 강속구였다. 강세연이 크게 배트를 휘둘렀다. 헛스윙. 공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강세연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잠에서 깨자마자 전화기를 더듬더듬 집어 강세연의 이름을 검색해보았다. 지난달의 기사 이후 새로운 소식은 업데이트되고 있지 않았다. 고교 야구에 대한 뉴스도 전혀 없었다. 아직 고교 야구 시즌이 아니니 당연한 일일 것이다. 제일 빠른 황금사자기가 5월 초에 시작이고, 청룡기, 대통령배, 봉황대기는 여름에 줄줄이 이어져 있었다.
강세연이 나왔지만 강세연 꿈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 어쩐지 뒤통수가 찜찜했다. 화장실에 가려는데 안에서 지아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니야, 나 시간 좀 걸려. 배 아파.”
나는 내 방 대신, 문이 열린 지아의 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 벌러덩 누웠다. 침대에는 내 침구와 똑같은 색깔, 똑같은 무늬의 이불이 펼쳐져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었다. 베개에 코를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아보았다. 지아의 냄새가 났다. 똑같은 샴푸와 비누를 사용하는데도 사람한테는 왜 저마다 다른 냄새가 날까. 지아의 향을 맡자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베개 옆에 지아의 전화기가 놓여 있었다. 급하긴 했나 보네, 전화기도 안 가지고 들어가고.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전화기에 흘낏 눈길을 주었다. 어쩐 일인지 잠겨 있지 않았다. 카톡 창을 훔쳐본 데에 다른 뜻이 있었던 건 아니다. 혹시 지아가 나 몰래 아빠와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는지 그 순간 궁금해졌을 뿐이다.
‘한번 생각해봤어요?’
‘아직 ㅠㅠ’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 잘 생각해서 결정해요.’
‘넹ㅠㅠ’
‘내가 정말 아까워서 그래요.’
잉? 이게 뭐지? 지난밤 늦게 주고받은 메시지였다. 짧게 대답하는 건 지아였고, 상대방은 ‘김실장님’이었다. 실장이라니. 프로필 사진을 확대해보니 턱이 뾰족하고 날카롭게 생긴 30대 아저씨가 있었다. 머릿속에 물음표 100개가 떴다.
“언니야, 뭘 보는데?”
지아가 빽 소리쳤다. 나는 아무 일도 아닌 척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야 너 이거 뭔데?”
“뭐가?”
“이 아저씨 누군데? 아저씨랑 야밤에 왜 톡을 해?”
“미쳤어. 왜 남의 걸 봐?”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한데?”
휴. 지아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듣겠다. 조용히 해.”
아니나 다를까 부엌 쪽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는 아무리 일이 많고 바빠도 우리가 학교에 가는 아침 시간엔 꼭 일어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침밥을 차려주는 사람이었다.
“왜? 엄마가 들으면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어, 빨리 말 안 해!”
지아가 급히 내 입을 막았다. 진짜 엄마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라는 증거였다. 나는 지아 손바닥으로 입이 막힌 채 버버버버 말했다.
“확 깨물 거야. 말 안 하면.”
휴. 다시 한 번 지아가 한숨을 쉬었다.
“지난번에 친구들하고 롯데월드 간다고 했던 날 있잖아.”
“응.”
“그날 사실 롯데월드 안 갔어.”
“그럼?”
“오디션 봤어.”
“뭐어? 걸 그룹?”
“응.”
가수 연습생이 되기 위해 오디션을 보는 아이들은 꽤 있었다. 그렇지만, 지아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자라면서 지아가 가수나 배우가 될 거라고 상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지아는 노래도 춤도 남이 시키면 빼지 않고 잘하는 편이었지만, 그게 다였다. 특출 나 보이지는 않았다. 지아는 다른 걸 훨씬 더 잘했다. 수학이라거나 영어라거나 국어라거나, 뭐 그런 것들을.
“연습생 후보 뽑는다고 해서.”
연습생도 아니고 연습생 후보라고?
“그래서 네가 붙었단 말이야?”
“응.”
“막 수백 명 붙여놓고 돈 가져오라는 뭐 그런 기획사 아니야?”
“그런 데 아냐. 같이 보러 간 친구들 중에서 나 혼자만 붙었다고.”
“미친…… 안 할 거지?”
“아, 몰라.”
“모르면 어떡해. 빨리 안 한다고 말해.”
“근데 언니야, 나, 하고 싶어.”
“안 돼.”
“왜?”
“해서 뭐하게?”
“가수 되지.”
정말 말이 안 나왔다. 연습생도 아니고, 연습생 후보에 붙었으면서, 어느 세월에 가수가 된다는 말인가.
“야. 현실을 좀 파악해. 네가 그냥 좀 예쁘장하게 생기고 노래도 못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단 후보로 뽑아놓은 거지. 가수가 되는 건 또 완전 다른 얘기야. 너 그것도 몰라?”
“나도 알아. 그렇지만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잖아.”
말문이 막혔다. 여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물에서 숭늉 찾는 거 아니다’라고 쏴붙여 봐야 지아는 콧방귀도 뀌지 않을 것 같았다.
“너무 걱정만 하지 마, 언니야. 나도 완전히 결정한 건 아니야.”
내 작은 동생 지아가 무척 어른스럽게 말을 이었다.
“충분히 더 생각해볼 거야. 그러니까 언니야, 엄마한텐 아무 말도 하지 마. 하더라도 내가 좀더 생각해보고 말할 테니까.”
그거 말고는 평범한 하루였다. 점심 급식엔 쇠고기뭇국이라는 이름으로 소가 잠깐 물에 들어가 목욕을 하고 나온 듯한 국물에 얇게 썬 무만 잔뜩 들어 있는 음식이 나왔다. 나는 도통 입맛이 없어 숟가락을 들고 깨작대기만 했다. 지윤은 제 몫의 밥을 일찌감치 뚝딱 다 먹곤 내 식판을 넘겨다보았다.
“안 먹을 거야?”
“응.”
“그럼 내가 먹어도 돼? 뭇국 좋아해서.”
“응응. 먹어, 먹어.”
의외였다. 매일같이 남기는 솔미의 밥에 대해선 한 번도 탐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던 지윤이었기 때문이다. 여전히 솔미는 점심밥을 받아만 놓고 먹지 않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솔미에게 지금껏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은 나처럼 지윤 역시 그래 왔다. 이상한 일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행동은 아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내 식판과 제 식판을 바꾸는 지윤의 모습을 보면서 솔미에 대해 지윤 또한 예민하게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너희들 먼저 가. 난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 좀 들렀다 교실로 갈게.”
급식실을 나와 도서관에 빌린 책을 반납하러 간다는 지윤과 솔미를 그렇게 따돌렸다. 인간은 누구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지금이 그때였다. 나는 화장실이 아니라 운동장으로 향했다. 혼자 좀 빠르게 걷고 싶었다. 머리가 복잡할 땐 몸을 움직이는 게 최고였다. 운동장 반 바퀴를 돌아, 철봉 앞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누가 갑자기 뒤에서 내 등을 팍 쳤다.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다.

정이현 작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02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소설집 『낭만적 사랑과 사회』 『오늘의 거짓말』 『상냥한 폭력의 시대』, 장편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 『너는 모른다』『사랑의 기초ㅡ연인들』 『안녕, 내 모든 것』, 짧은 소설 『말하자면 좋은 사람』, 산문집 『풍선』 『작별』 등을 펴냈다. 이효석 문학상, 현대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받았다.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 작성일
- 2017-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