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연재소설
[단단하게 부서지도록] 9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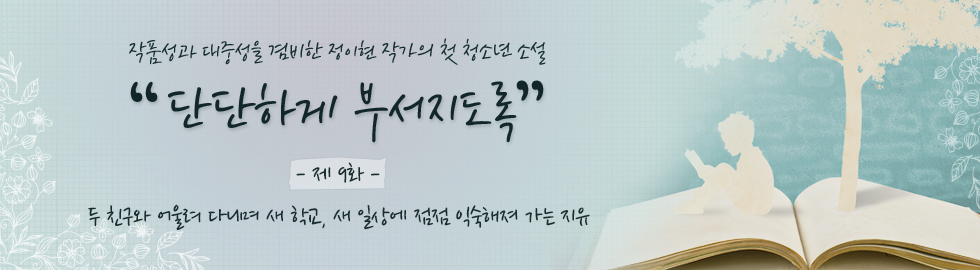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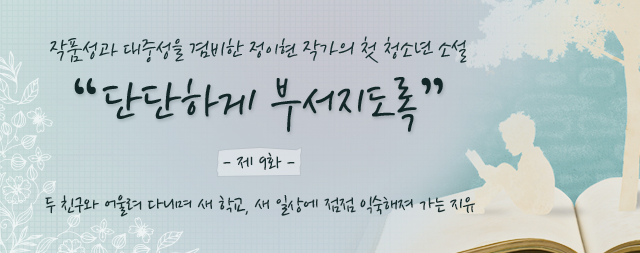

셋이라는 숫자는 안전하다. 투수와 포수와 타자. 1루와 2루와 3루. 내가 지윤, 솔미와 함께 다니게 된 건 인간관계에서 셋이 가장 편안하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훅 가까이 다가오려는 솔미에게, 나 좀 부담스러운데, 라고 솔직히 말하기보다는 지윤까지 끼워 셋이 다니는 편이 더 쉽다는 이유도 컸다. 안전거리 확보의 측면에서 말이다.
셋이 같이 다닌다고 해서 별다른 일을 하는 건 아니었다. 과학실이나 음악실로 함께 이동하거나, 점심시간이면 급식실 같은 테이블에 모여 앉는 것 정도였다. 나는 사실 급식 시간마다 친한 무리들끼리 우르르 몰려와 탁자를 차지하고는 다른 아이들이 앉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을 유치하고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번호 순서대로 앉게끔 하는 담임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담임은 그러지 않았다. 귀찮아서였다. 역시 내 선견지명이 맞았다.
지윤과 솔미와 나. 사실 우리 셋은 누가 봐도 썩 안 어울리는 조합이었다. 그런데도 그 애들과의 생활이 그럭저럭 무리 없이 굴러가는 게 신기했다. ‘즐겁게 말하기’를 담당하는 것은 솔미였고, ‘성실하게 듣기’를 맡은 건 지윤이었다. 솔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아이였다. 지난 주말 방영한 예능 프로그램의 내용, 아이돌들의 비밀 연애 같은 연예계 소문은 기본 중의 기본이었다. 우리 학교 이사장의 가족 관계, 각 과목 담당 선생님들의 결혼 여부 등도 기가 막히게 꿰뚫고 있었다.
늘 신경질에 가득 차 있는 수학 선생님에 대해선 “원래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작년에 결혼을 약속한 사람한테 완전 심하게 차이고 나서 증상이 심해진 거래”라고 말하는 식이었다. 그런 얘기들을 고개까지 끄떡이며 경청하는 건 지윤의 몫이었다. 지윤은 “아, 정말?” “어, 그랬구나” 같은 추임새까지 넣으며 솔미의 이야기에 한껏 집중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나 같은 애와는 질적으로 달랐다.
지윤은 급식으로 나온 멀겋고 맛없는 육개장 국물을 부리나케 입안에 떠 넣으면서도, 「무한도전」 새 멤버가 누구인지 예측할 수 있다는 솔미의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성실하게 들어주었다. 진심으로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입도 바쁘고 손도 바쁘고, 귀까지 바쁜 지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면, 쟤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구나, 타고나길 그렇게 태어났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한번은 지윤이 솔미에게 물었다.
“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진심 어린 감탄의 목소리였다.
“별것도 아닌데 뭘.”
솔미는 뻐기는 데라곤 하나도 없는,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건데 뭘.”
관심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가슴에 와 박혔다. 신나게 떠드는 솔미, 성실히 듣는 지윤, 그 틈의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건성건성 구경하며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는 관찰자 정도일 것이다. 그럼에도 그 애들과 보내는 시간은 신기하게 즐거웠다. 그렇게 새 학교에, 새 교실에, 새 책상에, 새 사물함에, 새 일상에 천천히 익숙해져 갔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새 친구가 생겼다. 규리였다. 규리는 호주 브리즈번이라는 곳에 살았다. 브리즈번과 서울의 시차가 한 시간밖에 나질 않는다는 걸 규리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규리가 처음 카톡으로 인사를 해온 건 솔미에게 내 아이디를 알아가고도 한참이 지난 뒤였다.
-안녕. 난 이규리라고 하는데, 혹시 내가 누군지 넌 기억…… 못 하겠지?
-안녕. 아냐. 누군지 알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대답해버렸다. 나도 이제 때론 하얀 거짓말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걸 알아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넌 여전히 착하구나.
규리가 말했다. 여전히,는커녕 원래도 착했던 적은 거의 없었으므로 양심에 꽤 찔렸다.
-너 괜찮으면 가끔 톡 친구 할래?
규리가 제안했다.
-그래, 좋아.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카톡 친구란 원래 ‘가끔 친구’니까 또 한 명 늘어난다고 해도 그저 보통의 일일 뿐이었다. 그런데, 규리는 나에게 점점 보통의 친구와는 다른 의미의 친구가 되어갔다
-너는 몇 학년이야? 거기 학년도 우리나라랑 똑같아?
내가 묻자 규리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아니, 달라. 초중고 합해서 학년을 세는데 여기서 나는 10학년이야.
그러곤 덧붙였다.
-원래는.
그 말은, 원래는 그래야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었다. 규리는 지금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다.
-왜?
거기까지 입력했다가 지웠다. 어떤 질문은 하지 않는 게 더 좋다.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남도 그럴 것이다. 규리에게 카톡이 오는 시간은 밤 10시 반쯤이었다. 호주는 11시 반이라고 했다. 나는 학교와 학원 순례를 끝내고, 드디어 방에 들어와 혼자 있는 시간이었다.
-오늘 하루 잘 지냈어?
별 말이 아닌데도, 따뜻하고 다정하게 느껴지는 문장이었다.

정이현 작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02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소설집 『낭만적 사랑과 사회』 『오늘의 거짓말』 『상냥한 폭력의 시대』, 장편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 『너는 모른다』『사랑의 기초ㅡ연인들』 『안녕, 내 모든 것』, 짧은 소설 『말하자면 좋은 사람』, 산문집 『풍선』 『작별』 등을 펴냈다. 이효석 문학상, 현대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받았다.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 작성일
- 2017-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