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연재소설
[단단하게 부서지도록] 6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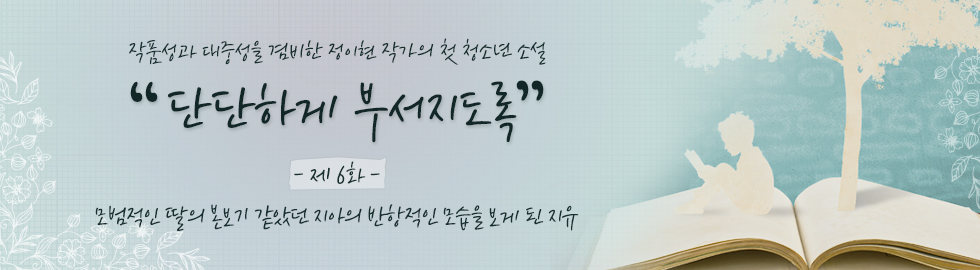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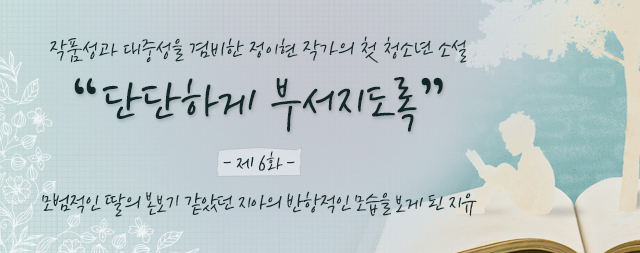
# EPISODE 1
엄마 아빠 그리고 나와 지아, 이렇게 넷이 한집에서 사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행복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행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때도 그다지 행복하지는 않았다. 평화로운 거로 따져봐도 넷이 같이 살 때보다 지금의 집이 훨씬 더 평화로운 게 사실이다. 함께였을 때 엄마 아빠는 싸우고 소리치고 서로 미워하고 한숨을 내쉬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사람이 평화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니까.
다시 싸우고 소리치고 서로 미워하고 한숨을 내쉬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표정을 짓더라도 그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다. 운이 좋으면 미래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내 인생에서 좋은 운 따위 있을 리 없겠지만, 나의 엄마 아빠는 지아의 엄마 아빠이기도 하니까 얘기가 다를 수도 있다. 지아의 인생이라면 운이 나쁠 리 없지 않은가
아니 설령 엄마 아빠가 함께 살아서 다시 불행해질 게 확실하다 해도 나는 포기할 수가 없다.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해도 할 수 없다.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이런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난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니 맘대로 태어나게 만든 부모에게는 부모의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지 않으냐 말이다.
적어도 만 열여섯 살 딸에게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도 않는 사이라고 선언해버리는 엄마의 행동은 무신경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엄마는 밥을 먹다 말고 머리가 아프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엄마의 밥그릇엔 김치볶음밥이 반도 넘게 남아 있었다. 아무리 맛이 없다지만 정말 너무했다. 설거지를 기다리는 그릇과 냄비 들이 싱크대 여기저기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다. 요리 하나를 하는 데 씻어야 할 조리 도구를 열 개씩이나 만들어놓는 것도 엄마가 가진 특기 중 하나였다.
나는 이미 밥맛이 뚝 떨어졌는데 지아는 지치지도 않는지 푹푹 숟가락질을 계속했다.
“알고 있었어.”
지아가 우물거리며 말했다.
“무슨 말이야?”
“그런 게 있어.”
지아가 말끝을 흐렸다.
“야, 똑바로 말해봐.”
“아빠.”
“뭐?”
“아빠 떠난 거.”
“무슨 소리야? 아까 네가 엄마한테 물어봐 놓고.”
지아가 심드렁하게 중얼거렸다.
“그냥 한번 테스트해본 거야.”
“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엄마를 테스트했다고? 왜?”
“그냥.”
“아빠가 어디 간 걸 네가 어떻게 알았는데?”
“그냥.”
“야! 말끝마다 그냥, 그냥! 그냥 병이라도 걸렸냐?”
지아가 커다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지아가 바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빠르게 입력했다. 내 폰이 진동했다. 내게 카톡을 보낸 것이다.
‘엄마 폰을 봤어.’
나도 휴대전화를 들고 답장을 보냈다.
‘엄마가 아빠랑 카톡으로 얘기했다는 거야?’
‘엄마가 아빠랑 그런 걸 할 거 같아?’
‘그럼?’
‘엄마가 누구랑 얘기한 거.’
내가 알기로 엄마는 아빠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눌 만한 성격이 아니었다. 엄마는 별로 많지도 않은 주위 사람들에게 아빠와의 일을 철저히 숨겼다. 별거 생활이 2년째 접어들지만 외가 식구들은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말 다한 게 아닌가. 우리는 각자 손에 휴대전화를 꼭 쥔 채, 눈을 마주 보았다. 지아가 말하는 ‘누구’가 누군지 나는 감도 잡히지 않았다.
“야 그래도 그건 범죄……”
거기까지 말하고 나는 입을 닫았다. 대신 카톡을 보냈다.
‘그건 범죄야. 남의 폰 훔쳐보는 거.’
비웃기라도 하는 듯 지아의 한쪽 입꼬리가 찍 올라갔다.
‘웃기네 ㅋ’
그 ‘누구’가 대체 누구인지, 또 이 세상 모든 착하고 모범적인 딸내미들의 본보기 같았던 지아가 왜 갑자기 변해버렸는지 어떻게 해서라도 알아내고 싶은 마음, 차라리 모르고 싶은 마음이 마구 부딪쳤다. 나는 휴대전화의 액정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럼 넌 알면서 엄마를 왜 떠본 거야?’
‘한번 보고 싶었어. 그때 엄마 표정.’
할 말이 사라졌다. 지아가 하는 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나이기 때문이다. 나도 모르게 입으로 툭 뱉어버렸다.
“야, 강지아.”
지아가 나를 쳐다봤다.
“너, 그거야.”
“뭐?”
“그거. 사춘기.”
“헐.”
지아가 고개를 벽 쪽으로 돌려버렸다.
“왜 어른처럼 말하냐.”
지아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입 밖으로 내놓진 않았지만 입속으론 ‘재수 없게’라고 덧붙였을 가능성 99퍼센트였다. 사춘기가 시작되는 아이에 대해서라면 그 정도는 짐작하고도 남았다.

새 교복, 남색의 고등학교 교복은 내 몸에 헐렁하고 크다. 엄마가 가장 큰 사이즈로 맞출 것을 주장했다. 내 키는 지금 165센티미터쯤이다. 그런데도 엄마는 내가 더 자랄 거라 기대하는 걸까. 아니 무조건 큰 옷으로 사고 보는 건 엄마로 살아오는 동안 몸에 배어버린 습관일 것이다. 입학할 땐 헐렁헐렁하던 옷이 점점 몸에 맞는 사이즈가 되어가다가 이윽고 몸에 꽉 끼게 되는 그 순환이 나는 한없이 지겨웠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신비로운 것으로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본능적으로 야구 유니폼이 떠올랐다. 유니폼이 작아져서 못 입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때도 엄마는 늘 내 사이즈보다 하나 또는 두 사이즈 큰 옷을 골랐지만 내 키가 쑥쑥 자라서가 아니라, 구멍이 나거나 찢어져서 새 옷을 사야만 했다.

정이현 작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02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소설집 『낭만적 사랑과 사회』 『오늘의 거짓말』 『상냥한 폭력의 시대』, 장편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 『너는 모른다』『사랑의 기초ㅡ연인들』 『안녕, 내 모든 것』, 짧은 소설 『말하자면 좋은 사람』, 산문집 『풍선』 『작별』 등을 펴냈다. 이효석 문학상, 현대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받았다.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 작성일
- 2017-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