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연재소설
[단단하게 부서지도록] 5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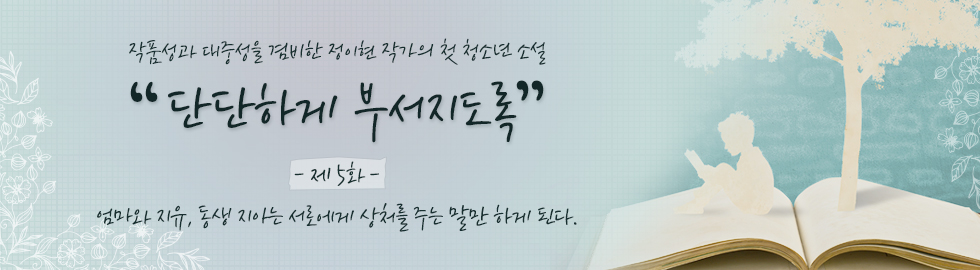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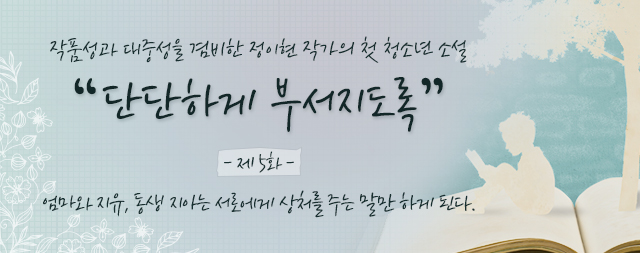
# EPISODE 1
어릴 때부터 엄마는 자주 우리가 부럽다고 말했다. 고맙지 않느냐고도 했다. 지아와 내가 두 살 터울 자매라서.
“아무리 자매라도 나이 차이 많으면 별로야.”
엄마는 강조하곤 했다.
“나는 언니들하고 나이차가 커서 자라는 내내 얼마나 외로웠다고. 어리다고 끼워주지도 않고 말이야.”
우리가 두 살 차이, 정확히 말해 21개월 터울인 것이 ‘나 같은 설움을 너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본인의 희생정신 때문이었음을 엄마는 주장하는 듯했다. 물론 여기서 ‘너’란 나를 뜻한다. 엄마가 나 때문에 그랬다고? 내가 외로울까 봐서? 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였다. 만약 반대로 말한다면 조금은 믿을 용의도 있다. 지아를 위해 나를 낳았다면.
어릴 땐 어쩌면 나는 지아라는 아이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닐까 의심스러운 적도 있었다. 밤하늘이 캄캄할 때 별이 더 환하게 반짝여 보이는 것처럼 말이다.
엄마 아빠가 차별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지아는 벌써 다 했구나.”
“지아는 정말 기억력이 좋구나.”
“지아는 수학도 잘하네.”
아무도 내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는데 왜 자꾸 내 뺨이 붉어지는지 모를 일이었다. 물론 부모에게도 힘든 점은 있었을 것이다. 이건 뭐 큰딸과 작은딸을 공평하게 칭찬하고 싶어도 한 아이에게는 그럴 만한 구석이 도통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내가 야구를 만나게 되었다. 엄마 아빠의 말에서, 간간이 주어가 바뀌는 순간이 등장하게 된 건 전적으로 야구 덕분이었다.
“지유가 야구는 정말 좋아하는구나.”
“지유가 야구 하나는 잘하지.”
엄마 아빠는 지아에 관해 이야기할 때만큼 자부심이나 활력이 넘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큰딸에 대해 그 정도라도 칭찬할 거리를 찾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다 옛날 얘기다. 내게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도 엄마는 다 잊어버렸을 것이다.
지아가 부럽다는 뜻은 아니다. 지아와 내가 자매라는 사실에 대해 누군가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지아를 만들어준 엄마 아빠가 아니라 지아여야 했다. 나는 지아가 부러운 만큼 늘 지아에게 고마웠다. 엄마에게 자식이 나뿐이었다면 엄마가 너무 불쌍했을 테니까. 지아가 없었다면 엄마는 더, 더 웃을 일이 없었을 테니까.
# EPISODE 2

“지아는 이제 2학년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셋이 둘러앉은 저녁 식탁에서도 엄마의 입에서는 계속 ‘지아는’으로 시작하는 문장들이 흘러나왔다.
“알고 있어요. 엄마.”
나라면 건성으로 대꾸하고 말 텐데도 지아는 참 성의 있는 태도로 대답했다. 확실히 나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동안 공부 안 하던 애들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제부터 진짜 경쟁이야.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엄마가 흘끗 내 쪽을 보려다 만 것 같기도 했다. 엄마의 말 뒤에는 ‘네 언니처럼’이 생략되어 있다는 걸 지아도 충분히 눈치챘을 것이다. 나는 묵묵히 볶음밥을 씹었다. 엄마의 저녁 메뉴는 햄과 시들시들한 채소들과 김치를 한데 넣고 볶은 김치볶음밥이었다. 여태까지 내가 먹은 엄마표 김치볶음밥만 수백 그릇은 되는 것 같은데 엄마는 아직도 간을 잘 못 맞췄다. 덜 볶인 김치가 입속에서 서걱거렸다.
“엄마, 근데.”
지아가 말했다.
“요새 아빠랑 연락해봤어요?”
나는 입에 있던 밥 뭉치를 급히 꿀꺽 삼켰다. 지아가 너무도 천진난만하게 물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 셋이 있을 때 ‘아빠’라는 단어는 금지어 같은 거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물론 그렇게 정한 적은 없지만 서로 말없이 지키는 규칙 같은 거였다. 누구보다 그걸 잘 아는 지아가 왜 별안간 저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다.
엄마는 대답이 없었다.
“어디 외국에 출장 가셨어요?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카톡 보내도 읽지를 않고, 아까 전화해봤는데 안 받고.”
“……”
“언니 입학식도 했는데 아빠가 연락 안 할 리가 없는데.”
지아가 말끝을 흐렸다. 지아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똑같았지만 나는 어쩐지 이마가 차가워지는 느낌이었다. 지아는 결코 저런 말을 할 아이가 아니었다. 아빠와 연락이 닿지 않아 아무리 불안하다 해도 엄마가 상처받을까 봐, 속상할까 봐, 엄마에게 직접 물을 아이가 아니었다. 나는 밥알을 깨작거리는 지아를 훔쳐보았다. 평소 지아는 음식을 먹을 때 입술을 오물오물 야무지게도 움직였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았다. 보통 때와 다르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비로소 나는 깨달았다. 지아는 방금 엄마가 상처받으라고, 속상하라고, 얘기한 것이다.
“참 내가 얘기 안 했나?”
엄마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것은, 내 접시의 김치볶음밥이 두 숟가락쯤 남았을 때였다. 엄마의 목소리는 마치 ‘이 귤 참 시다’거나 ‘티셔츠에 얼룩이 안 지워지네’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어디 좀 가셨어.”
나와 지아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아빠는 출장이 잦은 편이었고 여행 다니기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스마트폰을 한시라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이었고, 아무리 바빠도 우리에게 오는 연락은 안 받는 법이 없었다.
“어딜?”
“나도 자세히는 몰라.”
엄마가 우리와 눈을 맞추지 않으려 한다는 감이 왔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엄마도 실은 긴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왔다.
“그냥 좀 떠나 있겠대. 한국을.”
“회사는?”
잘되지는 않는 눈치였지만 아빠는 어쨌든 작은 인테리어 회사의 사장이었다.
“잠깐 쉰대.”
“말도 안 돼요.”
지아가 중얼거렸다.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세상에 아주 많은 일들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잘만 일어나곤 하는 것이다.
“또…… 싸운 거예요?”
지아가 또박또박 물었다. ‘또’를 붙이지 않았다면 좀 나았으려나, 나는 기껏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찬물을 들이켰다.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착한 지아가 변했다. 제대로 변했다. 아무래도 동생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음이 틀림없었다. 엄마가 숟가락을 놓았다. 조심스러운 동작이었다. 나는 더럭 겁이 났다.
“아빠랑 나는, 이제 싸우지 않아.”
번들거리는 입술 사이에서 새어 나오는 엄마의 말을 나는 멍하니 들었다. 싸우지 않는 관계란, 싸우지 않을 만큼 사이좋은 관계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적어도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는 없었다.
지아와 내가 서로 마음을 툭 터놓고 얘기해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같은 종류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나는 안다. 아빠와 엄마가 지금은 따로 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같이 살게 되리라는 희망, 아 만약 그런 것도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다.

정이현 작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02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소설집 『낭만적 사랑과 사회』 『오늘의 거짓말』 『상냥한 폭력의 시대』, 장편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 『너는 모른다』『사랑의 기초ㅡ연인들』 『안녕, 내 모든 것』, 짧은 소설 『말하자면 좋은 사람』, 산문집 『풍선』 『작별』 등을 펴냈다. 이효석 문학상, 현대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받았다.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 작성일
- 2017-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