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연재소설
[단단하게 부서지도록] 3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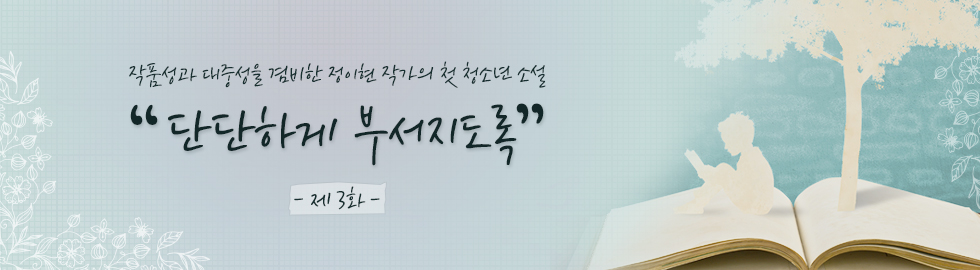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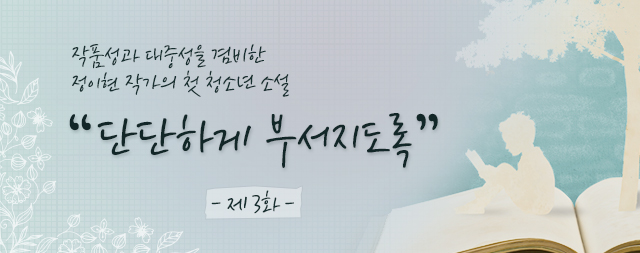
# EPISODE 1
고등학생이 되었다고 해도 드라마틱하게 달라진 것은 없다. 학교가 몇 정거장 더 멀어졌고, 등교 시간이 삼십 분 더 빨라졌으며, 교복 색깔은 더 칙칙해졌다는 것. 그런데도 동생 지아는 나를 부러워했다.
“남색이라 때도 안 타 보이고 좋겠다.”
내 방에 걸린 새 교복을 어루만지며 지아가 말했다. 내가 보기엔 지아네 학교의 비둘기색 재킷이나 우리 학교의 남색 재킷이나 거기서 거기지만 지아에게는 달리 느껴졌나 보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우리 교복이 특별히 좋아 보여서도, 근사해 보여서도 아닐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을 부러워하는 속성을 가졌고, 지아 역시 그럴 뿐이었다.
“그럼 너도 여기 들어오든지.”
나는 심드렁하게 말했다.
“웅, 나도 그럴까?”
나는 손바닥으로 지아의 등을 툭 쳤다.
“야 미쳤냐?”
“왜애?”
지아가 혀를 쑥 내밀었다.
“정신 차려. 엄마 기절한다.”
자사고를 가든, 외고를 가든, 국제고를 가든, 지아는 사실 어디든 가고도 남을 아이다.
뭐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다. 우리는 두 살 터울이다. 그러나 여섯 살 때부터 지아는, 여덟 살의 나보다 덧셈도 뺄셈도 더 잘했고 한글 띄어쓰기와 맞춤법도 더 잘 알았다. 내가 특별하게 머리가 나쁜 아이여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 나쁜 머리가 문제라기보다 지아의 지나치게 좋은 머리가 문제였다.
지아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엄마는 우리 둘의 손을 잡고 무슨 지능검사인가를 받으러 갔다. 왼손으로는 나를, 오른손으로는 지아를 꽉 붙들고 있었지만, 엄마의 속내는 꽤 복잡했을 것이다. 우리는 지하철과 택시를 번갈아 타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로 향했다.
조그만 방들이 빼곡히 들어찬 건물이었다. 지아와 나는 각기 다른 교실로 들어갔다. 나는 젊은 여교사의 감독 아래 문제지를 풀었다. 시험지에는 긴가민가한 문제들이 가득했다. 나는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설마 지아와 내가 같은 문제를 풀고 있는 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지아보다 덜 틀릴 자신이 없었다.
지아의 시험지를 보지 못했으므로 그 의문은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 시험 결과는 며칠 후 엄마에게 통보되었다. 나의 지능이 몇 퍼센티지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엄마는 일언반구 하지 않았다. 지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은 노력을 해야 돼.”
지아가 상위 0.02퍼센트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오래 지나지 않아 저절로 알게 됐다. 엄마와 아빠가 싸울 때면, 싸움이 시작된 배경과는 별 상관도 없는 별별 얘기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끝없이 끌려 나오기 마련이었다.
“애가 저렇게 똑똑한데 부모가 되어서 제대로는 못 해도 남들 반의반만큼이라도 뒷바라지를 해줘야 할 게 아니야?”
엄마는 지아를 영재들이 모인다는 강남의 무슨 학원에 보내자는 의견이었고 아빠는 별 유난스러운 소리를 다 듣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늘 그렇듯이 둘은 입장 차이가 확연했다. 내가 아는 한, 두 사람은 그게 무엇이든 단 한 번도 일치하는 견해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애들은 평범하게 크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웃기네. 당신이 평범하다는 건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큰다는 거겠지.”
“쓸데없는 돈을 왜 들이냐? 그건 낭비지.”
“풋. 이제야 본심을 말하시네. 원비가 비싸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 삼 개월 치를 한 번에 내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별로 비싼 것도 아니야.”
“그게 낭비야. 기껏 1학년 들어간 애가 영재는 무슨 영재라고. 학원 장사치들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는.”
“보통 영재가 아니야. 0.02퍼센트라니까.”
아빠가 혀 차는 시늉을 하기 무섭게 엄마는 “정말 낭비가 뭔지는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로 시작되는 폭로전으로 형세를 전환했다.
엄마 말에 의하면, 지아의 석 달 학원비는 아빠가 지난겨울 장만한 코트값의 절반일 뿐이며, 아빠가 수십 개월짜리 리스로 장만한 새 자동차의 한 달 이용료에 불과하다고 했다.
“당신이 퍼마시고 다니는 술값을 생각해봐.”
나는 지아 쪽을 흘끔 보았다. 내게는 생생하게 전달되는 부모의 목소리가 지아의 귀에 안 들릴 리는 없을 텐데, 지아는 밖의 사정은 모르는 척 가만히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었다. 우리 학년에서 배우는 분수 덧셈이었다.
“건전하게 술만 마시고 다니면 내가 말도 안 해.”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을 땐 나도 모르게 손바닥을 펼쳐 지아의 두 귀를 막았다. 엄마의 말뜻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왠지 지아가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언니야, 왜애.”
지아가 천진하게 말하며 몸을 비틀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났지만, 지아는 그대로였다. 수학과 국어를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언니야’라고 부르며 이유 없이 킥킥거리기도 잘했다. 환히 웃을 때면 볼 한가운데가 쏙 파이며 인디언 보조개가 잡혔다.
그사이 우리 집에서 변하지 않은 사람은 오로지 지아밖에 없었다. 다치지 않은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언제까지나 나는 동생을 보호해주고 싶었다.
# EPISODE 2

“그래도 난 부럽다. 난 언제.”
지아가 내 교복을 또다시 쓸어보며 중얼거렸다.
“야 금방이야, 금방.”
나는 팔십 년은 살아온 너구리 할머니처럼 지아를 달랬다.
“근데 언니야.”
“응?”
“아니야.”
“왜. 할 말 있으면 해.”
“아냐. 나중에.”
지아는 남의 둥지에 놀러왔다 돌아가는 참새처럼 포르르 날아갔다. 지아가 방문을 닫고 나가자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들었다. 채은에게서 온 카톡 새 메시지는 25개가 넘었다. 다 붙이면 한 번에 쓸 수 있는 것도, 채은이는 25번에 걸쳐 나눠 보낸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다.
‘난 학원.’
‘아 졸려.’
‘야 쮸!’
‘나 좀 구해죵’
‘아 졸려졸려졸려.’
‘아 떡볶이 먹고 싶어.’
‘낼 먹을래?’
내가 자기처럼 하지 않고, 할 말을 하나의 창 안에 다 써서 보내면 채은은 버럭 성질을 내곤 했다. ‘넌 참 정 없어’라고 투덜대거나 ‘야 내가 귀찮냐?’라고 되도 않는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나는 채은에게만큼은 하나의 창에 한 문장 혹은 반 개의 문장 혹은 반의반 개의 문장만 넣어 메시지를 보냈다.
‘난 집.’
‘아 힘들어.’
그렇게 썼다가 지우고 ‘아 지겨워’로 바꾸었다. 힘들어나, 지겨워나, 그게 그거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야 챈!’
‘나 좀 구해죵.’
‘아 지겹지겹지겹.’
학원 수업이 시작됐는지 채은에게선 아무 답장이 없었다. 상대가 안 읽은 메시지를 표시하는 숫자 1도 사라지지 않았다.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다가 나는 검색창을 열었다. 간만에 그 애의 이름을 검색해보고 싶었다. 곁에 누가 있을 때는 절대로 하지 않는, 나의 이유 없는, 오랜 버릇. 나는 그 이름 세 글자를 검색창에 또박또박 입력했다.
강세연.
바로 어제 날짜의 뉴스 기사가 떴다.

정이현 작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02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소설집 『낭만적 사랑과 사회』 『오늘의 거짓말』 『상냥한 폭력의 시대』, 장편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 『너는 모른다』『사랑의 기초ㅡ연인들』 『안녕, 내 모든 것』, 짧은 소설 『말하자면 좋은 사람』, 산문집 『풍선』 『작별』 등을 펴냈다. 이효석 문학상, 현대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받았다.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 작성일
- 2016-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