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는 동화
금반지


따르릉, 전화벨이 울린다. 학교에서 방금 돌아와 간식을 먹고 학원에 갈 참이다. 다시 전화벨이 울린다. 엄마는 어제 외할머니 댁에서 가져온 부추를 다듬고 있다.
수화기를 들었다.
“누구야?”
수화기를 얼른 귀에서 뗀다. 귀청이 찢어질 것 같은, 쇳소리를 닮은, 저 목소리, 외할머니다.
“태완이요!”
“에미 바꿔라!”
엄마는 이미 곁에 와있다. 수화기를 엄마에게 건넸다.
“내 반지 못 봤냐?”
다 들린다.
“네가 칠순 때 사준 금반지 말이여!”
모두 다 들린다. 금반지? 금반지라고? 그 금반지가 없어졌다고?
“언제요?”
엄마가 되묻는다.
“어제, 너희들 댕겨간 후 보이질 않아.”
“태완아, 너 할머니 반지 못 봤어?”
엄마가 수화기를 든 채 이번엔 내게 묻는다. 그 사이에도 할머니는 계속 뭐라는지 말하고 있다.?
“몰라, 나 학원가야 한다고.”
나는 가방을 메고 문을 나섰다.
어제 우리는 외할머니 댁엘 다녀왔다. 아빠가 또 외할머니 표 칼국수를 먹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우리래야 엄마, 아빠, 나 셋이다.
엄마는 출발에 앞서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거기서 만나자는 내용이었다. 늘 그런다. 이모부가 외국 장기 출장 중인데다 이모는 청소라면 도가 튼 사람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엄마는 허리가 좀 약한 편이다.
우리가 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이모네는 이미 와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모는 벌써 빗자루를 들고 안채 바깥채를 들고나며 청소 중이고, 정재와 아연이는 밀가루 반죽으로 말과 소를 만들고 있었다.
“오빠, 내 말이 더 말 같지?”
아연이가 반색을 하며 밀가루덩이를 보여주었다.
“정재 소가 더 소 같은데?”
나는 정재를 한 번 안아주었다. 아직 말은 못해도 정재는 기분이 좋은지 내 목을 끌어안았다. 그 바람에 공같이 뭉친 밀가루덩이가 정재 손을 떠나 저만치 굴러갔다. 할머니는 밀가루 반죽을 치대는 중이었다. 물론 윗집할머니도 와있었다. 그분은 애호박을 채 써는 중이었다.
아빠는 애호박칼국수만 좋아하는 게 아니다. 멸치국물애호박칼국수도 좋아하고, 애호박바지락칼국수도 좋아한다. 외할머니가 만드는 칼국수는 무엇이나 좋아했다.
“아마 장모님이 직접 담근 간장 맛이 좋아서 그럴 거야.”
“그뿐만이 아니죠. 검붉은 풋고추를 따다 종종 썰어 넣은 양념간장은 물론 된 반죽을 얇게 밀어 가늘게 썬 때문이랍니다.”
때마다 아빠 말씀에 토를 다는 엄마의 대꾸였다.
“아이고, 비가 오려나.”

그때 할머니가 떡판과 홍두깨를 윗집할머니 앞으로 밀어놓으며 어깨를 주물렀다.
“형님, 그럴 줄 알았소. 반죽부터 내가 한다니까 고집을 피우시더니만.”
그동안 다듬은 부추랑 양파까지 썰어놓은 윗집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밀다 만 밀가루 반죽을 밀기 시작했다. 외할머니는 대청마루 한 쪽에 팔베개로 누셨다. 내가 얼른 베개를 꺼내다 드렸다. 그때 이미 할머니 왼손 무명지에는 반지가 보이지 않았다.
그 반지는, 엄마랑 이모가 돈을 모아 할머니 칠순기념으로 사드린 거였다. 그런데 할머니는 언제부턴가 살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손가락까지 가늘어졌는지 반지가 자꾸만 빠진다고 하셨다. 언젠가는 요강을 부시다 빠져 수채 구멍에 들어간 것을 윗집할머니가 간신히 건져냈다고 했다. 그러고는 요새 보기 드문 명주실까지 어디서 구해다가 여러 번 반지에 감아주더라고 했다. 이북에 살 때는 자기도 금반지를 낀 적이 있다며 헐거운 반지 맞추는 데는 그게 한 방법이라고 설명까지 하더라고 했다. 그런데, 명주실을 알맞게 감은 반지가 이제 헐겁진 않은데, 거기 까맣게 때가 끼어 나물 같은 걸 무칠 때는 비닐장갑을 끼면 되지만 밀가루 반죽을 할 때는 맨손이 필요하므로 어쩔 수 없이 빼놓기 일쑤였다. 그런데 그 반지가 감쪽같이 없어진 거다.
외가댁 식구는 한 때 30명이 넘었단다.
위 아래채에 사랑채까지 있는 기와집에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슬하에 아들이 여덟, 엄마 이모까지 십남매를 두었다고 했다. 조석 때면 밥을 푸다가 곧잘 밥그릇 수를 잊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큰 집에 동그마니 할머니 홀로 산다. 외삼촌들 모두 도시에 나가 살고 딸들(엄마와 이모) 또한 출가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다행인 건 윗집에 홀로 사는 개성댁이 있어 할머니 말벗이 되어주는 거다. 아침이면 일찌감치 출근하듯 내려와 점심도 함께 끓여먹고, 낮잠을 자다가 민화투도 한 판 치고, 텃밭에 그늘지면 나가 심심풀이로 고추도 따며 친자매같이 지내시는 거다. 어떤 외삼촌은, 그 할매, 우리 집에 와 아예 먹고산다며 언짢은 말을 한 일도 있지만 엄마나 이모는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라며 오히려 치하를 했다. 부모 못 모시는 자식보다 이웃이 낫다며, 오죽하면 외할머니 칠순 잔치 때는 할머니와 똑같은 천으로 옷까지 한 벌 맞춰드렸을까.
“어서 오렴.”
내가 학원에서 돌아왔을 때는 아빠도 퇴근해서 집에 와계셨다.
“할머니 반지 찾았나?”
“한 번 잃으면 그만이지, 찾긴 어디서 찾겠니.”
엄마가 주방에서 대꾸하셨다.
“이모네 전화 좀 해보지.”
“할머니가 벌써 하셨겠지.”
아빠도 알고계신지 한 마디 보태셨다.
“엄마가 직접 물어보지. 정재와 아연이한테두.”
“아연이는 몰라도 정재는 아직 말도 못 하잖니.”
“그러네.”
나는 내 방으로 들어왔다. 쓸데없는 말을 한 것 같다. 할머니와 이모가 벌써 확인했을 일인데 말이다. 그때 또 전화벨이 울렸다.
“예, 엄마!”
엄마가 전화를 받는다. 할머니인 모양이다. 나는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다.
“아무래도 그 여편네 소행인 듯싶구나. 그때, 내가 요강 부시다 수채 구멍에 빠트렸을 때도 그 여편네가 건져내고는 자기 손가락에는 꼭 맞는다더니, 견물생심이라고 두고 벼르다가 집어넣은 게 분명하지.”
“엄마, 제발 그런 말씀,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그 아주머니 이북에서 내려와 외동딸 시집보내기까지 여태껏 사는 동안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집 감자밭 한 번 넘본 적 없다는 것 엄마도 알잖우? 그리고 엄마가 자주 하는 말, 잘 간수하지 못해 잃어버린 사람이 죄가 크다고. 엉뚱한 사람 의심하다 벌 받아요, 엄마!”
“우리가 이 담에 내려갈 때 반지 하나 해다 드립시다.”
할머니와 엄마 전화가 끝난 후, 저녁밥상에서 아빠가 꺼낸 말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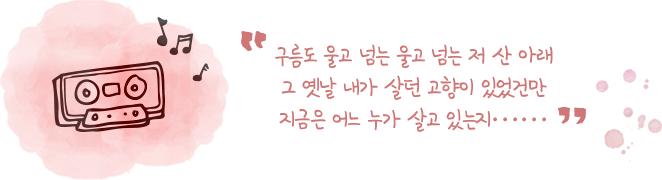
아빠가 운전을 하며 오기택의 ‘고향무정’을 듣는다. 일요일, 다시 할머니 댁에 가는 길이다. 왕복 6차선에다 도로변에는 고층아파트가 찝찝하게 들어차 있다. 내가 태어나기 전만 해도 비포장 국도 한쪽에는 푸른 들판이 펼쳐있고, 다른 한쪽엔 개펄이 펼쳐져 있었단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외할머니는 대청마루에 누워계시고, 밀가루 반죽은 이모가 밀고 있었다.
“윗집할머니가 안보이네.”
아빠가 말했다.
정재와 아연이는 여전히 밀가루 반죽으로 소와 말을 만들고 있다. 아빠가 손을 씻고 오더니 자연스레 이모한테서 홍두깨를 옮겨 받았다. 할머니가 안방으로 자리를 옮겨 눕는데 엄마가 이모 눈짓에 따라 슬그머니 부엌으로 들어간다. 나도 슬그머니 부엌문 뒤로 다가섰다.
“언니, 글쎄, 엄마가 언니한테 전화를 걸 때, 윗집할머니가 그 소릴 들었대나 봐. 그 후로 걸음을 딱 끊었대나 봐.”
이모가 말했다.
“엄마가 많이 달라졌다, 남을 의심하시질 않나. 그 아주머니 덕택에 우리가 턱 믿고 근심 없이 지냈는데 큰일이다. 형부가 그러는데 글쎄 음식 맛도 전과 같지 않단다. 어떡하니, 큰일이다.”
엄마가 말했다.
“그러고 저러고 금반지 값!“
이모가 지갑을 꺼내며 말했다.
“관둬! 형부가 샀어. 그동안 칼국수를 얼마나 얻어먹었니. 된장 고추장까지. 그러고저러고 새 반지를 어떻게 내놓니? 잃었던 걸 찾았다고 속일 수도 없고……”
“그러고저러고 언니. 윗집에나 잠깐 다녀올까?
“뭐라 할 말이 있어야지, 반지나 찾기 전에는.”
그리고 얼마 후의 일이다. 이모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윗집할머니가 곡기를 끊어 결국 자살을 하셨다는 소식이었다. 말로는, 얼마 전 폐암진단을 받았는데 출가한 외동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랬다지만, 사실은 도둑누명이 억울해서 그랬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였다. 저녁밥을 먹는 중이었는데, 엄마와 아빠는 그만 수저를 놓았다. 나도 할 말이 없었다.
할머니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드디어 큰외삼촌한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치매기가 심해 홀로 계시다 화재라도 당하면 어쩌느냐고, 하루 바삐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는 말이었다. 엄마는 이모와 통화를 하며 울었다.
비울 집을 치우기 위해 우리가 외갓집에 다시 갔을 때, 이모는 이미 대청소 중이었다. 전처럼 칼국수를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도 팔을 걷어 부치고 빗자루와 걸레를 집어 드는데, 안방에서 장롱 밑을 쓸어내던 이모가 골프공만한 밀가루덩이를 끄집어냈다. 말라터진 그 틈새로 반짝, 황금빛이 보였다.
- 글
- 강정규_소설가, 아동문학가, 계간 《시와동화》 발행인,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 이사. 1941년생동화 『다섯 시 반에 멈춘 시계』 『목욕탕에서 선생님을 만났다』 『짱구네 집』 『큰 소나무』 『돌이 아버지』 『작은 학교 큰 선생님』 등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 작성일
- 2016-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