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을 읽다
역사를 거닐다
철학을 느끼다
문학을 읽다
역사를 거닐다
철학을 느끼다
작가의 책상
자연 그대로라서 더 특별한 시인 안도현의 책상

책상(冊床) : [명사] 앉아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사무를 보거나 할 때에 앞에 놓고 쓰는 상.
지난 여름 『백석 평전』을 낸 안도현 시인은 따뜻한 시로 우리의 삶을 위로해 왔습니다. 시와 삶이 일치하듯 그의 공간은 세상에 물들지 않은 자연 그대로입니다. 투박한 사물에서도 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의 책상을 만나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주목한 시인,
사소한 공간을 시의 보물창고로 쓰다
사소한 공간을 시의 보물창고로 쓰다

단풍잎에 물든 햇살이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시인 백석(1912~1996)은 그의 작품 「단풍」에서 붉은 단풍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빨간 정(情) 무르녹는 마음이 아름답지 않느뇨. 단풍 든 시절은 새빨간 웃음을 웃고 새빨간 말을 지줄댄다. 재화가 한끝 풍성하야 시월(十月) 햇살이 무색하다.'
특유의 정감으로 자연을 묘사한 백석은 많은 시인들이 따르는 시인이었습니다. 지난 6월 『백석 평전』을 낸 시인 안도현도 백석을 '짝사랑했다'고 고백합니다. 1980년 스무 살 무렵 백석의 시 「모닥불」을 만나면서 백석을 흠모하기 시작했다는 안 시인. 그의 시는 백석의 작품처럼 순수함과 따뜻함을 담고 있습니다.
안 시인의 창작 공간인 전북 완주군 구이면 광곡리 신원마을을 찾았습니다. 그가 교수로 있는 우석대에서 차로 20분 떨어진 농촌 마을입니다.
세 칸짜리 작업 공간은 황토와 서까래가 드러난 옛날 집입니다. 올린 지 70년도 더 된 서까래에는 '임오년'(1942년)이라 쓰여 있습니다. 에어컨도 없고 여름엔 모기가 극성을 부리지만 시인은 '그래서 좋다'고 합니다. 툇마루에 걸터앉은 시인은 집 설명을 하면서도 발목에 모기약을 뿌리며 웃었습니다.
"원래 초가삼간이었던 폐가를 199년 손수 개조했어요. 부엌, 방, 집필공간이 전붑니다. 심심하긴, 전혀. 여기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글 쓰랴, 풀 뽑고 청소하랴... 며칠 비웠더니 고양이들이 풀밭에 똥을 누고 갔네. 허허."
나른한 듯 느리게 집안을 둘러보는 시인. 그의 집에는 자연과 하나인 듯 투박하지만 의미 있는 물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작가의 물건 ㅣ 자연의 재활용 ? 문짝과 나뭇가지의 변신

"강원도 냇물에서 떠내려오는 걸 주워 온건데 이런 사소한 것들이 삶에 하나둘 자리하게 된 거죠."
시인은 '재활용의 달인'입니다. 특별히 새 물건을 구입하지 않아도 주위에 버려진 물건을 가구로 쓰고 있었습니다.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책상도 그렇습니다.
"원래 집에 있는 문(門)이었어요. 너무 낡아서 못 쓰게 되어서 버릴까 했는데, 동생이 떼어다 손질하고 유리를 얹어 줘서 쓸 만한 탁자로 변신했죠. 요즘엔 유리가 깨져서 못 쓰고 있지만 그래도 특별한 '문짝 책상'이에요."
책상 위에는 굵은 나무 막대가 걸려 있습니다. 막대의 한 쪽 끝이 사슴뿔처럼 생겨서 시인은 여기에 가끔 옷가지를 걸어 둡니다. 알고 보니 친한 동료인 박남준 시인에게 '빼앗아 온' 나뭇가지랍니다.
"박 시인이 모악산 쪽에 살 때 집에 놀러 갔었어요. 대문 앞에 빗장처럼 이게 걸려 있더군요. 어디서 구했냐고 했더니 강원도 어디 냇물에 떠내려오는 걸 주워 왔다나. 사슴머리 모양이 예뻐서 탐을 냈더니 가지래요. 그 때부터 쓰고 있죠."
『그 작고 하찮은 것들에 대한 애착』이라는 시집 제목처럼 사소한 것들을 일상의 친구로 삼는 시인. 소박한 씀씀이에서 넉넉한 정이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작가의 물건 ㅣ '많이 읽고 많이 쓰라' 구이구산(九耳九山)
'아홉 개의 귀로 듣고 아홉 개의 산을 쌓을 만큼 많이 쓴다' 글 열심히 쓰라고 선물해 주더라고요.

시인의 작업실은 별칭이 있습니다. '구이구산(九耳九山)'. 동료 문인들 등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이름입니다. 작업실이 구이면에 위치해서 구이, 또는 '아홉 개의 귀로 듣고 아홉 개의 산을 쌓을 만큼 많이 쓴다'는 뜻이랍니다.
굵직한 목판에 새겨진 '구이구산'은 전주시 톨게이트 간판의 글씨체를 쓴 서예가 여태명(원광대 교수)의 글씨랍니다. 남궁산 판화가, 서영채 평론가, 최재봉 기자 등 친한 지인들이 선물했다는데요. 황토빛 벽에 걸려 더 옛스러운 정취를 풍깁니다.
'글 열심히 쓰라'는 동료들의 응원 덕분이었을까요? 시인은 이곳에서 100여 편의 시를 썼습니다. 시인은 시집 『너에게 가려고 강을 만들었다』를 뒤적이며 "「염소의 저녁」, 「적막」, 「어느 빈집」, 「꽃 지는 날」, 「모기장 동물원」 등 30여 편의 시가 이 집에서 탄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이구산은 동료 문인들이 모여 술잔을 기울이는 사랑방이기도 합니다. 김용택, 박남준 시인은 ‘혼자서 살기 딱 좋은 집’이라고 칭찬하고, 김훈 소설가는 ‘샘이 나서 불사지르고 싶다’고 농담했답니다. 다작(多作)에 대한 주문을 담은 목판은 묵묵히 제 이름값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작가의 물건 ㅣ 나무의 일상이 시가 되었다 ? 나무 그림

"나무의 일상을 글로 옮기면 시가 되요.
굳건한 뿌리라든지, 허공에 가지를 뻗고 있는 모양을 보면서 관찰하고 함께 생활하는 거죠.
그 생활을 글로 옮기니 시가 되더라고요."
굳건한 뿌리라든지, 허공에 가지를 뻗고 있는 모양을 보면서 관찰하고 함께 생활하는 거죠.
그 생활을 글로 옮기니 시가 되더라고요."
어릴 적 꿈이 화가였을 정도로 그림이 좋다는 시인. 목탄으로 그린 겨울나무 그림 한 점이 걸려 있는데요. 민중화가 강요배가 그린 《팽나무》입니다.
"지난 1월에 제주도의 강 화가 작업실에서 막걸리 한 잔 하던 중이었어요. 마당에 있는 팽나무가 멋있다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그려주더군요. 팽나무는 제주도에선 ‘폭낭’이라고 불러요. 크고 오래 살아서 마을마다 당산나무처럼 모시기도 하죠. 3~4mm 정도로 조그만 열매가 맺히는데 먹기도 하고 애들 새총으로도 쓴대요."
산딸나무, 조팝나무, 때죽나무, 비목나무... 나무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시인을 두고 동료들은 '걸어 다니는 식물도감'이라 부릅니다. 시인이 '나무 전문가'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무의 일상을 글로 옮기면 시가 되요. 사실 마당 청소하는 게 귀찮을 때도 있는데, 나무랑 연애하는 기분으로 하면 내가 즐거워지죠. 거기서 굳건한 뿌리라든지, 허공에 가지를 뻗고 있는 모양을 보고 사랑스럽게 느끼는 거고. 또 평소에 이름 외워뒀다가 친구 만날 때 잘난 척도 하지. 이거 무슨 나문지 알아? 하면 모르니까. 하하"
마당에는 작업실이 탄생한 1998년부터 쭉 함께 해온 소나무가 있습니다. 산길에 버려진 어린 나무를 주워 마당에 심었는데, 시인보다 키가 작았던 소나무는 지금 4m를 훌쩍 넘는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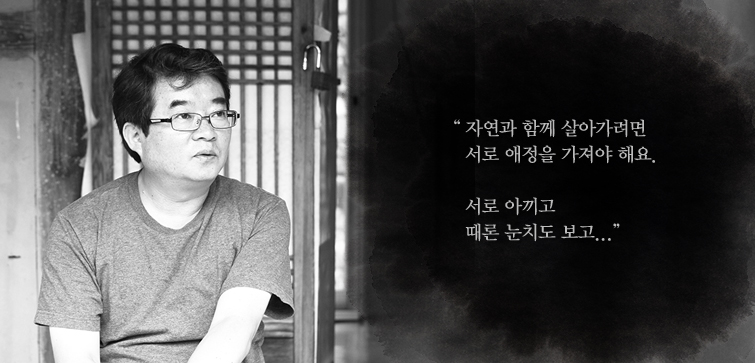
시인은 '자연과 함께 살려면 서로 돌봐주고 때론 눈치도 봐야 한다'고 귀띔합니다.
"예전에 처마 끝에 딱새가 집을 지은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문 밖에 나와 보니 아기새가 얼굴을 쏙 내밀었는데 주둥이를 벌리고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입을 벌린 채 죽었나? 했는데, 가만 보니 어미새가 모이를 물고 저 밖에서 내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곳에 숨었더니 금방 날아와서 아기새한테 모이를 주더라고요."
동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유난히 미소를 지었던 시인. 소박하고 단순한 삶이 좋다는 그의 생활은 자연과의 호흡 자체였습니다.
돌발질문 ㅣ 작가와 나누는 엉뚱문답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인가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기자 양반이 먼저 답을 해봐요. (기자가 답을 못하자) 어렵죠? 기자답게 말하기도 힘든데 내가 시인답게 이야기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웃음) 난 아무것도 할 일 없을 때, '멍 때릴 때’ 제일 좋아요. 요즘 누굴 만나면 ‘바쁘게 뭐 하다 왔다'는 사람보다 ‘할 일 없이 놀다 왔다’고 하는 사람이 더 좋아요. 요즘 사람들은 바빠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난 그게 싫어서 핸드폰도 안 갖고 다닙니다.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어떤 것인가요?
젊을 때는 '연두' 라는 말을 좋아했어요. 어감도 단아하고 예쁘고, 자연의 색이고. 요즘엔... '빈둥거리다'가 좋아요. 요즘 시를 안 쓰고 있어서 외부 청탁도 잘 안 들어오거든요. 정말 좋아요. 내 꿈은 그겁니다, 빈둥거리는 것.
하루 중 글이 가장 잘 써질 때는 언제인가요?
딱히 시간대는 없어요. 소설가들은 보통 밤에 많이 쓴다는데 난 밤엔 안 쓰고요. 술을 먹어야 하니까 (웃음). 수업하고 비는 시간에 틈틈이 써요. 아, 술이 완전하게 깬 상태는 유지해야 되요. 혈액 속 알코올 농도가 0.001%도 있으면 안 되고 정신이 맑을 때 글이 잘 써지죠. 여담으로 내가 학생들에게 시 창작 수업 첫 시간에 하는 말이 있어요. 시 잘 쓰려면 3가지를 잘하자, 많이 읽고 술을 많이 마시자, 그리고 연애를 많이 하자. 책상 앞에만 앉아있지 말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배우란 얘기예요. 그래야 시가 나오는 거죠.

시인은 '따뜻한 위로의 시'로 유명하지만,
정작 자신은 요즘 냉정하고 사회비판적인
시에 더 애착이 간다고 합니다.
"이제껏 쓴 시와는 좀 다르게 써보자는
의도로 2년 전 시집 『북항』을 냈죠.
독자들은 의외라는 반응이었어요.
'안도현이 변했다'하고.(웃음)
하지만 개인적으로 몹시 뿌듯했습니다.
내 시 중에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하는 시 있잖아요,
제일 많이 인용되는 시인데 아휴, 그게 뭐가 좋다고.
「스며드는 것」이라고 간장게장에 대해 쓴 슬픈 시도 요즘
많이 읽히나 본데, 저는 간장게장 잘 먹습니다.(웃음)
앞으로 좀더 강한 시를 쓰면서 다양한 작품으로
독자들을 만나고 싶어요."
정작 자신은 요즘 냉정하고 사회비판적인
시에 더 애착이 간다고 합니다.
"이제껏 쓴 시와는 좀 다르게 써보자는
의도로 2년 전 시집 『북항』을 냈죠.
독자들은 의외라는 반응이었어요.
'안도현이 변했다'하고.(웃음)
하지만 개인적으로 몹시 뿌듯했습니다.
내 시 중에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하는 시 있잖아요,
제일 많이 인용되는 시인데 아휴, 그게 뭐가 좋다고.
「스며드는 것」이라고 간장게장에 대해 쓴 슬픈 시도 요즘
많이 읽히나 본데, 저는 간장게장 잘 먹습니다.(웃음)
앞으로 좀더 강한 시를 쓰면서 다양한 작품으로
독자들을 만나고 싶어요."

- 글
- 김지현(디지틀조선일보 기자)
- 사진
- 이강훈(다큐멘터리 사진작가)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 작성일
- 2014-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