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작 대 영화
살아가야 할 자와 죽어가는 자의 그 아득한 거리

김훈의 소설은 모두 읽는다. 그의 ‘글’전부라고 해야 더 정확하다. 그는 신문기자 시절(한국일보 문화부)인 1980넌대 말 나의 사수였다. 2003년 여름 소설 「화장」을 읽었다. 그리고 12년이 지나 이 글을 쓰기 위해 다시 읽는다. 그때와 지금의 생각과 마음이 다르다. 지난 해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치료를 했다. 아직도 나의 삶은 그 긴 고통의 시간 위에 놓여있다. 임권택 감독은 20년 지기다. 기자 시절에 만나 촬영 현장에 함께 하면서 영화와 인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다른 감독보다 가깝고, 그의 마음과 ‘영화세계’를 잘 안다고 생각한다. 혼자만의 착각인지 모른다. 둘 다 못 만난 지 한참 됐다. 게으름과 무심 탓이다. 영화 <화장>을 보는 동안 마치 그것을 질타하듯 그들과의 추억이 화면 사이사이로 쉴 새 없이 끼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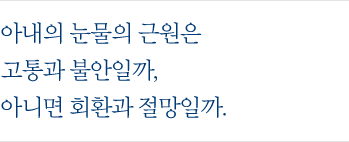
누군가에게는 ‘현실’이다.
그 누군가는 바로 ‘나’다.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던 날, 아내도, 나도 울었다. 군대에 간 아들도 전화 속에서 울었다. 이후 아내는 수시로 하염없이, 소리 없이 운다. 저 작은 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숨어 있는 걸까. 소설 「화장」에서도 MRI 사진으로 뇌종양 판정을 받던 날‘울음의 꼬리를 길게 끌어가며 아내는 질기게 울었다.’ 그러고 나서 아내는 “여보, 나 어떡해”라고, 「화장」의 아내는 “여보, 미안해”라고 했다. ‘어떡해’와 ‘미안해’의 정확한 의미를 나도, 「화장」의 오 상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둘 사이의 차이를 더더욱 알 길이 없었다.
항암주사를 맞고 머리가 모두 빠진 날도 아내는 모자를 눌러 쓰면서 눈물을 뿌렸다. 수술 전날, 머리카락을 자르게 간호사에게 머리통을 내맡긴 「화장」의 아내도 울었다. 그런 아내를 보며 그녀에게 사라진 머리카락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지만 알 수 없었다.
항암주사를 맞고 머리가 모두 빠진 날도 아내는 모자를 눌러 쓰면서 눈물을 뿌렸다. 수술 전날, 머리카락을 자르게 간호사에게 머리통을 내맡긴 「화장」의 아내도 울었다. 그런 아내를 보며 그녀에게 사라진 머리카락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지만 알 수 없었다.
아내의 눈물의 근원은 고통과 불안일까, 아니면 회환과 절망일까. 울음의 깊이는 얼마나 될까. 지천명을 지난 지 한참이 된 나로서도 도저히 알 수 없다. 설령 그 근원과 깊이를 안다 해도 내가 대신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 것도 없다. 아내가 그렇게 된, 그런 아내를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의 고통만 확인할 뿐이다. 이따금 숨쉬기조차 힘들어 아내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을 때조차도. ‘아내가 두통발작으로 시트를 차내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을 때에도 나는 아내의 고통을 알 수 없었다. 나는 다만 아내의 고통을 바라보는 나 자신의 고통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오 상무의 고백이 처절하고 처량하다.
영화 「화장」의 시선
임권택 감독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소설 「화장」을 그의 102번째 작품으로 선택했는지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안다고 해도 오 상무가 아내의 고통을 보고 자신의 고통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전통미가 물씬 풍기는 고전이나 문화가 그의 운명이고, 자랑이고, 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임권택의 영화 세계로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은 임권택 감독에게는 고통이고 속박이다. <서편제>가 임 감독이 좋아하는 시대물임을, 그것에 과장된 굴레를 씌워버린 것을 알지 못한다면, 영화 <화장>의 미덕도 알지 못할 것이다.
<화장>은 멀게는 <짝코>에서 <길소뜸>, <축제>로 이어지는 임권택 감독의 삶과 죽음, 운명에 관한 그의 시선이자 마음이다. 비록 그 삶과 죽음이 처연하고 처절하더라도 임권택 감독의 시선은 영화 내내 <서편제>의 명장면으로 억지 추켜세워진 ‘진도아리랑’을 부르는 롱테이크처럼 무심하다.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그 무심함은 소설 「화장」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소설과 화장(化粧)을 달리하고, 추은주(김규리)에 대한 오 상무(안성기)의 욕망과 환상을 강렬한 이미지와 구체적 행위들로 묘사했지만 영화 역시 살아가야 하는 자와 죽어가는 자의 아득한 거리 사이를 날카롭게 파고든다. 영화 <화장>은 죽어가는 아내(김호정)의 시선이 아닌 살아가야 할 자인 남편 오 상무의 불안, 고통, 공포, 절망, 고민, 포기 그리고 슬픔을 마치 일상인 것처럼 무심히 드러낸다. 그 일상적 무심함이 소설만큼이나 솔직하고 서럽다. 영화 역시 살아가야만 하는 자와 죽어가는 자의 접점을 찾지 못한다. 임권택 감독은 그것을 억지로, 과장해서 만들 생각이 없었다. 오 상무는 고통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과 그것을 감내해야 하는 마음 사이에서 방황하고, 아내는 자신의 냄새 나는 몸을 씻겨주는 남편에게 “미안해”하고 말하다가도 “내가 죽었으면 좋겠지”라고 소리친다.
<화장>은 멀게는 <짝코>에서 <길소뜸>, <축제>로 이어지는 임권택 감독의 삶과 죽음, 운명에 관한 그의 시선이자 마음이다. 비록 그 삶과 죽음이 처연하고 처절하더라도 임권택 감독의 시선은 영화 내내 <서편제>의 명장면으로 억지 추켜세워진 ‘진도아리랑’을 부르는 롱테이크처럼 무심하다.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그 무심함은 소설 「화장」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소설과 화장(化粧)을 달리하고, 추은주(김규리)에 대한 오 상무(안성기)의 욕망과 환상을 강렬한 이미지와 구체적 행위들로 묘사했지만 영화 역시 살아가야 하는 자와 죽어가는 자의 아득한 거리 사이를 날카롭게 파고든다. 영화 <화장>은 죽어가는 아내(김호정)의 시선이 아닌 살아가야 할 자인 남편 오 상무의 불안, 고통, 공포, 절망, 고민, 포기 그리고 슬픔을 마치 일상인 것처럼 무심히 드러낸다. 그 일상적 무심함이 소설만큼이나 솔직하고 서럽다. 영화 역시 살아가야만 하는 자와 죽어가는 자의 접점을 찾지 못한다. 임권택 감독은 그것을 억지로, 과장해서 만들 생각이 없었다. 오 상무는 고통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과 그것을 감내해야 하는 마음 사이에서 방황하고, 아내는 자신의 냄새 나는 몸을 씻겨주는 남편에게 “미안해”하고 말하다가도 “내가 죽었으면 좋겠지”라고 소리친다.

그래도 영화는 소설만큼 잔인하지 않다. 흥행을 생각해야 하는 영화적 계산이 아니라, 산 자와 죽은 자의 운명을 모두 사랑하는 감독의 마음이 작용한 탓이리라. 임권택 감독은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라는 딸의 질문에 “아픈 사람이 제일 힘들었지”라고 말하는 아빠와 낡은 지갑 속에서 남편의 옛 사진 한 장을 고이 간직한 채 떠난 아내, 그것을 보고 추은주와의 일탈과 욕망을 지워버리는 오 상무를 통해 끝내는 산 자 자와 죽은 자를 ‘사랑’으로 연결해준다. 그래서 더 애잔하다. 영화 <화장>은 늦은 밤 병실로 돌아와 고통과 죽음과 사투를 벌이며 울부짖는 아내를 안아주는, 회식 후에 추은주를 다시 만나러 술집으로 돌아가다 ‘이게 뭔가’ 싶어 도중에 택시에서 내려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는, 마지막 아내가 남긴 낡은 지갑에서 자신의 사진을 보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맨발로 걸어가는 오상무의 연민, 자괴감, 회한의 눈빛으로 모든 것을 말해준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가 아니면 불가능했으리라. 안성기의 말없는 그 눈빛이 오래도록 남는다.
소설 「화장」을 다시 읽으면서, 영화 <화장>을 보면서 아프고, 슬프고, 부끄러웠다. 어쩌면 소설과 영화의 감정과 언어들이 내 것과 닮았을까. 그 현실감이 섬뜩하다. 오늘도 아내는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폐에서 발견된 이상징후로 소파에 기대어 ‘가늘고 희미하게’ 한참을 울었다. 그런 그녀의 고통과 불안 속에 들어가지 못한 채 오 상무가 그랬던 것처럼 “여보, 울지 마…… 내가 있잖아”라고 말했다. 있어서 뭐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인가. 눈물이 난다.

소설 「화장」의 무심한 언어들
암 판정을 받고 아내와 나는, 의사의 자신감과 통계를 인용한 낙관에도 불구하고 생존보다는‘죽음’을 먼저 생각했다. 암이란 그런 존재이다. 살아있는 생명체에만 달라붙는 그 놈은 공존(共存)을 모른다. 공사(共死)를 위해 맹렬하게, 악착같이 자신의 몸집을 불린다. 그 놈이 가진 그 죽음의 냄새 앞에서 아내도 나도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그러나 같은 불안과 공포도 아내와 나의 것은 너무나 달라 섞일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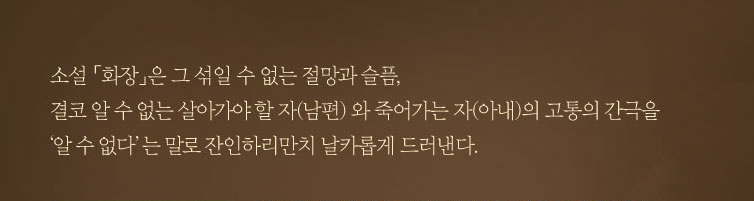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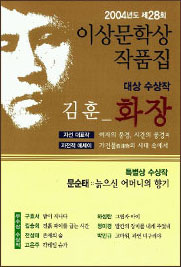
△ 소설 「화장」
오 상무는 생명현상은 그 개별적 생명체 내부의 현상이기 때문에 생명에서 생명으로 건너갈 수 없어, 아내의 고통과 나의 고통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 수 없었고, (아내의) 죽음은 가까이 있었지만 얼마나 가까워야 가까운 것인지 알 수 없었고, 닿을 수 없는 것(여직원 추은주)들이 왜 그토록 확실히 존재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 ‘무지(無知)’야말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다. 소설 「화장」은 암으로 죽어가는 자(아내)와 그 죽음을 몸으로 감당해야 할 자 (남편)의 아득한 거리에 관한 슬픈 이야기이다. 김훈은 그 슬픔을 턱없는 동정 이나 연민, 사랑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수술이 끝나고 오 상무는 아내가 이제 그만 죽기를 바랐다. 그것만이 나의 사랑이고, 진실일 것이라고 까지 했다. 이런 솔직한 내면을 고백하는 언어들이 차갑고 날카롭다. 그래서 더욱 현실로 다가오고, 슬프다.
소설 「화장」에서 죽음과 고통, 슬픔은 시각적이고 청각적이다. 죽음을 알리는 심전도 계기판의 삐삐 거리는 소리, 가파르게 드러난 치골, 배터리가 끊겨 휴대폰이 죽는 소리, 질긴 아내의 울음, 전립선이 부어 요도에 호스를 꽂고서야 쪼르륵 쪼르륵 오줌이 떨어지는 소리, 아내와 닮아있는 딸의 어깨의 둥근 곡선과 힘없어 보이는 잔등이 염이 끝나 긴 나무토막처럼 보이는 아내의 몸, 희고 가벼워 보이는 흩뿌려진 뼈 조각들이 무심하다. 그 세밀한 무심함이 무섭고 서럽다.
소설 「화장」에서 죽음과 고통, 슬픔은 시각적이고 청각적이다. 죽음을 알리는 심전도 계기판의 삐삐 거리는 소리, 가파르게 드러난 치골, 배터리가 끊겨 휴대폰이 죽는 소리, 질긴 아내의 울음, 전립선이 부어 요도에 호스를 꽂고서야 쪼르륵 쪼르륵 오줌이 떨어지는 소리, 아내와 닮아있는 딸의 어깨의 둥근 곡선과 힘없어 보이는 잔등이 염이 끝나 긴 나무토막처럼 보이는 아내의 몸, 희고 가벼워 보이는 흩뿌려진 뼈 조각들이 무심하다. 그 세밀한 무심함이 무섭고 서럽다.
- 글
- 이대현_영화평론가. 1959년생저서 『15세 소년, 영화를 만나다』, 『열일곱, 영화로 세상을 보다』, 『영화로 소통하기, 영화처럼 글쓰기』 등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 작성일
- 2015-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