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 책을 읽다
누가 내 메뉴를 골랐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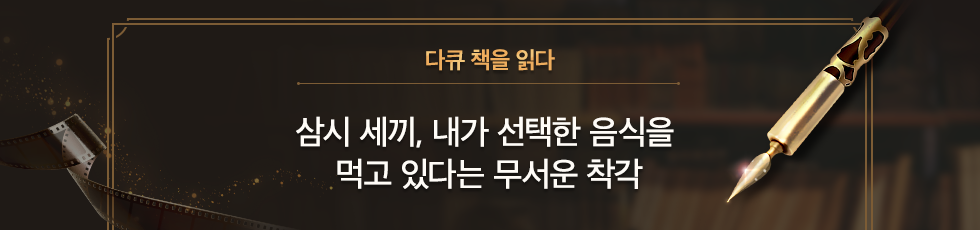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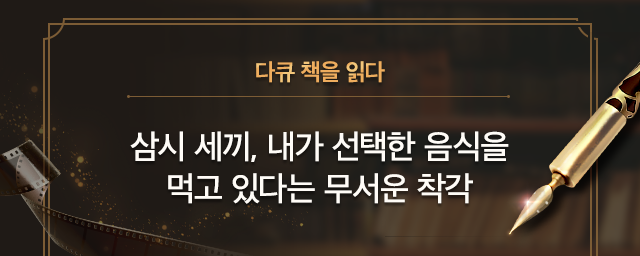

사람은 살기 위해 먹는 걸까, 먹기 위해 사는 걸까?
쉽게 답할 수 없는 이 질문엔 적어도 ‘먹는 것’이 늘 우리의 화두라는 사실이 담겨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음식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우리.
“하루에 세 끼밖에 못 먹는데 이왕이면 맛있는 거 먹어야지!”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건강과 행복을 위해 좀 더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오늘 내가 먹은 메뉴를 내 의지대로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모두의 식탁이 비슷해지고 있다!


인류는 빵에 길들여졌을 뿐이다?
인류에게 있어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음식은 빵이었다. 수천 년 동안 유럽과 서남아시아의 주식은 밀과 보리였고, 곡물의 대량재배로 빵이 만들어지면서 인류는 고녹말 식단에 당연하게 길들여졌다. 즉, 인류가 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필요충족 조건에 의해 빵에 인류가 길들여진 셈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 수많은 먹거리가 넘쳐나는 요즘, 메뉴 선택은 결정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힘든 일이 됐고, 어떤 음식을 먹을지는 이제 전 세계인의 공통적인 고민거리가 되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내가 먹을 음식을 스스로 제대로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 대형 다국적 농업 기업에 의해 생산되는 동일한 식재료만이 우리들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시대, 결국 우리는 그 안에서만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
우리의 먹거리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손’
바나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형태의 바나나를 떠올린다. 그런데 바나나의 품종은 원래 100여 가지나 된다. 그 중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영양과 맛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저항성이 강하고, 운송과 저장이 수월해 작물로 재배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선택된 것뿐이다. 문제는 단일 작물 경작의 경우 살충제를 비롯한 화학물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해마다 같은 땅에 동일한 작물을 재배하다 보니 해당 작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빠르게 고갈되어 화학물질로 영양분을 보충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기업농 시스템의 지배 아래 재배된 대량의 식재료들이 획일적으로 전 세계 곳곳의 대형 마트에 납품되고, 우리는 그 경제 논리에 의해 이미 한 번 걸러진 식재료들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먹는 모든 것을 의심하라!


건강 정보에 쉽게 현혹되지 말 것
메뉴도 유행을 타는 시대, SNS를 비롯한 여러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맛집이나 소위 핫한 메뉴들은 우리의 메뉴 선택의 폭을 좁히며 갈수록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메뉴를 선택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수많은 먹거리만큼이나 쏟아져 나오는 각종 건강 정보에 현혹되는 우리들. 그 중 하나가 바로 하루에 물을 여덟 잔 이상 마시라는 것이다.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시라는 최초의 연구가 물을 생산하는 한 회사의 자금 지원을 받은 것이었다면 어떻겠는가. 물론 이후 여러 입증을 통해 전 세계적인 캠페인으로 자리잡긴 했지만 과연 그 시작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정녕 인류의 건강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영국의 철학자 마틴 코언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먹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먹는 것은 곧 삶과 맞닿아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빠르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범람하는 사이 무의식 중에 각종 조미료와 방부제에 노출되고 있는 우리. 때때로 우리는 좋아하지도, 영양이 풍부하지도 않은 음식으로 한끼 식사를 해결하곤 하는데, 소중한 우리의 삼시 세끼를 적어도 내가 지금 무엇을 먹는지, 왜 먹는지 정도는 알고 먹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고른 음식이 나를 결정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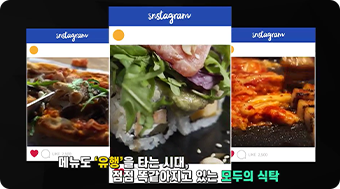
<식사에 대한 생각> 비 윌슨 저 / 어크로스
-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 작성일
- 2021-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