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작 대 영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깊이 있는 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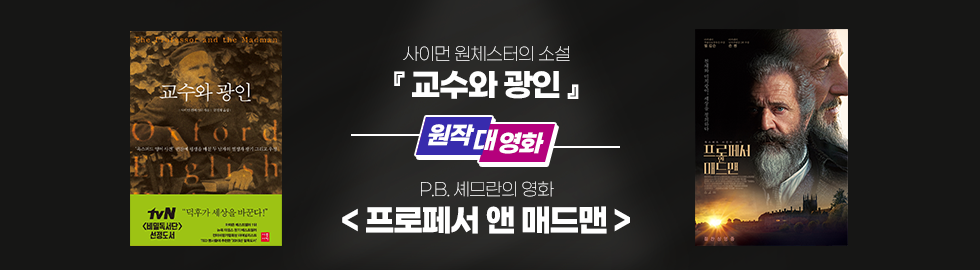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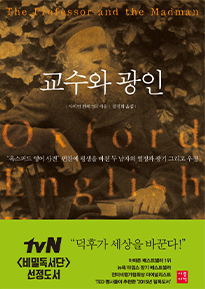 VS
VS 
역사라고 모든 것을 기록할 수는 없다. 때론 시간을 건너뛰기도 하고, 산맥만을 좇다가 골짜기에서 강으로 흘러가는 작은 물줄기를 지나치기도 한다. 그래서 역사가 써놓은 담담한 한 문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삶이 스며있다. 흔적이 희미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의 소중한 역사이다.
역사에 메마른 채 남아있거나, 큰 물줄기만 따라가다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려둔 것들을 어떻게 불러내고, 기억해야 할까. 두 가지 길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작은 단초를 가지고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사실’을 꼼꼼히 찾아내 기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상력으로 끊어진 시간과 사람들을 되살리는 것이다. 전자는 역사와 저널리즘의 몫이고, 후자는 문학과 예술의 역할이다.
영국의 위대한 유산인 『옥스퍼드 영어사전』 편찬사의
현장으로 되돌아간 사이먼 윈체스터의『교수와 광인』은 영국 속어사전 편찬의
권위자인 조너선 그린이
자신의 책에 쓴 한 문장에서 출발했다.
‘봉사자 중에 정신병에 걸려 살인을 저지르고
수용된 윌리엄 마이너가 옥스퍼드 사전 편찬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윈체스터는 이 단조롭고 거친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시작해 70년의 세월을 거쳐 20세기에야 완성한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인물인 언어 천재 제임스 머리 교수와 미친 살인범으로 독서광인 미국인 의사 윌리엄 마이너의 땀과 열정, 비극적 삶과 우정의 실체들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정부 비밀문건으로 분류된 서류들을 들춰보고, 기사와 증언 등을 토대로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했다.
생생한 사실의 기록
『교수와 광인』은 상상이 아니라, 사실의 기록이다. 14세 때 학교를 그만둔 제임스 머리가 옥스퍼드 사전 편찬을 맡게 된 배경에서 호소문을 통해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단어와 예문을 수집하고, 우연히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마이너가 엄청난 도움을 주고, 그것을 계기로 천재와 광인의 기이한 만남과 우정이 이뤄지는 과정을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딱딱하고 지루하고 메마른 서술이 아닌 스토리텔링으로 담았다.

그의 문장은 마치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들을 목격이라도 한 듯 세밀하고 생생하다. 마이너가 강박증에 쫓겨 런던 거리에서 엉뚱한 남자(조지 메리트)를 총으로 죽인 날 밤의 서술부터 그렇다. ‘네 차례의 총성은 축축한 밤공기 속으로 엄청나게 크게 울려 퍼졌다. …… 타란트 경관 일지를 보면 사건 발생 시간은 시계가 막 2시를 쳤을 때였다. 자정에서 오전 8시까지 근무해야 했던 그는 주인들이 문을 닫고 들어간 상전의 자물쇠를 흔들어 보기도 하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가 지겹다는 욕설을 내뱉으면서 워털루역 부근 고가다리를 천천히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서술은 곳곳에 있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이 아닐지 모르지만 당시 사건일지나 진술서, 편지와 강연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하고 있으니 허구라고 할 수 없다. 표현과 전달 방식이 다를 뿐이다. 『교수와 광인』도 때론 시간과 시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지는 못한다. 제임스 머리 교수가 사전 편찬을 시작하면서 ‘approve’란 단어의 17, 18세기의 예문을 어디에서도 찾지 못하듯이. 그렇다고 제멋대로 단정하거나 상상하지 않고 앞뒤의 ‘사실’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추론으로 메운다. 정신병원을 찾아간 머리 교수가 마이너와 나눈 대화의 내용, 마이너의 강박증과 망상과 편집증의 원인, 그 결과 스스로 끔찍한 거세까지 자행한 이유가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명화된 현대 세계의 공통어가 된 영어의 확고한 길잡이며 전형’인 사전 편찬의 파란만장한 70년사와 함께 사전과 단어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까지 해박한 지식과 다양한 자료를 통해 새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교수와 광인』은 지적 호기심과 만족을 주기에 충분하다. ‘사전은 언어 사용법 안내 책자가 아니다.’ ‘좋은 어휘, 나쁜 어휘를 가름해서 사전에 실을 어휘를 선택하는 일은 사전 편집자가 할 일이 아니다.’ ‘사전 편찬자는 역사가이지 비평가가 아니다.’

여기에 여느 소설보다 더 극적인 극단의 두 인물, 어쩌면 백지 한 장 차이에 불과할지 모르는 한 천재와 광인의 파란만장한 인생사까지 더했으니 영화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재료가 어디 있으랴. 원작을 그냥 따라만 가도, 시간을 따라만 가도 흥분과 긴장이 있으니 ‘땅 짚고 헤엄치기’가 아닌가. <샤인>의 데이비드 헬프갓이 그랬듯이.
과감한 상상력을 더하다
P.B. 셰므란 감독의 <프로페서 앤 매드맨>(원제: The Professor and the Madman)은 그러나 ‘땅 짚고 헤엄치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얕은 강가에서 벗어나 깊은 강물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원작이 ‘사실’에 갇혀 건져 올리지 못한 이야기들을 상상력으로 더하고, 과감하게 ‘사실’까지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게 변주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게중심도 교수인 머리(멜 깁슨 분)와 광인인 마이너(숀 펜 분), 특히 인간 마이너로 옮겼다.
소설적 구성과 문체에도 불구하고 『교수와 광인』은 중간중간 언어와 사전에 대한 지식과 역사 서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바람에 인물들의 이야기가 끊어진다. 반면 영화는 독자적인 상상과 변주로 인물들을 단순히 한 사건(사전 편찬)에 묶어두지 않았다. 인물들을 보다 입체화하고 그들의 삶의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극적인 설정과 전개를 가능하게 했고 울림을 크게 했다.

그렇다고 사전 편찬이라는 가장 중요한 주제의 의미와 가치를 팽개치거나 소홀히 하지도 않았다. 머리 교수에게 이런 대사도 만들어 주었다. “단어는 처음으로 탄생한 후 세월을 타고 구불구불한 길을 내려옵니다. 단어의 뜻은 더해지고 덜어지면서 원래의 의미에서 미묘하게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흔적을 남기죠. 드넓은 문학 작품의 세계에 남아 있습니다.”
상상과 변주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현실감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페서 앤 매드맨>은 등장인물에게 '사실’과 다르지만, ‘영화라면 얼마든지 상상 가능하다’고 받아들이고, 또 그러기를 바라는 선택과 관계를 만들고, 그것을 배우들이 빼어난 연기로 표현하면서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야기를 더 풍성하고 흡인력 있게 바꾸었다.
상상을 통해 깊어지는 역사
영화에서 일라이자(나탈리 도머 분)는 남편 조지의 무고한 죽음이란 ‘비극이 주는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술에 빠져 사는’ 여자가 아니다. 아이 여섯을 키워야 하는 가난하고 애처로운 여자, 분노와 미움에서 벗어나 죄책감에 군인연금을 보내주고, 문맹인 자신에게 글을 가르쳐 주려는 마이너를 용서하고, 마침내 그를 사랑하게 되는 비련의 여인이 되었다.

원작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은 머리 교수의 아내인 에이다도 ‘사실’을 떠나 남편의 사전 편찬을 위해 용기 있게 위원회에 나가 호소를 하고, 인간적으로는 마이너의 상처와 아픔,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여자가 되었다. 상투적이지만 정신병원 원장과 언어학자에게 악당 역할도 맡기고, 정신병원 간수인 먼시는 마이너의 말 없는 조력자가 된다.
단순히 역할만 맡긴 것이 아니다. 겨우 글자를 익힌 일라이자가 마이너에게 처음으로 직접 쓴 ‘만약 사랑이라면…… 어쩌죠? (if love…… then what?)’란 단 4단어의 짧은 편지, 그것에 대한 에이다의 조언 역시 ‘사랑이라면, 사랑하세요! (if love, the love!)’란 4단어, 일라이자의 편지를 읽고 “그(조지)의 사랑, 그의 아내를 내가 훔친 거야”라고 울부짖고는 죄책감에 스스로 자해(거세)까지 하는 마이너. 마이너가 일라이자에게 들려주는 자비와 은총을 담은 ‘마음이 하늘보다 넓으니 마음과 하늘을 나란히 놓으면 마음이 하늘을 담으리’로 시작하는 한 편의 시. 그들의 표정 하나, 말 한마디가 가슴까지 저릿하고 울컥하게 한다.
<프로페서 앤 매드맨>은 이렇게 새 이야기를 쓰듯역사에 비극적 사랑과 아픔, 용서와 연민을 매력적으로 그려 넣었다. 어차피 영화는 ‘사실’만을 고집해도 안 되고, 고집할 수도 없으니까. 어쩌면 우리도 ‘숨어 있던 사실’이기를 바라고 있는지 않을까.역사라는 것도 일부분은 그렇게 흘러가고 기록되는 건지도 모른다.

언론인, 영화평론가, 1959년생
저서
『영화로 소통하기. 영화처럼 글쓰기』 『소설 속 영화,영화 속 소설』 『내가 문화다』 『유어 낫 언론』 등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 작성일
- 2021-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