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인문학Q
높은 관직에 올랐던 조선시대의 장애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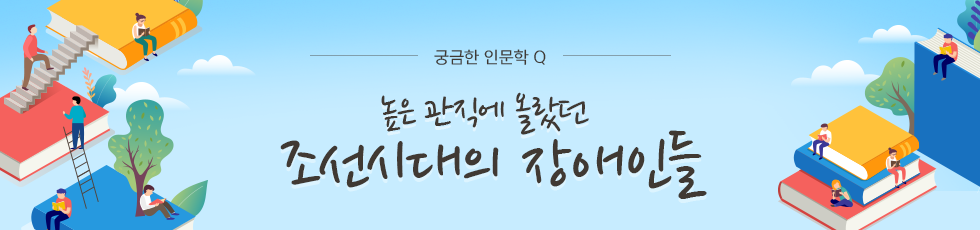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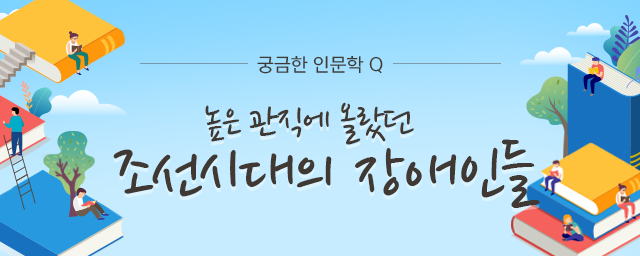
“진실로 나의 사심 없는 신하이고, 나의 충신이다” 조선시대,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탄생한 임금 영조는 당쟁의 폐해를 지적하며 다양한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탕평책을 실시했다. 영조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고, 정조를 불러 후견인으로 한 신하를 지목했했는데, 그는 채제공이었다. 채제공은 남인 계열이었지만, 당파를 뛰어 넘고자 하는 탕평의 의지를 지니고 있었기에 영조는 그를 특별히 신임했다. 그리고 정조가 왕위에 오른 후 10여 년간 재상 자리에 있으면서, 당파에 휘둘리지 않고, 사노비 혁파, 수원화성 축조 등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런데 채제공의 초상화를 살펴보면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양쪽의 눈동자가 초점이 맞지 않고 다른 곳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채제공은 심한 사시였으며, 이로 인해 결국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시각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채제공이 조선 최고의 정승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영상을 보시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재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재생이 안 될 경우 FAQ > 멀티미디어 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의 장애는 한계나 극복의 대상이 아닌 질병>

잔질(殘疾), 폐질(廢疾), 독질(篤疾).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조선시대에 장애를 일컫던 말이다. 잔질이란, 몸에 남아 있는 병, 폐질이란, 고칠 수 없는 병, 독질이란, 매우 위독한 병을 뜻하는데, 이는 장애를 병, 특히 고치기 힘든 고질병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장애를 한계나 극복의 대상이 아닌, 단순한 질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능력만 뛰어나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조선의 역사에서 높은 관직에 오른 장애인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선조 때 영의정을 지닌 이원익은 키가 작은 왜소증 장애인이었고, 숙종 때 우의정을 지낸 윤지완은 한쪽 다리를 잃은 지체장애인이었으며, 영조 때 영의정을 지낸 김재로는 곱사등이, 즉 척추장애인이었다.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채제공의 벼슬살이가 조선시대에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다.
<장애인에게 진보적인 복지정책을 펼쳤던 조선시대>

게다가 장애를 갖고 있는 임금도 여럿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종이다. 세종은 안질, 즉 시각장애로 고생했다. 35세 때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45세부터는 조금만 어두워도 지팡이에 의지해 걸어야 했는데, 이는 오늘날 시각장애 2급 정도로 추정된다. 당시 시각 장애인들은 점을 쳐서 미래를 예언하는 ‘점복가’, 경문을 낭송하여 악귀를 퇴치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독경사’,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누구보다 시각장애의 고통을 잘 알고 있던 세종은 ‘점복가’를 위한 관직으로 ‘명과학’을, ‘독경사’를 위한 단체로 ‘명통시’를, ‘악사’를 위한 관직으로 ‘관현맹인’을 설치하는 등,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이처럼 조선에서는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움을 주었으며, 자립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구휼을 베푸는 등 진보적인 복지정책을 펼쳤다.
이는 유교적 재이관(災異觀)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 왕들은 백성을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보살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의 원망이 하늘에 닿아 가뭄이나 홍수, 지진,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생각했다. 훌륭한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늘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생존에 취약한 장애인들을 보살펴야 했던 것이다.
<’무언가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변해버린 장애라는 인식>

하지만 근대에 이르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다. ‘잔질, 폐질, 독질’ 대신 ‘불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말은 ‘후쿠샤(不具者)’라는 일본어에서 온 말로 ‘무언가를 갖추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다. 이때부터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 즉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게 된 것이다. 장애에 대한 생각이 변하자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국가의 지원정책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장애인은 더 이상 관직에 오를 수 없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장애인의 직업이 급속히 사라진 것이었다.
1914년 5월 20일, <매일신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경성의 한 순사가 새벽에 순찰을 돌던 중 어떤 집에서 북을 두드리며 소리를 높여 읽는 소리가 요란하여,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장님 3명이 경을 읽고 있었다. 조사 결과, 집주인이 1년 내내 집안이 태평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님에게 독경을 의뢰한 것이었다. 순사는 이들을 경찰서로 잡아다가 즉결처분으로 볼기 다섯 대씩 때리며 엄하게 훈계하고 풀어주었다.
그렇다고 해서 일제가 장애인들의 복지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일제는 1913년 제생원 맹아부를 설립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침술과 안마 위주의 직업교육을 실시했다. 그리고 침사, 안마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졸업과 동시에 면허증을 발급해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 정책의 실제 효과는 미미했다. 당시 조선에는 1만 명이 넘는 시각장애인이 있었지만, 제생원 맹아부의 정원은 수십 명으로 그 숫자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결국 제생원 맹아부는 일제가 식민지 장애인의 복지에도 힘쓰고 있음을 홍보하는 수단에 그치고 말았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삶은 어떨까? 2018년 복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은 258만 6천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5%에 해당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7%에 불과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10명 중 7명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실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과연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는 장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조선시대 사람들처럼 단순한 질병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일제와 같이 능력이 부족한 불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참고도서] <근대 장애인사>, 정창권, 사우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 작성일
- 2019-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