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그림 산책
일출(日出), 빛과 색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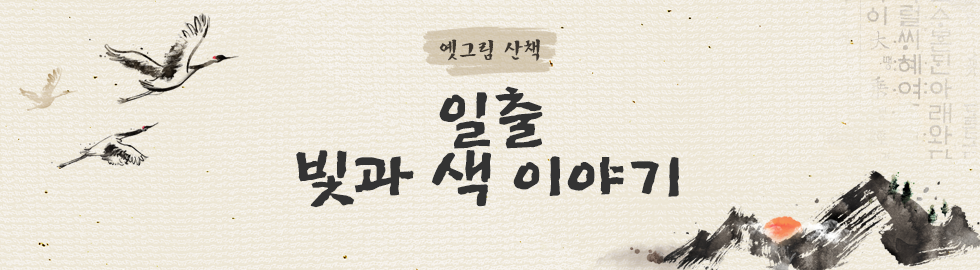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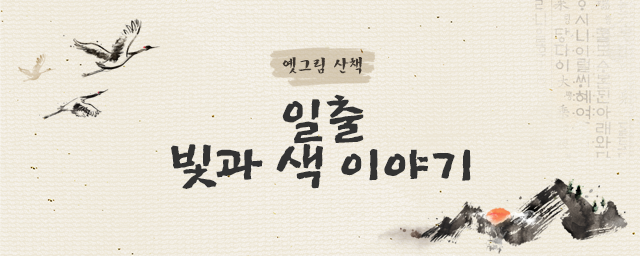
색(色)이 분별되는 시간, 일출
그런데 유럽의 철학사에서는 뉴턴의 광학에 대항하는 철학자들의 이론이 이어졌다. 괴테(1749~1832)가 『색채론』(1810)에서 뉴턴의 광학을 비판하는 「논쟁편」을 따로 두어, 색채는 빛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시각(視覺)에 의거한다고 주장했다. 쇼펜하우어도 『시각과 색채에 관해서』(1816)에서, “그(뉴턴)는 눈에서 찾아야 할 것을 빛에서 찾았다”라고 논박했다. 여기서 오래된 말 ‘변색(辨色)’을 다시 보게 된다. ‘辨(분별하다)’이라고 했으니, 색을 분별하는 주체는 사람, 즉 사람의 눈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말했기 때문이다. 요체로 말하자면, ‘빛’이 있고 또한 우리의 ‘시각’이 있어야 ‘색’이 존재한다. 빛이 나타나고 만 가지 색이 분별되는 시간은 일출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다. 또한 이 시간을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것이 ‘관일출(觀日出)’일 것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일출의 장관을 보지 못하고 매일의 일출을 맞이한다. 어둠을 몰아내며 빛이 떠오르는 순간이 매일매일 어김없이 발생하기에 그 감동을 잊고 지낸다. 그러다 문득 새해 새 빛이 떠오르는 날이 되면, 어둠에서 빛이 떠오르는 시간을 몸소 느껴보고자 행장을 꾸려 추위를 무릅쓰고 동해 바닷가로 떠나보는 사람들이 있다.
동해의 장관, 일출
우주의 모습을 몰랐던 오래전, 새벽마다 떠오르는 둥근 해는 신비로운 현상이었다. 희화(羲和)라는 여신이 여섯 마리 용이 끄는 수레에 태양을 싣고 용을 몰아 공중을 달려 서쪽 끝 우연(虞淵)이란 못에 이르러 멈춘다는 이야기가 『산해경(山海經)』에 실려 있다. 태양수레를 상상한 동아시아 신화는 그리스 신화와 유사하다. 조선의 문인들도 해가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여섯 마리 용이 떠받들어 올린다는 시구를 상투적으로 남겼다. 앞서 걷어차인 김종직도 해가 물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며, “불덩이 수레바퀴 갑작스레 굴러 파도 물 위로 솟아오르네[火輪忽輾波濤出]”라고 해 뜨는 장관을 묘사했다. 조선후기의 그림으로 넘실넘실 파도 위로 빨간 해가 떠오르는 장면이 여러 폭 전하고 있다. 이를 잘 그린 화가는, 이른바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의 대가로 이름이 높은 화가 정선(鄭敾, 1676~1759)이었다. 그 당시 한양의 일부 문인 그룹에서 금강산 유람의 열풍이 불었고, 정선은 마침 이들과 한 동네에 살면서 그림 솜씨로 인정받은 터라, 그들의 유람여정을 그림으로 그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정선이 그린 산수화들은 유람한 문인들에게 여정의 기억이었고, 유람을 떠나려는 문인들에게 필수 코스의 조망지점이었다. 그 가운데 일출 그림은 낙산사(洛山寺)와 문암(門巖)에서의 일출이었다. 문인들도 이곳의 일출을 시문에 남겼다.

그림 1_정선, 《신묘년 풍악도첩(辛卯年楓嶽圖帖)》
중 <문암관일출>, 견본담채(絹本淡彩), 36.0x37.4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2_정선, <문암관일출>, 견본담채(絹本淡彩), 25.5x33.0cm, 간송미술관 소장
그 당시 유람 선비들은 풍경의 기이함을 찾아다니는 일종의 탐색가들이었다. 이곳저곳을 비교하여 품평하고 더욱 멋진 곳이 어디인가 논하여 순서를 정했다. 금강산을 포함하는 관동유람이 최상급이었고, 문암의 일출은 그들의 기관(奇觀) 목록에 오른 선택된 풍경이었다. 김창흡의 형이면서 한국철학사에서 위치가 우뚝한 학자 김창협(金昌協)이 쓴 「동유기(東遊記)」를 보면 문암 일출 앞에서 다 함께 소리 지른 기억을 기록했다. “해가 떠오르자 노비들까지 모두 크게 소리 지르며 멋지다[奇]고 하는데, 구름 어린 곳의 광채(光彩)로 더욱 기이해졌다[益奇].” 장관의 요체 중 하나는 바다와 하늘로 번지는 붉은 광채, 빛과 색의 어울림이었다. 정선과 함께 금강산을 오른 이병성(李秉成, 1675~1735)은, ‘붉은 구름 만 떨기가 바다의 동쪽으로 몰려들고, 상서로운 빛이 번쩍번쩍 길을 열었네[紅雲萬朶海東來, 瑞彩煌煌一道開]’라 하였다. 정선은 그 감동의 색을 위와 같이 표현했고, 정선의 그림은 당시 선비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다.
삶의 의미로 보는, 일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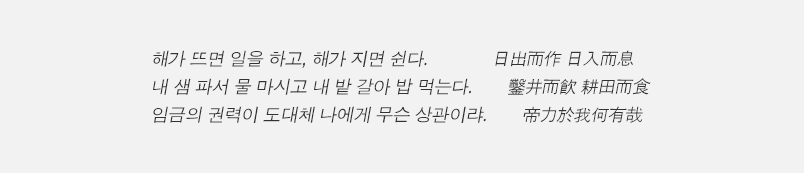
그런데, 일출의 평화에서 일몰의 평화가 이어지는 그 시간마저도 개인에게는 영원할 수 없다. 동해의 일출을 바라보며 다가오는 일몰을 재미있게 노래한 조선시대 시가 있어 소개한다. “나는 일출 보기를 좋아하지, 일몰은 차마 보기 어려워. 해가 지면 어찌나 외롭고 슬퍼지는지. 내 머리가 다 하얗게 될 거야. (중략) 내가 동해바다를 술로 만들어 따르며 하얗게 빛나는 태양이 천년만년 있으라고 축원할 거야. 한 번 취하여 시름을 달래기를 만 번을 한다면, 시름은 없어지고 나도 늙지 않겠지.”
이 시의 지은이는 홍여하(洪汝河)로 17세기 대학자요 문장가였다. 요 근래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치매에 덜 걸린다는 의학계의 학설이 발표되어 세간에 인기를 누렸다. 스트레스가 주는 뇌 건강의 심각성을 생각하게 하는 학설이었다. 이 선비는 동해의 바닷물을 술로 만들어 모든 시름을 다 몰아내고 심신의 젊음을 연속시키고 태양도 바다로 다시 들여보내지 하겠다고 한다. 취기(醉氣) 속 호언장담이 서글프다. 시간의 흐름과 몸의 늙음과 뇌가 아둔해짐은 피할 수 없다. 춘추시대 슬기로운 악공이 늙어가는 주인을 세워준 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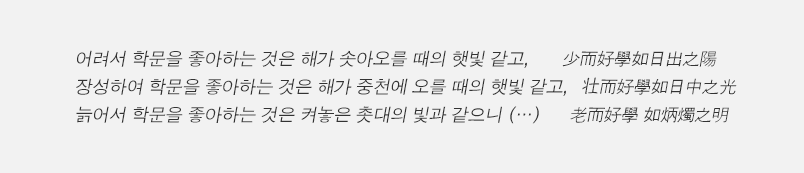

정선, <낙산사(洛山寺)>, 종이에 옅은 색, 56.0x42.8cm, 간송미술관 소장
낙산사의 일출과 문암의 일출이 가장 명성이 높아 정선이 이를 그렸다. 배꽃이 하얗게 핀 낙산사의 봄, 새벽에 해가 돋는 장면이다.
1965년생,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저서
『정선 : 눈앞에 보이는 듯한 풍경』
『선비의 생각, 산수로 만나다』
『그림, 문학에 취하다』
『꽃과 새, 선비의 마음』
『화상찬으로 읽는 사대부의 초상화』
『조선시대 산수화』 등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 작성일
- 2019-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