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시
어머니가 보내오신 따뜻한 겨울 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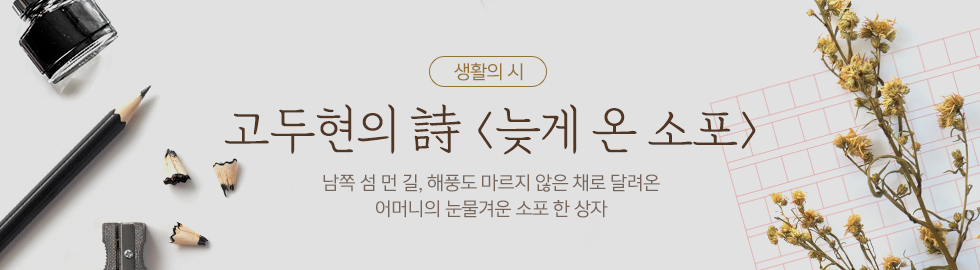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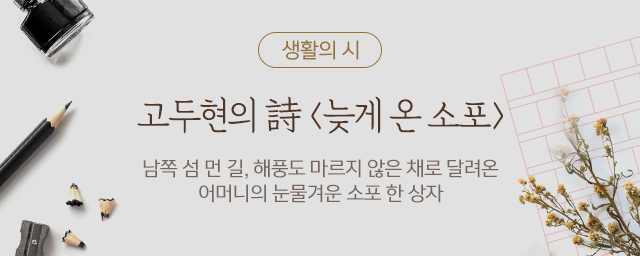
-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영상을 보시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재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재생이 안 될 경우 FAQ > 멀티미디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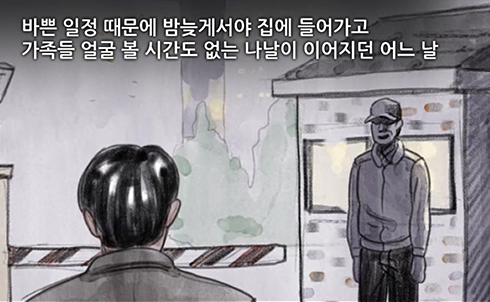

늦은 밤, 시골에서 도착한
묵직한 택배 상자 하나
“내는 신경 쓰지 마라, 근데 왜 목소리에 힘이 없노? 한참 날씨가 춥다카드만 감기 걸린 거 아이가?”
연말이라 챙겨야 할 모임도 많은 데다가, 회사 상황도 여의치 않아 이번 겨울에는 고향집에 내려가기 어렵겠다고 어머님께 말씀드렸다. 마음 같아서야 아내와 애들만이라도 보내고 싶었지만, 아내도 회사일로 바쁘고, 애들은 곧 스키캠프 시작이라고 들떠있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바쁜 일정 때문에 밤늦게서야 집에 들어가고 가족들 얼굴 볼 시간도 없는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다. 늦은 시간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서는데 순찰을 돌던 경비 아저씨와 마주쳤다.
“705호 맞죠? 택배 안 찾아갑니까?”
그 전에 택배가 하나 왔다는 연락을 하나 받긴 했는데 아내에게 챙겨놓으라는 말을 깜박하고 지나온 것이다.
“도착하는 물건들 여기 쌓아놓으면 대부분 저녁때 다 찾아가요. 근데 그 댁 물건만 며칠째 여기 있더라고. 시골에서 뭘 잔뜩 올려보낸 것 같은데, 금방 안 먹으면 상하는 거라도 들어있으면 어쩌려고 그러나?”


직접 기른 채소들을
가득 채워 보내신 나의 어머니
시골에서 온 것 같다는 그 택배는 어머니가 보내신 것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도 상자 크기에 비해 넘치게 담은 내용물이 느껴졌다.
“아, 뭘 또 이런걸 보내신 거야.”
나는 무거운 상자를 겨우 안아들고 집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가족들이 깰까봐 조심조심 상자를 내려놓았다. 상자를 열어보니 역시나 어머니가 밭에서 심고, 캐고, 다듬고 한 것들이 들어있었다.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나와 동생네는 트렁크 가득 어머니가 기른 배추며 상추며 각종 채소와 구하기도 힘든 시골 된장, 고추장을 얻어오곤 했는데 이번에 못 내려간다는 연락을 받고는 곧장 챙겨 보내신 것이었다.
“시장에서 그냥 사서 먹으면 되는 걸. 몇 푼이나 아낀다고 이 고생을 하시는지.”
관절 수술도 몇 차례 받으신 터라 걱정되는 마음에 그렇게 말렸는데도 어머니는 소일거리 하는 일이니 괜찮다 고집을 부리시며 아직도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새벽같이 밭으로 나가셨다.


택배 상자에 담겨
먼 길을 달려온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상자에 들어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는 내내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괜히 속이 상했다. 그러다 내 뭉뚝한 손끝으로 잘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묶여있는 봉지 하나에 짜증이 일었다.
“이건 뭔데 이렇게 꽁꽁 싸놓으신 거야?”
결국 성질을 부려 마구잡이로 봉지를 뜯었다. 속에 것을 꺼내 보니 유자였다. 어린 시절 감기를 앓을 때마다 어머니는 집에서 만든 유자청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었다. 그걸 마시고 한숨 푹 자고 나면 이내 툴툴 털어버리고 가뿐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 계속해서 맹렬한 추위가 이어진다는 날씨 예보에 감기라도 걸리면 달여 마시라고 챙겨 보내신 모양이었다.
<봄 볕치 플리믄 또 조흔 일도 안 잇것나 어렵더라도 참고 반다시 몸만 성키 추스르라. 큰 집 뒤따메 유자가 잘 댓다고 몃 개 따서 넣었다 춥을 때 다려 먹고…>
나는 택배 상자에 담겨 먼 길을 마중 나온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 들고 늦은 시간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에 온 소포를 받고 문 닫지 못한다.
서투른 글씨로 동여맨 겹겹의 매듭마다
주름진 손마디 한데 묶여 도착한
어머님 겨울 안부, 남쪽 섬 먼 길을
해풍도 마르지 않고 바삐 왔구나.
울타리 없는 곳에 혼자 남아
빈 지붕만 지키는 쓸쓸함
두터운 마분지에 싸고 또 싸서
속엣것보다 포장 더 무겁게 담아 보낸
소포 끈 찬찬히 다 풀다보면 낯선 서울살이
찌든 생활의 겉껍질들도 하나씩 벗겨지고
오래된 장갑 버선 한 짝
해진 내의까지 감기고 얽힌 무명실 줄 따라
펼쳐지더니 드디어 한지더미 속에서 놀란 듯
얼굴 내미는 남해산 유자 아홉 개.
「큰 집 뒤따메 올 유자가 잘 댔다고 몃 개 따서
너어 보내니 춥울 때 다려 먹거라. 고생 만앗지야
봄 볕치 풀리믄 또 조흔 일도 안 잇것나.
사람이 다 지 아래를 보고 사는 거라 어렵더라도 참고
반다시 몸만 성키 추스리라」
헤쳐놓았던 몇 겹의 종이
다시 접었다 펼쳤다 밤새
남향의 문 닫지 못하고
무연히 콧등 시큰거려 내다본 밖으로
새벽 눈발이 하얗게 손 흔들며
글썰글썽 녹고 있다.
- 고두현의 시 <늦게 온 소포>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 작성일
- 2018-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