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 히스토리
프랑스로 간 우리의 기록유산, 직지심체요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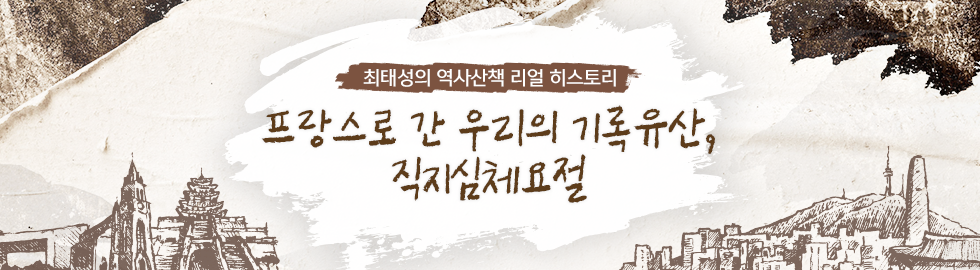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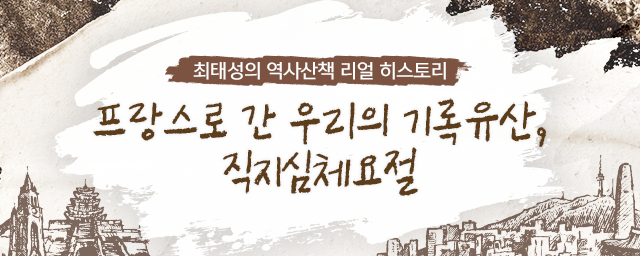
1984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 이름 없는 절터가 하나 발견됐다. 조사 결과 이곳은 흥덕사라는 절이 있던 곳으로 밝혀졌다.
흥덕사는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 때의 사찰로,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인쇄된 곳이다.
그렇다면, 고려는 왜 그렇게 빨리 금속활자를 만들어야 했을까?
직지심체요절은 어쩌다 프랑스 국립도서관까지 가게 되었을까?
직지심체요절에 대한 무수한 의문들을 한국사 전문가 최태성 작가와 함께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자.
-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영상을 보시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재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재생이 안 될 경우 FAQ > 멀티미디어 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
01. 고려는 왜 그렇게 빨리 금속활자를 만들어야 했을까?
더 높은 수준의 지식과 교양을 위해 필요한 건 역시 책이었다. 많은 책을 읽기 위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인쇄 기술이 필요했다. 당시 고려의 목판 제작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초조대장경과 재조대장경을 제작하면서 남긴 대장경 목판 수만 무려 팔만 장이 넘었다. 이것이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르는 그것이다. 그러나 목판 인쇄는 큰 단점이 있었다. 다양한 책을 소량으로 찍어내기가 어렵다는 점이었다. 고려는 다양한 학습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일찌감치 금속활자를 탄생시킨 것이었다.
-
02. 직지심체요절은 어쩌다 프랑스까지 가게 되었을까?
직지는 1886년, 초대 주한 공사로 부임했던 프랑스의 콜랭 드 블랑시(Collin de Plancy)가 1880년대 말에서 1890년대 초 국내에서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수집된 직지는 블랑시의 다른 수집품들과 함께 1911년 파리 경매장에 나왔고, 골동품 수집가 앙리 베베르에게 단돈 180프랑에 팔리게 된다. 1952년 베베르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직지를 기증했고, 도서번호 109번, 기증번호 9832번을 부여받아 동양 문헌실에 보관됐다. 1900년 파리에서 열린 만국박람회 한국전에서 직지가 공개되기도 했으나 당시엔 그 누구도 직지를 알아채지 못했다.
-
03. 도서관 폐지 창고에서 직지를 발견한 건 한국인이었다?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외규장각 의궤를 되찾겠다는 신념으로 1967년부터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박병선 박사는 우연히 도서관 분관의 폐지 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직지심체요절을 발견하게 된다. 자세히 살펴보니, 간행연도 1337년이란 표기와 함께 마지막 장에 ‘이 책은 쇠를 부어 만든 글자로 찍어 배포한다’는 의미의 ‘주자인시(鑄字印施)’라는 기록을 확인한다. 직지를 증명하기 위한 5년 간의 연구와 노력 끝에 박병선 박사는 1972년 ‘유네스코 세계 도서의 해’ 기념 도서전에 직지를 출품하고, 직지가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선 세계 최초의 금속 활판 인쇄본임을 밝힌다. 이후 2001년 직지심체요절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기에 이른다.
-
04. 조선시대, 한글 소설 확산의 일등공신은 직지였다?
당시 고려시대에 금속활자로 찍은 책들은 대부분 지배 계층만을 위한 제한적 쓰임에 그쳤다. 이 때문에 우리 민족의 인쇄기술은 민중들의 책 읽기 확산을 위해 활용되었던 독일의 구텐베르크 활자처럼 세상을 바꿔내는 힘 같은 것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하지만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선진적인 인쇄기술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또 그 위에 한글이 얹혀지게 되면서 세상을 바꿀 준비를 하게 된다. 조선 후기 서민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한글 소설의 확산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최태성
강사- 모두의 별★별 한국사 연구소장
- EBS, 이투스교육 등 한국사 대표 강사
- 前 대광고 역사 교사
- KBS <역사저널 그날>, tvN <어쩌다 어른> 등 다수 출연
- <최태성 한국사 수업> 등 다수 저술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 작성일
- 2018-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