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의 지혜
길 위의 외교관 ‘연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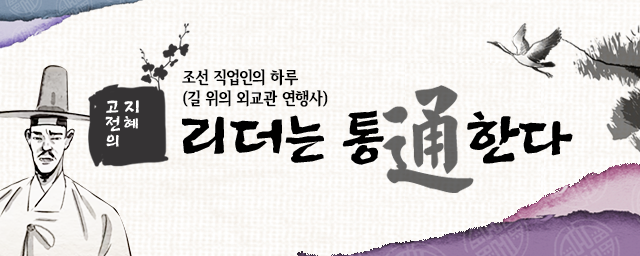
-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영상을 보시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재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재생이 안 될 경우 FAQ > 멀티미디어 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선은 중국 황제의 생일과 황태자의 탄생, 새해맞이를 축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중국에 사신을 보냈다.
이들의 목적지는 중국의 수도인 연경. 연행사란 ‘연경에 가는 사신’이라는 의미로, 정사와 부사, 기록관이 연행사를 이끌었는데,
현재로 치자면 외교부 장관과 외교부 차관, 서기관에 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다.


명나라의 수도, 연경으로 가는 길목에서 일어난 실랑이
명나라를 방문한 조선 사신들이 머물던 요동의 회원관(당시 조선 사신들이 머물던 요동의 숙소)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빨리 수레와 말을 내어 주시오. 벌써 사흘째요.”
“아직 준비 중이요. 헌데, 인삼과 화문석이 필요해서 말이야. 은 10냥에 파시오.”
“뭐요? 이틀 전에도 물건만 가져가지 않았소!”
“그건 다른 관리가 가져간 거고. 그럼 내일 봅시다.”
“이런, 내일 출발하지 않으면 약조한 날 도착하지 못할 텐데.”
한 달 전, 조선은 중국 황제의 탄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명나라로 사신을 보냈다. 명의 수도인 연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요동에서 말과 수레를 지원받기로 했지만, 요동의 관리들은 이를 어기고 조선의 토산품을 계속 요구했다.
“아무래도 제 때 출발하긴 틀린 것 같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약조한 날까지 반드시 연경에 도착하라는 왕명이 있었네.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중국 관리들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해야 했던 조선의 외교관
결국, 요동의 관리들에게 상당량의 토산품을 내어주고서야 겨우 말과 수레를 받을 수 있었다. 한숨을 돌린 사신들은 며칠 전 팔기로 약속해 두었던 노새를 찾으러 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새 주인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분명 나흘 전에 노새를 내어주기로 약조하지 않았소?”
“그건 그런데, 며칠 사이 노새가 귀해져서 말이요. 세 배는 더 받아야겠소이다.”
요동의 관리 때문에 일정이 늦어진 것을 알아채고 돈을 더 받기 위해 어깃장을 놓은 것이었다. 이미 상당량의 토산품을 내어주었기에 추가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사신들은 고민에 빠졌다.
“이를 어찌 합니까? 더 이상 내어줄 돈도 없는데.”
“노새 없이 그냥 출발하는 척 하게. 그럼 오히려 저들이 급해질 것이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출발하기로 했소. 짐을 다시 수레에 싣도록 하시오.”
사신들은 노새 등에 싣기 위해 내려놓았던 짐을 수레에 담기 시작했다. 이를 지켜보던 노새 주인이 부리나케 달려왔다.
“아니, 왜 그리 급하게 가시오? 수레에 짐을 그리 많이 실으면 도중에 탈이 날 텐데? 사정이 딱하니 처음 약조한 돈만 주시오. 내 큰맘 먹고 노새를 내어드리겠소.”
우여곡절 끝에 말과 수레, 노새를 마련한 사신들은 비로소 연경으로 길을 떠날 수 있었다.

총 인원 300여 명의 대규모 사신을 연경으로 보낸 조선
조선은 중국 황제의 생일과 황태자의 탄생, 새해맞이를 축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중국에 사신을 보냈다. 이들의 목적지는 중국의 수도인 연경이었기에, 연경에 가는 사신이라는 의미로 ‘연행사’라 불렀다. 정사와 부사, 기록관이 연행사를 이끌었는데, 이들은 현재의 외교부 장관과 차관, 서기관에 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외 수행원들과 하인들, 통역관, 곡물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총 인원은 무려 300여 명에 달했다.

국익을 위해 험난한 여정을 견뎌야 했던 연행사들의 숙명
연행사는 보통 의주에서 압록강을 넘어 산해관을 지나 지금의 북경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대략 4~5개월 정도 걸리는 긴 여정이었다. 강을 건너고, 산을 오르는 험난한 길인 데다가 중국 관리들의 무리한 요구까지 겹쳐 이들의 몸과 마음은 성한 곳이 없었다.
“험한 길보다 힘들었던 것은 중국 관리들에게 치욕을 당하는 것이었소. 허나, 국익을 위해서라면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우리 연행사의 숙명 아니겠소?”
조선의 외교 업무를 담당했던 연행사는 명망 있고, 능력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였다. 하지만 워낙 고된 일이었기에 때로는 뇌물을 주고 자신을 빼달라고 청하거나, 오히려 정적을 천거하기도 했다.
조선시대의 외교관, 연행사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요양관서 머문 지가 벌써 열흘 일없이 지내자니 괴로움만 쌓이누나. 내가 나는 주방은 답답함을 더하고 풍기에 저린 몸 긁어대니 피곤하다. 고민 덜려 시 짓자니 몸은 여위고 틈 내어 졸다 보면 수마(睡魔)에 빠지누나 어둠 속에 죄수처럼 앉아 있을 따름인데 눈 감으면 이내 곧 고향에 돌아가네.” - 이정구 <유요양기사(留遼陽記事)> (선조 37년)
조선시대, 길 위의 외교관이라 불리던 연행사. 이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우리는 약소국의 외교관이 겪어야 하는 애환과 비애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여전히 외교문제는 고도의 전략과 정보, 극도의 신중함을 요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우리의 국격과 국력을 높이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 작성일
- 2018-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