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예술의 풍경
먹거리의 쌍벽, 엿과 뻥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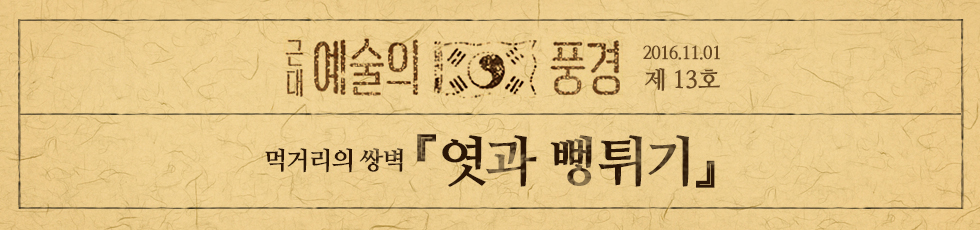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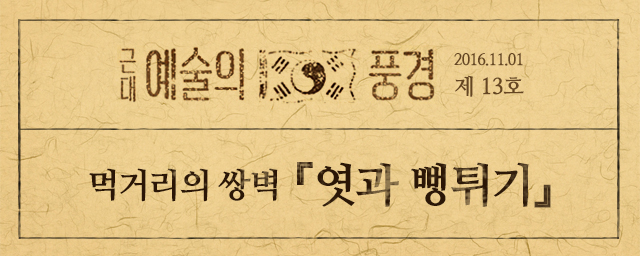
근대에는 어떤 군것질거리가 있었을까. 너나 할 것 없이 무척 가난하던 시절, 초근목피로 연명하기도 바쁜 마당에 무슨 군것질거리가 있을까 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일상적 주식인 삼시세끼 밥 이외에도 당연히 군것질거리가 있었다.
군것질이란
끼니 외에 배가 출출할 때 과일이나 과자 따위의 군음식 먹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비슷한 말로는 입치레가 있다. 주전부리라는 말도 있다. 이는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군음식을 자꾸 먹는 행위 또는 그런 입버릇을 말한다. 이를테면 주식과는 별개로 간식이라고나 할까, 심심풀이로 입에 넣는 음식을 군것질거리라고 해도 망발은 아닐 것이다.
이런 군것질과 관련해서 잠시 세시풍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령 정월 대보름, 2월 초하루, 3월 삼짇날, 4월 초파일, 5월 단오, 6월 유두, 7월 칠석, 8월 한가위, 9월 중양절, 10월 상달, 11월 동지, 12월 섣달 등등 이런 날에는 주식 이외에 뭔가 색다른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그것이 곧 군것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음식문화와 군것질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임에 틀림없다.
정월 대보름에 부럼을 깨고, 2월 초하루에 콩이나 보리를 볶아 먹고,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3월 삼짇날에는 화전놀이를 하면서 맛깔스런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2월 초하루의 경우 볶은 콩이나 보리는 좋은 군것질거리가 되고도 남았다. 그렇다고 군것질을 위해 그런 날들이 생겨난 것은 아니고, 사람이 모이게 되면 반드시 그럴싸한 음식이 있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세시풍속과 맞물려 그때 그 시절에는 무엇이든 군것질거리 아닌 것이 없었다. 워낙 궁핍하던 시절이기 때문이었다. 산과 들에 돋아나는 야생식물의 새순과 열매가 모두 군것질거리였다. 봄에는 띠의 어린 새순인 삘기를 뽑아 먹었다. 그런가 하면 띠 뿌리를 캐어 먹기도 하였다. 삘기와 띠 뿌리는 다 같이 달착지근하였다.
수숫대, 옥수숫대도 농촌 사람들에게는 좋은 군것질거리였다. 수숫대와 옥수숫대의 경우 껍질을 벗기고 그 속살을 씹으면 약간의 단맛이 나왔다. 여름과 가을에는 까마중 열매를 따먹었고, 오다가다 눈에 들어오는 개똥참외도 행운의 군것질거리였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군것질거리는 대부분 공짜였다.
이렇게 군것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서리가 바로 그것이다. 서리란 여러 사람이 떼 지어 남의 과일이나 곡식 또는 가축 따위를 훔쳐 먹는 일종의 장난을 말한다. 참외서리, 보리서리, 밀서리, 콩서리, 과일서리, 닭서리 등등. 누군가가 애써 농사지은 참외나 수박을 몰래 따다 먹고, 보리와 밀과 콩을 털어 구워 먹는가 하면, 복숭아와 사과와 배 같은 과일을 훔쳐 먹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닭을 훔쳐다 삶아 먹기도 하였다.
이러한 서리는 사회적 묵인, 즉 묵시적 용인 아래 이루어졌다. 남의 과일과 곡식과 가축을 훔쳐 먹는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장난 수준이었고, 남의 재산을 훔쳐다 자기 재산을 불리는 개념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남의 과일이나 곡식 또는 가축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절도죄로 처벌받기 안성맞춤인 것이다.
대표적인 군것질거리

출처 : wikimediafrom Portsmouth, NH, USA
그런데 근대의 가장 대표적인 군것질거리는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엿이었다. 엿은 곡식으로 밥을 지어 엿기름으로 삭힌 뒤 겻불로 밥이 물처럼 되도록 끓이고, 그것을 자루에 넣어 짜낸 다음 진득진득해질 때까지 고아 만든 달고 끈적끈적한 음식이다. 아주 어린 아이를 빼놓고 아마 엿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엿은 재료에 따라 종류도 다양했다. 옥수수엿, 쌀엿, 고구마엿, 밤엿 등등 여러 가지 엿이 오랜 세월 우리 겨레의 군것질거리로 각광을 받았다. 전국 각지 어디를 가나 사시사철 엿장수들이 있었다. 엿장수들은 좌판을 벌여 놓거나, 아니면 지게 또는 손수레에 엿을 싣고 다니며 엿을 팔았다.
어깨와 목에 멜빵을 걸어 엿판을 가슴 부위에 매달고 다니는 엿장수도 있었다. 한 여름에는 넓적한 엿을 가지고 다녔고, 겨울철에는 대략 한 뼘 크기의 가래엿을 팔았다. 가래엿의 생김생김도 다양했다. 뿌옇게 밀가루를 바른 엿이 있는가 하면, 참깨를 묻혀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게 장식한 엿이 있었다. 또, 엿 중에는 말갛게 투명하고 불그스레한 갱엿이라는 것도 있었다.
엿장수들은 대개 큼지막한 가위를 가지고 다녔다. 그들은 쩔겅쩔겅 가위를 치면서 손님을 불러 모았다. 거기에 기막힌 재담과 사설까지 곁들인 엿장수들도 많아 서민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덤으로 개평 잘 주는 엿장수의 인기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장터나 난장판 등 군중이 모이는 곳에 반드시 엿장수가 있었다. 미술 작품이나 문학 작품에도 종종 엿장수가 등장한다. 예컨대 단원 김홍도의 「씨름도」에도 목판을 둘러멘 엿장수가 있다. 그밖에도 전설과 민담 등 엿장수에 얽힌 이야기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개화기의 사진들에서도 헐렁한 핫바지 입고, 상투 튼 엿장수가 엿판 메고, 가위 치는 장면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서민들이 그만큼 엿을 군것질거리로 즐겼다는 방증인 것이다.
한편, 엿장수는 안 받는 것이 없었다. 현금 이외에도 고무신, 빈 병, 머리카락, 비녀, 솥단지, 양은그릇 등등 엿장수들은 갖가지 고물들을 받고 엿을 바꿔주었다. 좀 더 과장해서 말하자면 엿장수는 각 가정의 고물, 집안에서 못 쓰는 물건은 다 거둬 갔다. 따라서 엿장수는 그 특성상 고물장수와 사촌쯤 되는 셈이었다. 요즘 시각으로 해석한다면 엿장수야말로 자연보호, 환경보호의 첨병이자 주역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런 엿장수야말로 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친근한 이웃이었다.
함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간식


출처 : 해외문화홍보원,코리아넷 (우측 사진)
이와 함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제사상에도 오르는 강정과 떡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강정은 찹쌀가루, 꿀, 엿기름, 참기름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낸 우리 겨레의 전통 과자로서 견병이라고도 한다. 떡은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예나 지금이나 군것질거리 이상의 고급 음식이다. 서양의 다른 나라에 빵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떡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왔다. 떡이 주식은 아니다. 따라서 군것질거리의 일종으로 다루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한과 중의 한과라 할 수 있는 약과(藥果), 유과(油菓), 다식(茶食) 등도 격조 높은 군것질거리였다. 약과는 꿀과 기름을 섞은 밀가루 반죽을 판에 박아서 모양을 낸 후 기름에 지진 과자이고, 유과는 찹쌀가루에 술을 넣고 반죽하여 찐 다음 모양을 만들어 건조시킨 후에 기름에 지져 조청이나 꿀을 입혀 다시 고물을 묻힌 음식이다. 다식은 녹말ㆍ송화ㆍ신감채ㆍ검은깨 따위의 가루를 꿀이나 조청에 반죽하여 다식판에 박아 만드는 음식으로 흰색ㆍ노란색ㆍ검은색 따위의 여러 색깔로 구색을 맞춘다.
근대의 간식, 뻥튀기

출처 : wikimedia/Anna Frodesiak
이러한 음식들이 뿌리 깊은 군것질거리였다면 근대의 군것질거리로 뻥튀기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뻥튀기 기계의 등장은 우리의 군것질 문화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왔다. 쌀, 보리, 옥수수, 감자 따위를 기계에 넣고 가열한 뒤 튀겨내는 뻥튀기는 종래의 엿과 더불어 군것질거리의 쌍벽을 이루었다. 과거에는 쌀과 보리와 옥수수 등을 가마솥에 볶았으나, 뻥튀기 기계는 ‘뻥!’ 하는 폭음과 함께 새로운 군것질거리를 몇 배로 부풀려 쏟아냈다.
세월이 흘렀다. 개화기를 맞아 우리의 군것질에도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마침내 서양의 과자가 들어와 새로운 물결을 일으켰다. 과자는 토종 군것질거리를 밀어내고 그 드넓은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 글
- 이광복_소설가,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1953년생저서 『화려한 밀실』 『사육제』 『겨울여행』 『풍랑의 도시』 『목신의 마을』 『폭설』 『술래잡기』 『겨울무지개』 『송주임』 『이혼시대』 『불멸의 혼-계백』 『안개의 계절』 『황금의 후예』 등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 작성일
- 2016-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