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예술의 풍경
추억과 그리움을 얹어 먹는 막국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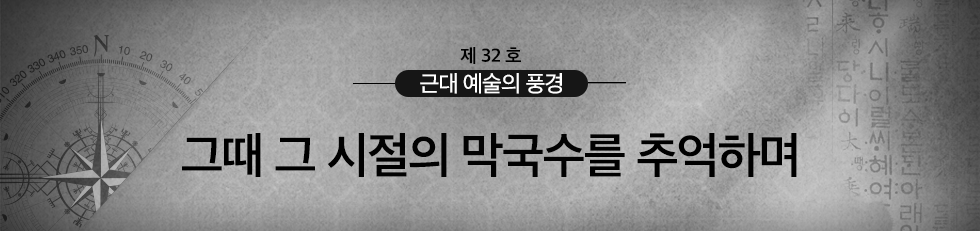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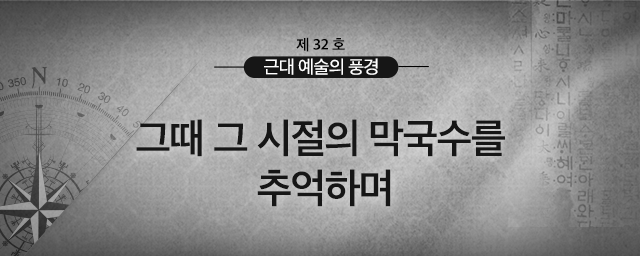
가을걷이가 끝나면 해는 짧아지고 이윽고 겨울이 온다. 산촌의 저녁은 날래 저물고 출출한 밤으로 농가에서는 막국수를 눌러 먹었다. 막국수는 말 그대로 막 해 먹는 것 같지만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기 때문에 보통은 서너 집이 어울려야 했다. 남정네들은 지게를 지고 마을이 공동으로 쓰는 분틀을 어디선가 찾아오고 아낙들은 맷돌에 타겐 멥쌀을 디딜방아로 찧고 다시 체로 치는 과정을 거친 메밀가루를 뜨거운 물로 반죽을 하고 아궁이에 장작을 지피는 등 과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윽고 커다란 가마솥에 분틀을 걸고 반죽을 넣고 힘껏 누르면 가느다란 국숫발이 설설 끓는 가마솥에 떨어진다. 그걸 찬물에 헹구고 소쿠리에 받아 얼음이 서걱거리는 김칫국물에 말아 상을 차렸다. 나는 어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국수를 누르는 게 재미있어서 부뚜막에 올라가 분틀에 매달리거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김이 서린 부엌에서 쓸데없이 얼쩡대다가 욕을 얻어먹기도 했다.
메밀국수는 거무스레하고 고소하다. 면이 남으면 사리를 지어놓았다가 더받이를 하기도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끈기가 없어져 나중에는 숟가락으로 퍼먹기도 했다. 돌멩이처럼 추운 날 이가 시리도록 찬 국수를 먹고 나면 어른들은 사랑방에서 새끼를 꼬거나 담배 내기 화투를 치며 떠들썩하고 형과 나는 따뜻한 아랫목을 차지하려고 이불 속에서 싸우던 생각이 난다.
막노동, 막말, 막춤, 막도장, 막사발, 막소주 등 어떤 말 앞에 접두사 막자가 붙으면 대개 제대로 된 게 아니거나 함부로, 혹은 금방 같은 뜻을 지니게 된다. 그렇다면 막국수의 ‘막’은 어디서 왔을까. 별 조리 과정 없이 눌러서 바로 먹는다고 해서 막국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곡식 축에도 못 드는 메밀을 가지고 대강 해 먹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니라는 뜻으로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 해석도 있다. 그런데 봉평이나 홍천을 비롯한 강원도 내륙 지방에서는 예전부터 막국수라고 했다지만 내가 자란 양양을 비롯한 영동지방에서는 메밀국수라고 했다.
메밀은 조나 피, 기장처럼 주곡에 보태 어려운 때를 넘기는 곡식이다. 자갈밭 같은 거름기 없는 밭에 대강 뿌리고 김을 메주거나 가꾸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고 여문다. 대신 소출이 적고 값이 나가지 않는다. 대게는 빻아서 가루로 보관하다가 명절에 전을 부치거나 궂은날 묵을 게기도 하고 국수를 눌러 먹는 게 고작이다. 그러나 지금은 부드럽고 단맛에 지친 사람들이 가난한 시절에 대한 향수와 건강을 위하여 거친 음식을 찾는 바람에 메밀은 수요를 따르지 못할 정도로 귀한 몸이 되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의 역설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막국수를 뽑는 전통 틀(사진 제공: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사전적으로 말하자면 막국수는 메밀국수를 김칫국물에 말아 먹는 강원도 토속음식이다. 산간지역이 많은 강원도는 메밀 농사가 많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흉년의 허기를 달래거나 농한기에 별식으로 즐기던 가족 단위의 음식이 어떻게 대중의 음식이 되었을까?
십여 년 전 어떤 잡지에 막국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기에 대하여 여러 곳에 문의한 적도 있었지만 짐작건대, 맷돌이나 디딜방아로 메밀을 타게고 빻던 가내 가공을 거쳐 제분기나 제면기 같은 가공시설이 시골까지 공급되면서 메밀가루 생산이 쉬워진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수급조절이 가능해지고 계절 없이 상시 조리가 가능해지자 누군가 거리에 막국수라는 간판을 내걸지 않았을까. 특히 육이오 전쟁 후 궁핍한 생활을 이기는 생계 수단으로 여기저기 문을 연 국숫집을 그 시초로 볼 수도 있는데 여하튼 막국수라는 메뉴는 그렇게 해서 가족과 산골을 벗어났을 것이다. 물론 내 생각이다. 영동, 영서를 막론하고 강원도에 소문난 막국수 집이 많은 것을 보면 강원도가 메밀 주산지이고 대중화도 먼저 되었으리라는 짐작도 가능한 것이다. 어쨌건 일찍이 막국수를 향토음식 브랜드로 선점한 춘천에는 막국수 체험 박물관까지 있다니 메밀의 본고장인 봉평이나 홍천 같은 데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내 고향 양양 지방에서는 추수가 끝나고 겨울로 접어들거나 입춘 추위가 시작되면 마을의 아낙네들은 나들이 겸 국수 추렴을 했다. 겨우내 잃어버린 입맛을 돋우는 데는 음식 추렴만 한 게 없었다. 라디오도 제대로 못 듣던 시절, 기나긴 겨울은 얼마나 심심했을까. 국수 추렴은 이웃 아낙 대여섯 명이 무리를 지어 근동의 소문난 국숫집을 찾는 거였는데 그 국숫집이야말로 이른바 막국수집의 원조였을 것이다. 그래봤자 집에서 해 먹는 메밀가루에 밀가루를 조금 넣어 면발을 끈기 있게 뽑아내고 거기다가 털이 덜 뽑힌 돼지고기 한두 점 정도를 얹어 맛을 냈을 것이다.
그러나 아낙들이 부엌에서 벗어나 남이 해 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거야말로 당시로 보면 호사 중의 호사가 아니었을까. 농촌 전통사회에서는 아낙들의 굿 구경이 하나의 문화 행사였듯 국수 추렴이나 떡 추렴을 비롯한 음식 추렴도 농한기의 행사였다. 그러나 점잖은 남정네들은 국수 추렴을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술 추렴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굿 구경은 물론 국수 추렴도 어머니를 따라다녔다. 어린 시절 따라갔던 그 마을에는 주인은 바뀌었겠지만 근사한 간판을 단 막국수 집들이 지금도 성업 중이다. 막국수는 생각보다 끈질긴 음식이다.

메밀가루를 주원료로 하는 막국수
요즘 막국수는 메밀가루가 주원료라는 점에서 옛날 메밀국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조리방법을 보면 과거에는 면을 즉석에서 뽑아냈는데 지금은 대부분 면 공장에서 미리 만든 것을 받아쓰고 김칫국물보다는 동치미 국물에 말아낸다. 그리고 메밀가루와 밀가루의 희석 비율에 따라 좀 질기고 매끄럽거나 텁텁하고 구수한 맛의 차이가 있다. 내가 자주 다니는 어떤 막국수집은 순 메밀로 국수를 만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아예 마당에 메밀 빻는 방앗간을 차린 집도 있다. 하긴 그 집 막국수는 다른 집보다 훨씬 고소하긴 하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의 입맛은 막국수도 순 메밀의 는적는적함보다는 약간 질긴 걸 좋아하는 것 같다. 입맛도 길들여지기 마련이고 다만 양념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잇몸과 혀를 즐겁게 하는 조미 방법이 다양해졌을 뿐이다.
나는 국수라면 자다가도 일어난다. 불어터졌어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침이라도 밥과 국수 중 선택하라면 나는 국수 편이다. 그래서 입맛이 없거나 속이 허할 때는 막국수 집을 찾는다. 그런데 사실 막국수보다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어서다. 국수라는 음식이 먹고 나면 뭔가 섭섭하고 모자라는 느낌이 드는 게 보통이다. 실은 국수를 시키고 기다리는 동안 잘 삶은 돼지고기 수육에 소주 한 잔 마시는 재미로 막국수 집을 찾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백석이 그의 시 「국수」에서 읊었던 것처럼 “담배 내음새 탄수 내음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내음새 자욱한 더북한 삿방 쩔쩔 끓는 아르�”의 추억을 공유한 사람이고 보면 막국수에 추억과 그리움을 얹어 먹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통 수육 한 접시가 막국수의 서너 배는 하니까 값으로 치면 본말이 전도된 셈이긴 하나 맛있는 걸 즐기는데 뭘 따지겠는가.
- 글
- 글 / 이상국
시인,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1946년생
시집 <달은 아직 그 달이다>, <저물어도 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 문학자전 <국수> 등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 작성일
- 2021-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