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예술의 풍경
커피를 압음하여 삼편주를 혈파하니 문명개화 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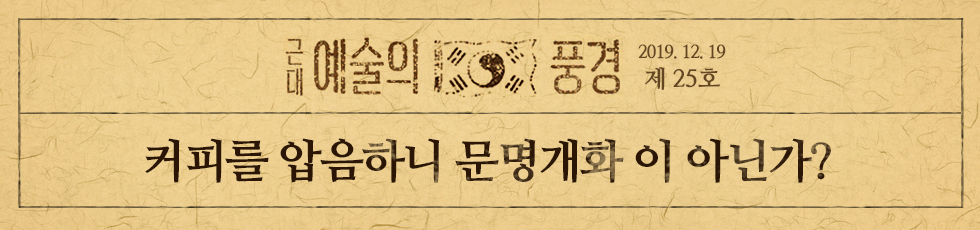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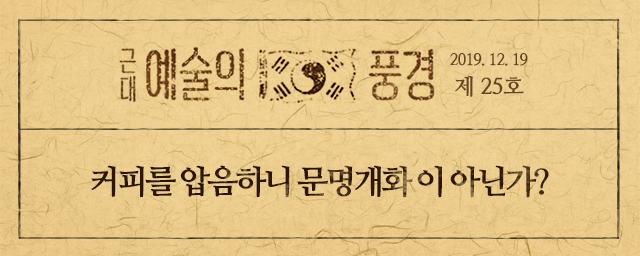

산업혁명·대량생산·제국주의·식민지·자본제·이성·합리성·과학성·의회민주주의·자유·평등·동포애……. 근대 또는 현대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말의 꾸러미를 꼽아보니 대략 이렇다. 한마디 한마디 덩치는 한없이 크고 속내는 밑도 끝도 없이 복잡하다. 거칠게나마 이를 사람이 사는 모습 또는 ‘풍경’으로 요약한다면? 이태준의 글이 마침맞을 듯하다.
만일 춘향이라도 그가 현대의 여성이라면 그도 머리를 퍼머넨트로 지질 것이요 코티(Coty 상표의 분_글쓴이)를 바르고 파라솔을 받고 초콜릿,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먹을 것이다. [중략] 새 말을 만들고, 새 말을 쓰는 것은 유행이 아니라 유행 이상 엄숙하게, 생활에 필요하니까 나타나는 사실임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커피 먹는 생활부터가 생기고, 퍼머넨트식으로 머리를 지지는 생활부터가 생기니까 거기에 적응한 말 즉 커피, 퍼머넨트가 생기는 것이다.
- 이태준, 『문장강화(文章講話)』, 문장사, 1940
세상이 달라졌다. 새로운 문물이 물밀듯 쏟아졌고, 춘향도 더 이상 치마저고리에 버선 신고 살지 않는다. 코티(Coty) 바른 새로운 춘향에게 어울리는 커피는 신문물의 대표적인 상징이었다. 1888년 조선에 들어와 살다 1921년 조선에서 숨을 거두고 조선에 묻힌 릴리어스 호턴 언더우드(Lillias Horton Underwood, 1851~1921)의 회상에 따르면 19세기 말 조선의 부자들 사이에 커피유행이 번지고 있었다.
없다고, 안 먹는다고 죽지 않는 음료, 음식이라기보다 기호품 및 사치품에 더 가까운 사물이기에 더했다. 커피를 마신다는 것은 근대를 즐긴다는 뜻이었다. 거꾸로, 기호품이나 사치품만 들이켜고 있으면 조선이 근대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회의를 불러일으킬 때도 커피가 불려 나왔다.
당당히 양요리루 의자에서 / 커피를 압음하며[즐겨 마시며] / 삼편주[三便酒, 샴페인]》를 혈파하니[들이켜니] / 문명개화 이 아닌가
- 「피개화(皮開化)」, 《대한매일신보》, 1906년 1월 10일자
애국계몽의 의지가 충만한 무명 시인의 가사에 담긴 피개화꾼, 곧 ‘껍데기뿐인 개화꾼’은 서양식으로 이발하고 향수를 처바르고, 서양 옷을 입는다. 금테 안경 쓰고, 금강석 장식 박은 물부리에 이집트산 연초를 꽂고, 회중시계 품고 서양식 단장을 짚는다.
그러고는 남들 보라고, 자신의 월급은 생각지 않고 샴페인과 커피를 들이켠다. 학습해야 할 근대를, 그저 장식품으로 소비하는 대한제국인 군상에 대한 야유는 이렇게 마무리된다.
“뱃속에는 학문이 무엇이오 / 텅텅 비어 아무것도 없소 / 그러면 피개화.”
껍데기 커피가 드디어 생활 커피가 되기까지 실로 한 세대가 걸린 셈이다.
그런데 이전의 사정도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이를 살피자면《한성순보(漢城旬報)》를 펼칠 필요가 있다. 《한성순보》는 1883년 창간된 한국역사상 첫 근대신문이다. 기사는 순 한문으로 썼다. 1886년 순간에서 주간으로 개편해《한성주보(漢城周報)》가 되었으나 1888년 폐간되었다. 이 신문은 조선사람들에게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지리·경제·정치·제도·외교·문물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애썼다. 이 신문 또한 세계의 추이에 따라 커피를 품었다.
가령《한성주보》 1886년 2월 22일자는 영국의 소비세 및 개별소비세를 논하면서 코코아와 커피를 거론한다. 당시 코코아는 ‘고고아’로 쓰고, 커피는 ‘가배’로 표기됐다. 순 한문 신문이었지만, 한자로 이루다 쓰지 못할 데에서는 한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 한글을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쌓이다 보면 한문은 국한문체가 되고, 국한문체는 한글 표기의 조선어가 되는 것이다.

아무튼 이 꼭지는 영국 찰스 1세의 맥주, 사이다(여기서는 청량음료가 아니라 술), 담배, 기타 주류, 설탕의 소비세에서 시작해 1844년의 현황에 이른다. 왜 이런 기획이 필요했을까. 첫째, 열강과 무역이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 조약 맺고 무역하는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물품의 목록과 그 징세 방식을 알아야 내 쪽에서도 관세 입법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은가. 둘째, 19세기 구미 각국과 그 식민지가 인두세 대신에 커피·차·설탕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징세 방식이 바뀌는 데 대한 대응의 의미가 있다.
이들은 그저 먹을거리, 마실거리만은 아니었다. 노골적인 인두세를 대신한 부드러운 징세의 기술에 잇닿은 사물이었다. 얼치기가 개화꾼 행세하느라 맛도 멋도 모르고 들이켠 건 커피뿐이 아니었다. 어마어마한 동시대 입법 조사의 고심을 담은 커피도 있었던 것이다.
커피는 또한 새로운 사회활동 및 그 공간과 함께 조선인의 생활 속으로 퍼져 나갔다. 고위층을 중심으로, 도시인 일부의 사치품이었던 커피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속에서도 자리를 잡아간다. 예컨대《황성신문(皇城新聞)》 1909년 11월 3일자는 문헌으로 확인되는 한국 역사상 첫 커피전문 공간소식을 전한다. 1909년 11월 1일, 경성역의 전신인 남대문 정거장에 ‘끽다점’이 개설되었다는 것이다. 영업은 해마다 잘 되었던 듯하다.
《매일신보》 1913년 8월 7일자는 7월 중 남대문역 이용자 현황을 보도하면서 남대문역 끽다점 이용자 수를 월 743명으로 집계했다. 1920년대 이후에는 후다미, 카카듀, 멕시코, 낙랑파라, 제비, 프라타나, 비너스 등 다방이 속속 문을 열었고, 문화와 사교의 중심지로 자리잡는다.
이 가운데 제비는 1933년 시인 이상과 그의 연인 금홍이 연 곳으로 유명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식민지 시기의 카페는 ‘여급’ ‘카페걸’ ‘웨이트레스’ 등으로 불린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이다. 당시에는 다방이 전문 커피공간이고, 유럽형 카페를 꿈꾸던 문화계 인사가 다방의 개설과 경영을 주도했다.
오후 2시, 일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 등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담배를 태우고, 이야기를 하고, 또 레코드를 들었다. 그들은 거의 다 젊은이들이었고 그리고 그 젊은이들은 그 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네들은 인생에 피로한 것 같이 느꼈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중
신문을 볼 수 있고, 전화기를 쓸 수 있고, 신문을 볼 만한 사람들과 서양식 음료를 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곧 다방이었다. 1934년《조선중앙일보》에 연재된 박태원의 소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 잘 묘사하듯, 당시의 다방이란 인텔리의 집합소이자 모던보이의 아지트였다. 구보씨는 아침부터 종일 세 차례, 별일 없이 다방에 들렀지만, 별일 없는 가운데 사회적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 또한 다방이었다.
동시대 언론인 이헌구에 따르면 “다방취미, 다방풍류란 일종 현대인의 향락적 사교 장소라는 데 공통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니 가령 한 친우(또는 2~3인)와 더불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문학, 예술, 세상의 기이한 사실, 더 나아가 인생을 이야기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 다방이었다. 그리고 객쩍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언론과 출판과 예술의 기획이 이루어졌다.
하나의 보헤미안은 이런 환상을 품어본다.
그러나 권태와 피로에 지친 몸은 오늘도 어느 다방의 한구석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
커피! 인생! 도회! 봄! 이 무슨 업원(業寃)인가?
- 이헌구, 「보헤미안의 애수의 항구, 일다방一茶房 보헤미안의 수기」, 《삼천리》, 1938년 제5호
커피 한 잔에 인생의 애수와 도회의 감상을 부치는 표현, 인용한 것처럼 포착된 일상이 커피를 매개로 한 근대의 풍경의 하나다. 뿐만 아니라 커피는 가정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1920년대 언론은 도시 중산층을 겨냥해 연말선물로 와인·페퍼민트·브랜디·커피·코코아·밀크·홍차를 집중 홍보하기도 했다. 《중외일보》 1928년 11월 12 일자는 따듯한 차 한 잔이 간절한 계절에 맞춰 새로운 생활양식을 독자 대중에게 소개한다.
이제 대도시, 신문을 구독하는 층에는 “겨울밤에 더욱 좋은 맛 좋은 차 끓이는 법”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 그 내용은? 조선 차는 한 가지도 없다.
커피·홍차·코코아·초콜릿으로 충분하다. 이 꼭지의 첫 문장이 이렇다.
“우리 가정생활도 옛날과 같지 아니하여 새로운 풍속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가 코코아와 스페인 초콜릿 이야기이다. 그 옆에 따라온 “금년의 김장시세”가 도리어 이채롭다.
- 글
- 고영_음식문헌 연구자
- 저서 및 역서
- 「카스테라와 카스텔라 사이」「다모와 검녀」「샛별 같은 눈을 감고 치마폭을 무릅쓰고-심청전」 「아버지의 세계에서 쫓겨난 자들-장화홍련전』
「높은 바위 바람 분들 푸른 나무 눈이 온들-춘향전」 「게 누구요 날 찾는 게 누구요-토끼전」 「반갑다 제비야 박씨를 문 내 제비야-흥부전」
「허생전-공부만 한다고 돈이 나올까?」 등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 작성일
- 2019-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