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예술의 풍경
운동장에서 펼쳐진 공동체의 꿈, 전국체육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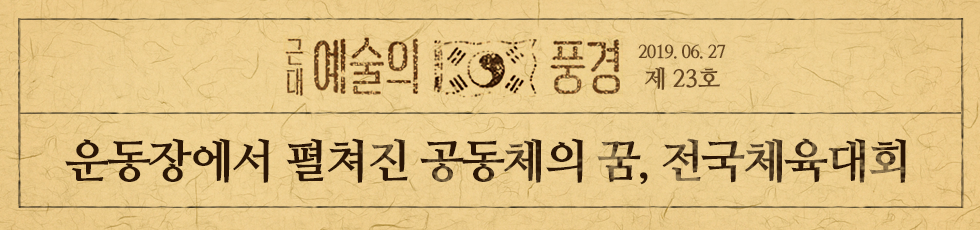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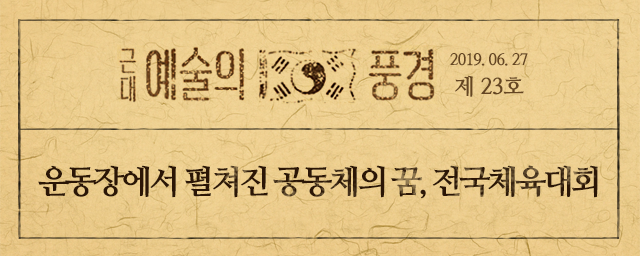

2020년이 ‘전국체육대회 100주년’이라 하지만 사실은 좀 더 복잡하다. 한국의 근대 스포츠문화는 1920년보다는 더 일찍, 약 한 세대 전인 1900년대에 개화하기 시작했다. 아직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기 전, 그러나 국망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을 때, ‘문약(文弱)’은 국가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문명과 상무가 새로운 지향 가치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서구에서 유입된 근대스포츠는 그 상징이 될 수 있었다.
대한제국시대(1897~1910)는 운동회의 시대이기도 했다. 먼저 관이 선도했다. 알려진 최초의 운동회는 1896년 5월 31일 관립소학교 학원들이 훈련원 운동장에서 연 것이다. 이날 정부 고관들과 교사들이 운동회가 끝난 뒤 애국가를 불렀다 한다. 그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모양새를 갖춘 1897년 6월의 영어학교운동회는 본격적인 운동회시대를 예고하는 상징적인 개막식이자, 육상경기대회의 꼴을 취한 최초의 행사였다.
1900년대에는 근대적인 사립학교들이 여럿 생겨났고 이 학교들에서 체육은 중요 과목이 되었다. 19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민간의 학교들도 봄-가을로 운동회를 열기 시작했고 스포츠열은 전체 조선사회로 번져갔다. 1905년 5월 22일에는 신흥사에서 YMCA의 전신인 황성기독청년회가 주최한 첫 운동회가 열렸다. 이후 YMCA는 근대 스포츠 발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또 다른 축이 되었다. 1906년 5월 4일 동소문 밖 봉국사에서는 관립법어학교운동회가 열렸다. 이날 종목 중에 축구가 있었다. 같은 해 6월 10일에는 대한체육구락부가 발족하고 이를 축하하는 운동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다 나라가 망했고 국가와 체육의 연결고리는 일단 끊어졌지만, 문화로서의 스포츠는 더 퍼져갔다.
100년 전 1920년은 분명 전기다. 조선체육회가 주최한 제1회 ‘전조선’, 야구·축구·정구·육상경기대회가 열린 해이다. 이를 주최한 것은 조선체육회였다. 경성직물회 사장인 유문상, YMCA야구단 출신인 이원용 등이 앞장을 섰고, 동아일보와 문화민족주의자들의 후원이 바탕이 됐다. 90여 명의 발기인이 모였는데 교육계와 언론계 인사들을 망라했다.
조선체육회 초대 회장은 장두현, 2대는 고원훈, 3대 최린, 4대 박창하, 5대 이동식 등으로 이어지다 신흥우(7·15대), 윤치호(9대), 유억겸(8·10·12대) 등의 기독교 계통의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이 회장직을 맡게 된다. 모두 ‘기호’에 YMCA 출신들이다. 이들과는 계보가 전혀 다른 여운형(11대)은 해방 이후 회장을 맡았다. 식민지 조선의 스포츠 발전에 기독교 계통의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근대스포츠 문화도 처음부터 근대 국가와 민족주의, 그리고 언론과 자본의 발전과 함께 했다. 조선체육회 창립일 사흘 뒤에 나온 7월 16일자 동아일보 사설 ‘조선체육회에 대하야’의 부제는 ‘민족의 발전은 건장한 신체로부터’였다. 이 축하 사설은 조선에 통일적인 체육후원·장려기관이 없었다는 것은 현금 “국제연맹의 규약으로써 세계인민의 건강증진을 규정하며 세계적 경기대회가 연년이 도처에 개최되는 차시에” 개인들의 유감이며 실로 조선민족단체의 일대 수치라 했다.
‘상상의 공동체’는 운동장에 있었다. 이들 대회를 통해서 그리고 ‘전조선’ 대회를 통해 신의주와 부산, 함흥과 목포가 만나고, 평양과 서울이 대결할 것이었다. 같은 룰과 같은 복장을 입고 ‘조선 최고’를 가릴 것이었다.
조선체육회가 주최한 제1회 전조선 야구대회는 1920년 11월 4일부터 배재고보 운동장에서, 제1회 전조선 축구대회는 1921년 2월 11일부터 배재고보 운동장에서, 전조선 정구대회는 1921년 10월 15일부터 보성고보 코트에서, 제1회 전조선 육상경기대회는 1924년 6월 14일부터 휘문고보 운동장에서 열렸다.
당연히 이들 ‘전조선’ 대회는 지역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지역 간 팀의 시합은 1910년대에도 있었지만 1920년대에 본격화되었다. 지방에 본격적으로 팀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경신과 배재, 휘문과 YMCA의 축구단이 먼저 그래왔던 것처럼 1920년 5월에는 평양운동단과 진남포 금강단이 축구시합을 했고, 대구 계성학교와 마산 창신학교가 한판 했다. 1921년 5월 14일에는 전주청년회 축구팀과 광주청년회가 붙었으며, 같은 달 5월 21일 평양 YMCA가 창설한 전국축구대회에서는 서울의 휘문고보가 우승했다.
1920년 5월에 평안도 선천 신성중학과 평양 숭실전문이 겨뤘는데, 종목이 야구였다. 6월에 대전청년구락부와 논산청년구락부도 야구로 시합했다. 1921년 4월에는 경남마산구락부와 의령청년단이, 부산동래청년구락부와 구포청년회도 야구로 한판 겨뤘다. 이런 일들을 모아서 1921년 7월에는 호남야구대회가, 1922년 6월 8일부터 제1회 황해도축구대회가, 같은 해 8월 13일에는 함경도 청진에서 북선축구대회가 열렸다.
국가는 망하고 없었지만, 국가 상징을 단 유니폼과 그를 응원하는 흰옷 입은 동포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이 바다를 건너다닐 때‘상상’은 더욱 확실해졌다. 미국과 일본의 선수들이 조선에 왔다.
스포츠는 그래서 서구와 우리를 비교하고, 우리와 일본을 비교하는 잣대가 될 수 있었다. “사나이거든 풋볼을 차라”는 1920년 11월호 잡지 <개벽>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다. 이 함축적인 제목이 달린 글은, 조선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업혀 길러지고 꿇어앉는 습관이 있어서 다리도 짧고 양복을 입어도 폼이 안 난다고 했다. 그래서 한창 인기를 끌고 있던 야구도 좋고 정구도 좋지만, 축구를 권장하노라 했다. 축구를 하면 다리가 길고 튼튼해져서 민족적인 신체결함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족적인 신체결함을 고쳐야 하는 궁극적 이유는 우리도 서양인만큼 커지고 튼튼해져서 “진충보국”, 즉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 보답하기 위해서이다.
1920년대에 조선에서도 ‘올림픽’은 국가간 체육경쟁의 대명사이자, 규모가 큰 운동회를 대유하는 용어로, 그리고 궁벽진 곳에 조용히 살아온 조선인이 세계로 떨치고 나가야 할 무대의 이름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세계적으로 웅비하려면 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하라, 조선청년의 원기를 일으킬 장쾌한 이 운동회, 세계「올림픽」에 참가할 선수는 다투어 오라.’ 1924년 조선체육회가 주최한 제1회 전조선육상경기대회를 소개하며 동아일보가 쓴 기사의 부제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딱 12년 만에 양정고보에 재학중인 조선인 청년 손기정은 제11회 베를린올림픽에서 세계를 제패한다. 3등을 차지한 남승룡과 함께였다.
* 이 글은 필자의 책『조선의 사나이거든 풋뽈을 차라』(푸른역사, 2010)의 2장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 글
- 글 / 천정환_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저서 『근대의 책 읽기』 『대중지성의 시대』 『자살론』 『조선의 사나이거든 풋뽈을 차라』 등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 작성일
- 2019-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