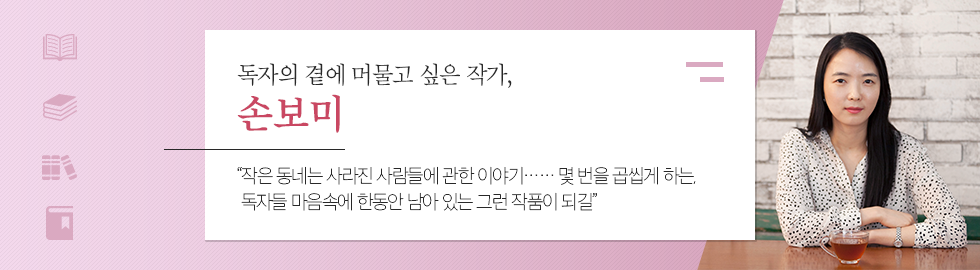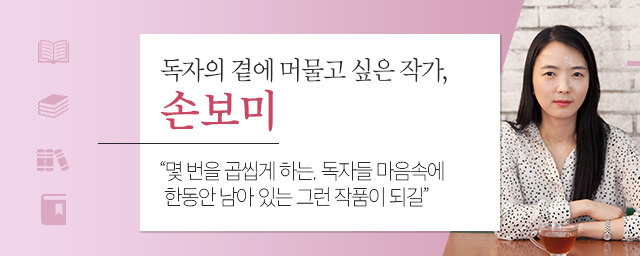각별한,까지는 아니겠지만 조금 인연이 있는 건 맞습니다. 재작년에는 대산문화재단이 진행한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 이어쓰기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작년엔 운 좋게도 첫 번째 장편소설인 『디어 랄프 로렌』으로 ‘대산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재작년과 작년에는 대산문화재단에서 개최하는 ‘청소년문학캠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응모작을 읽고 50명을 뽑아 2박 3일 동안 함께했는데요, 한편으론 힘들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아직 정제되지는 않았지만 쓰고 싶은 이야기를 거침없이 쓰는 친구들의 소설을 읽으면서, 쓴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지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작품이 끝나면 다른 작품을 쓰는 것 말입니다. 이게 제가 소설을 쓰는 원동력이자 저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굉장한 의도나 의미도 없이 일단 쓰는 것, 혹은 쓰기 위해 노력하는 것. 너무 단순하죠?
언제나 제가 쓴 작품이 제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한동안 자책감이나 후회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다음 마감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카페로 나가 한 문장이라도 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저녁땐 집으로 돌아온다, 그것뿐이죠.
사실 아직 저도 이야기의 초입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소설이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처음 구상했던 소설의 첫 문장은 “나, 그 여자들을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본 건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라는 대사였어요. 제 무의식 속에는 아마도 사라진 여자들에 대해 무언가를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결과적으로는 이 문장이 ‘사라지게’ 되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아마도 이 소설은 어떤 형태든지 사라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소설은 저에겐 굉장한 도전이에요. 이 소설은 일인칭으로 서술되는데, 저는 여자 화자로 일인칭 소설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엔 어떤 식으로든 이 이야기를 삼인칭 화자로 만들려고 애썼는데, 결국 일인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좀 기대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꼭 이미지일 필요는 없어요. 이미지일 수도 있고, 갑자기 떠오른 하나의 문장일 수도 있고, 드라마에서 본 대사 혹은 다큐멘터리에서 본 어떤 장면이나 기사의 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아이디어가 소설 작품으로 구체화되는 건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거든요. 처음에 떠오른 씨앗 아이디어(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가 나중에 뒤이어 떠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뒤섞여서 숨어버릴 때도 있죠. 다른 인터뷰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우아한 밤과 고양이들』에 실린 「임시교사」는 어떤 여성, 검정색 벨벳 소재의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라는 이미지에서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건 제가 오래도록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미지였는데, 그런 식으로 소설로 쓰게 될 줄은 몰랐죠(주인공은 그런 옷을 입고 등장하진 않지만요).
같은 작품집에 실린 「죽은 사람들」은 찰스 부코스키의 「치킨 세 마리」와 제가 즐겨 듣던 과학 팟캐스트, 그리고 오래전에 읽은 과학 관련 기사가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 아이디어는 섬광처럼 제게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런 만큼 그냥 사라져버릴 가능성도 크죠.
저는 무언가 인상 깊은 걸 보면 메모를 해두는 편이에요. 재미있게 읽은 기사를 스크랩해두고, 그냥 단어나 사람 이름을 메모해둘 때도 있어요. 갑자기 떠오른 문장 같은 것도요. 『디어 랄프 로렌』을 쓸 때는 자다가 깨서 무언가를 메모한 적도 있어요. 메모라고 하니까 굉장히 체계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휴대전화 메모장에 닥치는 대로 막 해둬요. 워낙 정리가 안 되어서 최초로 메모를 하고 1년 후에 다시 보게 될 때도 많아요. 당연히 맞춤법은 엉망이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 일상이니까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있는 힘을 다해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자는, 조금 이상한 마음도 있어요. 정말 이상하죠? 보통은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제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더할 나위 없이 냉소적이지만, 동시에 더할 나위 없이 감상적이기도 하죠.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서사 장르는 기본적으로 추리소설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본격 추리소설처럼 경찰이나 탐정 그리고 범인이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요. 독자들은 소설을 읽으면서 등장인물의 마음을 좇아가잖아요. 소설 속 인물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그들이 소설 속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품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애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때때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 번도 인정해본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발설할 일도 절대 없는, 그런 마음을 발견할 때도 있고요. 마치 탐정이 범인을 발견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체포하거나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 없다는 점도 비슷하죠. 마치 레이먼드 챈들러가 『기나긴 이별』에서 경찰과 이별할 방법을 찾지 못할 거라고 말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요.
아까 말했듯 장편을 많이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선호한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쓰게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디어 랄프 로렌』을 쓴 이후로 독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억’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질문을 받곤 했죠. 그런 질문을 받을 때면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저는 기억력이 좋지 못해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남들도 저만큼 기억력이 좋지 못한 건지, 아니면 제가 특별히 그런 부분에 약한 건지 말이에요. 요즘 들어 하는 생각은 기억하는 행위의 중요성이에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흔히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것 중 대부분은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기억하는 것뿐이라고요.

그건 진짜 일어난 일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요. 그런 걸 떠올리면 조금 혼란스러워지죠. 그래도, 우리는 무언가를 기억하기를 요구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억하는 걸 멈추면 안 된다고요. 물론 『작은 동네』가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소설의 주인공이 과거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긴 해요. 하지만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다가 혹시 주인공이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들고요.

제 소설을 읽는 행위가 독자 분들에게 즐거운 행위가 되기를, 정말로 진심을 다해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읽고 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다 읽은 후에도 그 속에 머물게 하는 힘을 가진 소설을 좋아하거든요.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곱씹고 그들이 그 순간 왜 그런 말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소설, 그것에 대해 오래도록 생각해보게 하는 소설 말이에요. 부디 제 소설이 그런 식으로 독자 분들의 마음속에 한동안 남아 있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 쓰겠습니다.

-
〃 작가소개 〃
손보미소설가
198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09년 21세기문학 신인상을 수상하고, 201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담요」가 당선 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우아한 밤과 고양이들』 『그들에게 린디합을』, 장편소설 『디어 랄프 로렌』이 있다. 2012년 젊은작가상 대상, 2013~2015년 젊은작가상에 선정되었으며, 제46회 한국일보문학상, 제21회 김준성문학상, 제25회 대산문학상을 수상했다.